입력2006.04.04 08:32
수정2006.04.04 08:36
국내 시장에 랩어카운트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01년 2월이었다.
당시에는 자문형 랩어카운트만 허용됐다.
자문형 랩어카운트는 증권사는 자문만 해주고 최종 투자결정은 고객이 직접 내리는 것이었다.
투자대상은 주식 채권 수익증권 뮤추얼펀드였다.
자문형 랩어카운트가 허용된지 2년이 지난 지금 판매잔액은 2조5천억원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일임형 랩어카운트의 경우 주식형펀드등 간접투자상품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다 펀드보다 장점이 많아 일반인의 관심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임형 랩어카운트는 고객이 전문가에게 자산운용을 완전히 위임하고 그 결과를 고객이 책임진다는 점에서 간접투자와 비슷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양자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선 펀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아 만든 뭉칫돈이다.
따라서 한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은 모두 똑같은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는 셈이다.
이와달리 랩어카운트는 고객마다 별도 계좌로 관리된다.
주식매매 역시 각 계좌별로 이뤄진다.
고객은 온라인을 통해 운용상황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고 개별종목들도 직접 계좌에서 보유하게 된다.
계약을 해지할 때도 실물로 보유할 있다.
다시 말해 일임형 랩어카운트는 본인의 위탁계좌를 증권사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펀드는 종목당 투자한도가 있다.
즉 펀드자산의 10%를 초과해서는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랩어카운트는 일반 위탁계좌와 마찬가지로 종목당 투자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가령 주식시장에서 전체 시장을 이끄는 핵심주도주가 나왔다고 치자.주식형펀드는 이 주도주를 10%이상 매입할 수 없다.
하지만 랩어카운트는 주도주에 30∼40%,심지어 전액을 투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랩어카운트는 일반 주식형펀드에 비해 시장상황에 보다 능등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에 고객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지 여부도 다르다.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는 고객이 항의전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투신사의 자산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투신사 펀드는 한 마디로 '이펀드는 이런 방식으로 운용합니다.
가입할 사람만 가입하세요'라는 방식이다.
반면 랩어카운트는 증권사와 일임계약을 맺을 때 상담을 통해 고객의 투자성향,투자목적 등을 충분히 점검한 뒤 이를 토대로 운용방식과 자산배분을 결정한다.
고객의 투자성향을 반영하는 맞춤형 투자가 가능한 셈이다.
물론 펀드와 달리 랩어카운트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려면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증권사들은 최저 가입금액을 5천만원 정도로 정할 예정이다.
수수료가 3%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맞춤 서비스를 받는데는 최소 연간 1백50만원이상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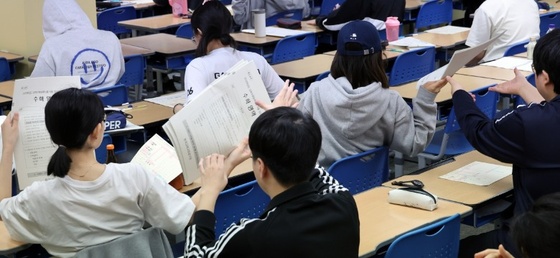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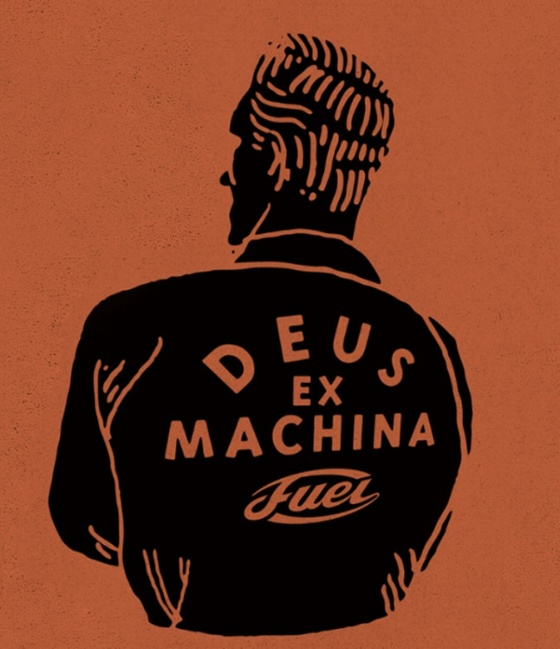
![[신간] 조성래 시집 '천국어 사전'](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K.3694460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