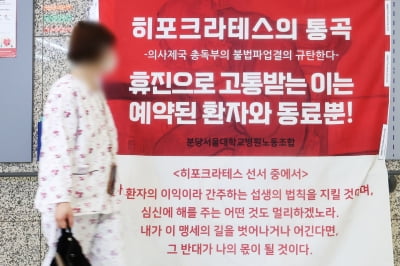입력2006.04.03 14:21
수정2006.04.03 14:23
미국 조지아주 노어크로스시 스트라이플링 초등학교 5학년의 경제수업 시간.
청소년 경제교육을 맡고 있는 주니어 어치브먼트(JA) 애틀랜타 지부의 자원봉사자 도나 카란토(24.여)가 오늘의 '일일 교사'다.
수업 주제는 '생산방식'.
단일생산(unit production)과 대량생산(mass production)을 비롯해 분업 품질관리 생산성 등의 개념을 익히는 시간이다.
"자 오늘은 너희들이 볼펜회사 펜코(Penco)에 고용됐다고 상상해 보자. 교실은 펜 공장이 되는 거고."
카란토는 스프링, 볼펜심, 볼펜대 아랫부분과 윗부분, 볼펜 꼭지와 꼭지 지지대 등 볼펜 재료가 담긴 용기 6개를 책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는 교실 한 바퀴를 휙 돌며 반 아이들 18명을 세 그룹으로 나눴다.
각 조원들에겐 1부터 6까지 숫자를 붙여줬다.
"이제부터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볼펜을 조립해 볼거야. 한 사람이 스프링을 끼우는 것부터 다 만들어진 볼펜의 성능을 점검하는 과정까지 한꺼번에 맡는 방법과 여러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정해 단계적으로 볼펜을 만드는 방법으로 말이야."
전자는 단일생산, 후자는 분업을 통한 대량생산을 의미했다.
카란토는 볼펜 조립의 6단계를 일러줬다.
'볼펜심에 스프링 끼우기->아래 펜대에 심 끼우기->볼펜 꼭지와 꼭지 지지대 조립->위 펜대에 꼭지 끼우기->아래와 위 펜대 끼워 완성하기->불량 점검".
"1조에 있는 6명 앞으로 한번 나와 볼까. 이제부터 볼펜을 한번 조립해 보자. 선생님이 2분의 시간을 줄테니까 각자 전 과정을 혼자서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불량점검 단계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은 생산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라."
'시작'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아이들은 옆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는 듯 열심히 볼펜을 조립했다.
교실에 앉아있는 학생들도 유심히 아이들의 손놀림을 지켜봤다.
'그만'.
2분 동안 아이들이 만든 볼펜은 총 12개.
선생님은 칠판에다 생산차트를 만든 뒤 볼펜수(12)와 근로자의 수(6), 1인당 생산개수(2)를 각각 적었다.
다음은 분업을 시험할 차례다.
카란토는 각조에서 1,3번을 받은 6명의 아이들을 교실 앞으로 불렀다.
"이번에는 6명이 한 단계씩 맡아 볼펜을 생산해 보자. 자기 단계가 끝나면 옆의 친구에게 조립품을 넘기는 거란다. 서로 손발이 잘 맞아야 되겠지?"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7개였다.
1인당 생산개수가 1.1개로 2개였던 단일생산 때보다 훨씬 낮았다.
분업이 생산성을 높여준다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었다.
교사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갈지 궁금했다.
"혼자 조립했을 때가 여럿이 함께 하는 것보다 5개 더 만들어졌네. 이유가 뭘까."
제니스가 손을 들었다.
"여러 명이 만들 때는요, 다음 사람한테 조립된 것을 전달하다가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만큼 속도가 느려진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너희들이 숙련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지만 계속하다 보면 실수를 줄일 수 있겠지? 공장에는 자동화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더 적을 것이고.그래서 대형 공장에서는 단일생산보다는 분업을 하면서 생산효율을 높여 나간단다."
카란토가 마무리를 했다.
취재진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던 제니퍼에게 수업이 끝난 뒤 다가가봤다.
수업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알기 위해 '네가 TV공장 사장이라면 오늘 배운 두 가지중 어느 방식을 쓰고 싶니'라고 물어봤다.
"친구들보다 조금 더 일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두 번째 방식을 쓰고 싶어요."
숙련된 노동자를 확보하면 대량생산 방식을 택하겠다는 말이었다.
이 정도면 제니퍼가 이날 수업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노어크로스(미 조지아주)=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이렇게는 못 살겠다"…잘 나가던 '성수동'에 무슨 일이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3564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