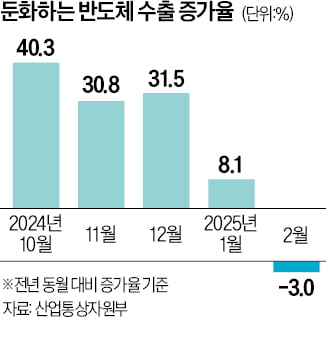[에너지 아껴야 산다] 온실가스 증가방지 '약속'..'기후변화협약이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엔(UN) 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지난 90년 수준에서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약속한 국제협약이다.
지난 92년 6월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돼 이듬해 각국 비준을 거쳐 94년부터 발효됐다.
"리우 환경회의"에는 1백78개국이 참가했으며 한국을 포함 1백54개국이 협약에 서명했다.
기후변화협약의 기본 원칙은 크게 4가지.우선 각국의 책임과 능력에 따라 부담을 차별화한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인 책임이 있고 기술이나 재정능력을 갖춘 선진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또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을 배려할 것과 기후변화의 예측 및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각국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기본원칙에 포함시켰다.
비준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사항은 온실가스 배출통계와 이에 대한 정책 및 조치사항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현재 선진국들은 대부분 2차 보고서까지 제출한 상태이며 개도국 중에선 작년 6월말 현재 한국 아르헨티나 요르단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85개국이 1차 보고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기후변화협약은 강제성이 없어 어느 나라도 선뜻 이산화탄소(CO₂)를 줄이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교토의정서"이다.
각국 대표들은 97년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하고 의정서에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 38개국이 온실가스를 언제까지,얼마나 줄일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후 매년 각국 대표들이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작년에 미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탈퇴를 선언해 실효성이 약화됐다.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도 교토의정서에 대한 비준을 미루고 있어 5년째 발효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한국도 에너지 다(多)소비형 소재산업 비중이 높고 경제성장 및 에너지소비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감축의무를 완벽하게 소화해 내기는 힘든 형편이다.
따라서 정부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으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보조를 맞추되 선진국과는 차별화된 의무부담을 요구할 방침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