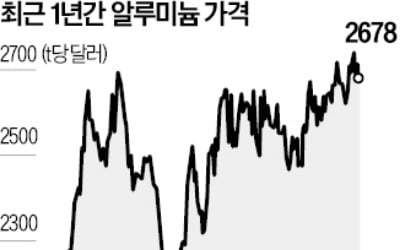정신분열병 치료제 놓고 한국릴리.얀센 '진흙탕 싸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신분열병 치료제를 팔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끼리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월14일 보건복지부가 경쟁약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 건강보험 재정난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를 건강보험 1차 약제에서 2차 약제로 변경,고시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다른 1차 정신분열병 약을 썼는 데도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가 자이프렉사를 투약받을 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이프렉사로 치료해 왔던 환자들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약물로 바꾸든지 약값의 1백%를 본인이 부담하게 됐다.
한국릴리측은 전세계 정신분열병 치료제 중 판매액 1위인 자이프렉사를 보험재정 안정차원에서 2차 약제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해 왔다.
일부 관계자들은 자이프렉사가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은 데도 다른 업체의 로비로 '희생양'이 됐다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자사의 경쟁제품인 리스페달이 결과적으로 피해받았다고 여긴 한국얀센이 공격에 들어갔다.
한국얀센은 지난 9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미국 국가보훈병원이 1997년부터 99년까지 조사한 결과 다른 약에서 리스페달로 바꾼 환자의 경우 전체 치료비가 연간 1천5백36달러 준 반면 자이프렉사는 오히려 4천2백17달러 증가했다"며 복지부 편을 들었다.
그러자 한국릴리도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얀센이 근거자료로 내세운 연구논문을 작성하는데 얀센 본사의 의사가 참여한 데다 얀센에서 재정적으로 후원한 만큼 이 논문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국얀센 관계자는 "미국 국가보훈처는 지난 6월 홈페이지(www.vapbm.org)를 통해 리스페달과 세로켈(아스트라제네카)을 가장 먼저 사용하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재반박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