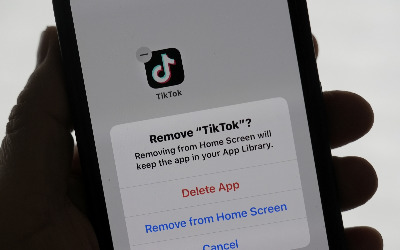[이정훈 전문기자의 '세계경제 리뷰']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엔화, 연내 달러당 1백60엔까지 폭락할듯.'
연초 미국과 일본신문들이 뽑은 기사제목이다.
당시 엔화가치는 달러당 1백20엔대에서 1백30엔대로 떨어지고 있었다.
이 전망을 내린 사람은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일본 재무성 차관.
그의 전망에는 전제조건이 있었다.
"일본이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조건이 붙는 전망은 의미가 없다.
가정법의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신문들은 그의 예측에 지면을 할애했다.
숫자의 함정에 빠진 탓이었다.
당시의 1백30엔과 비교할 때 1백60엔이라는 숫자는 얼마나 자극적인가.
지금 엔화는 연초와 같은 1백30엔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다.
'국제특허출원-한국과 중국, 일본을 맹추격.'
한달전 니혼게이자이신문의 1면 머리기사 헤드라인이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한국과 중국이 국제특허출원에서 일본을 맹추격하고 있다. 2001년 한국의 출원건수는 전년보다 53.1% 늘고, 중국은 3배로 급증했다. 이에 비해 일본은 26%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기사의 뒷부분은 영 딴판이었다.
"작년 3국의 출원건수는 한국 2천3백18건, 중국 1천6백70건, 일본 1만1천8백64건에 달했다."
3국중 일본의 증가율이 가장 낮지만 일본과 한.중간의 출원건수 격차는 더 벌어진 것이다.
증가율에만 초점을 맞추다 숫자의 덫에 걸린 또 하나의 사례다.
엊그제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나온 한국의 올해 예상성장률은 5%.
이를 두고 국내 일부 언론은 30개 선진국중 최고의 성장률이라고 보도했다.
이도 숫자의 덫에 빠진 예다.
반숙경제국인 한국과 완숙경제대국들인 미국(2.3%) 독일(0.9%)의 성장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같은 성장률이라도 양측간에는 질과 양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식이면 한국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의 극빈자들과 같다.
미국정부는 연소득이 8천4백80달러(98년 기준) 이하인 사람을 극빈층으로 분류, 생계보조금을 준다.
작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천9백달러.
물가나 생활수준 등을 무시한 채 숫자만 비교하면 한국인들은 '가난한 미국인들'이다.
숫자의 함정, 경제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 lee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