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거악(巨惡)을 편히 잠들지 못하게 한다'
검사들 중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인 곳이라는 서울지검 특수부의 모토다.
서울지검 특수부는 특수수사에 관한한 최고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검찰의 중추부다.
단순히 소환 통보만 받아도 언론에서 구속을 예상할 정도로 세밀하고 날카롭다는 평을 들었던 특수부의 수사가 이제는 무뎌지다 못해 특수부 수사는 반드시 '재수사'를 거쳐야 한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언제 누가 수사했냐에 따라 결과가 뒤집히는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특수부의 존립 의의조차 흔들리고 있다.
물론 뇌물사건 수사에 있어 '심증'을 확인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원래 뇌물을 줬다는 사람은 있어도 받았다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얼마전 항소심에서 무죄취지로 풀려난 김영재 전 금감원 부원장보 사건처럼 검찰이 어렵사리 기소해도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뇌물수사가 아무리 어렵다고하더라도 과거에는 뇌물 사건이 모두 '의혹'만 남긴채 '실체'를 찾을수 없는 '유령사건'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지난 93년 슬롯머신 사건에서 검찰은 박철언 당시 의원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박씨를 구속기소해 유죄확정판결을 받아내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요즘 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진승현 게이트와 정현준 게이트는 사건 초기부터 정·관계 인사들이 연관됐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그런데도 서울지검 특수부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소문만 그럴듯할뿐 실제로 나오는 건 아무 것도 없었다'며 의혹을 제기한 언론들을 면박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사건이 종결된지 1년여만에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은 뒤늦은 재수사로 구속돼 재판에 회부됐다.
더구나 검찰은 김모 전 국정원 경제과장과 김모 국회의원의 연루설을 재수사하겠다고 또 다시 '뒷북'을 쳤다.
이통에 한때 우리나라 검찰의 거울이란 칭호를 얻었던 서울지검 특수부는 '재수사의 산실(産室)'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번에도 신임을 얻는데 실패한다면 특수부 폐지론이 대두될지 모르겠다.
정대인 사회부 기자 bigman@hankyung.com
- 글자크기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글자행간
-
- 1단계
- 2단계
- 3단계
공유하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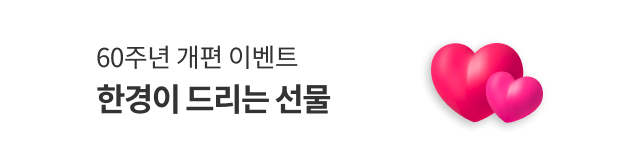

![[토요칼럼] 北 오물 풍선이 두려운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34201788.3.jpg)
![[취재수첩] 재고용 정년 퇴직자 노조 가입에 선 그은 현대차 직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2703579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