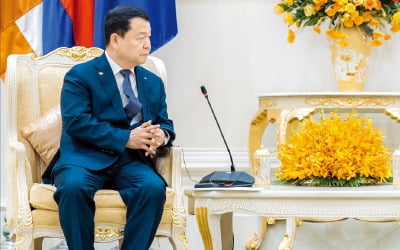부실사 정리 신용채권 '푸대접'..이자율.출자전환 금액 등 담보債만 우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한통운 신호스틸 등 부실기업의 부채정리 과정에서 담보를 잡아놓은 금융회사와 신용으로 빌려준 금융회사간의 형평성 시비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기업의 처리가 지연될 뿐 아니라 정부의 신용대출 활성화 정책도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한통운은 조만간 확정할 '회사정리계획'에서 담보가 있는 채권에 대해선 연 8.5%의 금리를 주기로 한 반면 신용채권엔 금리를 연 3.0%로 깎기로 했다.
또 부채를 출자로 전환할 때도 담보대출은 1만5천원을 1주(액면가 5천원)로 인정키로 한데 비해 신용대출은 3만원을 1주로 바꿔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신용채권을 주로 갖고 있는 모 은행 관계자는 "대한통운은 회사 자체는 건실한데 동아건설의 유탄을 맞아 어려움에 처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신용채권을 이렇게 차별한다면 앞으로 어떤 기업에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대한통운의 신용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금융사는 외환은행으로 총 2천5백억원에 달하고 나머지는 서울보증보험 1천4백억원, 자산관리공사 1천3백억원, 하나로종금 6백40억원 순이다.
한편 한국계 펀드인 골든브리지CRC와 매각협상을 진행중인 신호스틸도 담보채권의 40%를 보유한 모건스탠리측이 변제금액을 올려줄 것을 요구, 매각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호스틸 관계자는 "모건스탠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해 연 20% 정도의 수익률을 제시했으나 모건스탠리측에서는 훨씬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건스탠리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담보물건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골든브리지CRC로의 매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융계 관계자는 "다른 부실기업들의 부채정리때도 신용채권은 담보채권에 비해 훨씬 못한 대우를 받는다"며 "신용대출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