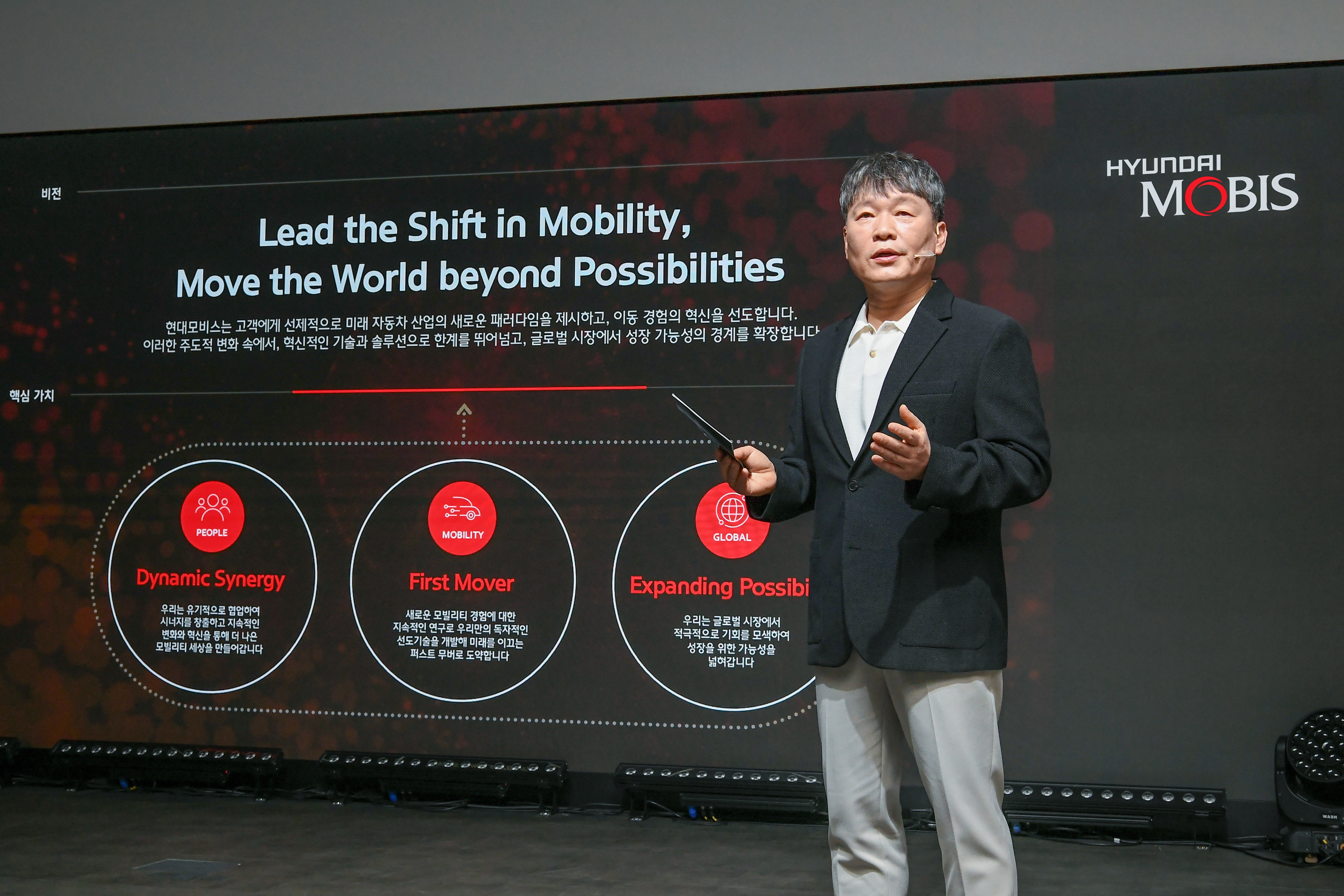[회생의 길로 새 출발하는 '현대건설號'] 돈.경영 파격지원 확실히 살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대건설이 채권단의 특단조치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8조원이 넘는 부채를 줄이고 새로운 자금을 쏟아부어 빈사상태의 현대건설을 ''확실히''살린다는게 채권단의 결정이다.
채권단은 현대건설이 자력으로 뛸 수 있도록 3조원에 달하는 ''영양분''을 공급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현대건설을 살리고 채권단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어쨌든 한국 건설산업의 대표주자였던 현대건설은 이제 새 주인과 경영진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됐다.
◇ 자금지원은 어떻게 =1조4천억원의 부채를 자본금으로 바꾸고 1조5천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게 큰 골격이다.
출자 전환은 빠르면 내달말께 단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 돈은 새로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기존 부채를 자본금으로 ''이름''만 바꾸는 것이다.
새 돈은 각각 7천5백억원씩 전환사채(CB) 발행과 유상증자 형태로 들어간다.
CB발행과 유상증자는 내달중 나올 영화회계법인의 자산실사결과를 본 뒤 5월중 실시키로 했다.
CB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고 일반 공모를 하기로 했다.
일단 채권금융회사는 빠지기로 한 것.
만약 일반공모에서 인수되지 않은 CB가 생기면 새로 구성되는 채권단운영위원회에서 처리방법을 결정키로 했다.
7천5백억원의 유상증자는 모든 채권단이 참여키로 했다.
개별 금융회사의 증자참여 비율은 담보가 없는 신용채권 비율로 정한다.
신용채권엔 일반대출과 당좌대출한도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문제는 CB발행과 유상증자로 새 돈이 수혈되기 전까지 현대건설이 어떻게 버티느냐다.
현대건설은 4월말까지 3천3백9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메워주기 위해 응급처방을 동원키로 했다.
이미 지원키로 했던 해외차입용 지급보증을 대출로 바꿔 준다는 것.
채권은행들은 지난 10일 현대건설에 4억달러의 대외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었다.
이중 1억달러는 이미 산업은행이 보증을 섰다.
나머지 3억달러(3천9백억원)를 원화로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다.
은행별로는 △산업 1천30억원 △외환 1천40억원 △한빛 4백68억원 등으로 배분했다.
지원되는 3천9백억원은 채권단이 신규 출자한 돈으로 우선 갚을 예정이다.
◇ 경영진은 =현대건설 경영진은 완전 개편된다.
기본원칙은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될 사람으로 바꾼다"(김경림 외환은행장)는 것이다.
따라서 29일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진은 대부분 바뀔 가능성이 높다.
기존 대주주인 정몽헌 현대아산회장의 복귀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 정상화된 현대건설은 =이번 지원책이 실현되면 현대건설은 충분히 회생할 수 있다고 채권단은 설명했다.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가 9천억원에 달하는 회사가 자기자본 2조원 규모의 ''클린 컴퍼니''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부채는 작년말현재 8조1천억원에서 5조2천억원으로 준다.
부채비율은 2백60%.
국내 대형건설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백% 정도다.
채권단은 올해 현대건설의 영업이익이 4천6백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비용(이자지급) 등 3천6백16억원을 갚고도 1천억원 이상 경상이익을 남긴다는 것이다.
내년 영업이익이 5천6백억원을 넘으면 경상이익은 2천1백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때쯤 채권단은 보유 주식을 팔아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희망은 새로운 경영진이 현대건설을 얼마나 빨리 재건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8조원이 넘는 부채를 줄이고 새로운 자금을 쏟아부어 빈사상태의 현대건설을 ''확실히''살린다는게 채권단의 결정이다.
채권단은 현대건설이 자력으로 뛸 수 있도록 3조원에 달하는 ''영양분''을 공급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현대건설을 살리고 채권단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어쨌든 한국 건설산업의 대표주자였던 현대건설은 이제 새 주인과 경영진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됐다.
◇ 자금지원은 어떻게 =1조4천억원의 부채를 자본금으로 바꾸고 1조5천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게 큰 골격이다.
출자 전환은 빠르면 내달말께 단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 돈은 새로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기존 부채를 자본금으로 ''이름''만 바꾸는 것이다.
새 돈은 각각 7천5백억원씩 전환사채(CB) 발행과 유상증자 형태로 들어간다.
CB발행과 유상증자는 내달중 나올 영화회계법인의 자산실사결과를 본 뒤 5월중 실시키로 했다.
CB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고 일반 공모를 하기로 했다.
일단 채권금융회사는 빠지기로 한 것.
만약 일반공모에서 인수되지 않은 CB가 생기면 새로 구성되는 채권단운영위원회에서 처리방법을 결정키로 했다.
7천5백억원의 유상증자는 모든 채권단이 참여키로 했다.
개별 금융회사의 증자참여 비율은 담보가 없는 신용채권 비율로 정한다.
신용채권엔 일반대출과 당좌대출한도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문제는 CB발행과 유상증자로 새 돈이 수혈되기 전까지 현대건설이 어떻게 버티느냐다.
현대건설은 4월말까지 3천3백9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메워주기 위해 응급처방을 동원키로 했다.
이미 지원키로 했던 해외차입용 지급보증을 대출로 바꿔 준다는 것.
채권은행들은 지난 10일 현대건설에 4억달러의 대외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었다.
이중 1억달러는 이미 산업은행이 보증을 섰다.
나머지 3억달러(3천9백억원)를 원화로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다.
은행별로는 △산업 1천30억원 △외환 1천40억원 △한빛 4백68억원 등으로 배분했다.
지원되는 3천9백억원은 채권단이 신규 출자한 돈으로 우선 갚을 예정이다.
◇ 경영진은 =현대건설 경영진은 완전 개편된다.
기본원칙은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될 사람으로 바꾼다"(김경림 외환은행장)는 것이다.
따라서 29일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진은 대부분 바뀔 가능성이 높다.
기존 대주주인 정몽헌 현대아산회장의 복귀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 정상화된 현대건설은 =이번 지원책이 실현되면 현대건설은 충분히 회생할 수 있다고 채권단은 설명했다.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가 9천억원에 달하는 회사가 자기자본 2조원 규모의 ''클린 컴퍼니''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부채는 작년말현재 8조1천억원에서 5조2천억원으로 준다.
부채비율은 2백60%.
국내 대형건설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백% 정도다.
채권단은 올해 현대건설의 영업이익이 4천6백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비용(이자지급) 등 3천6백16억원을 갚고도 1천억원 이상 경상이익을 남긴다는 것이다.
내년 영업이익이 5천6백억원을 넘으면 경상이익은 2천1백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때쯤 채권단은 보유 주식을 팔아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희망은 새로운 경영진이 현대건설을 얼마나 빨리 재건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