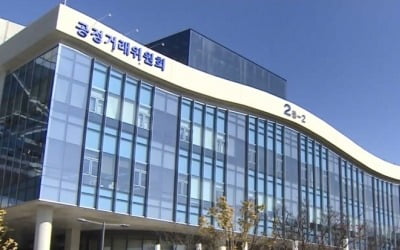生保社 외자유치 잇단 무산 .. 럭키.현대.금호 등 협상 제자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생명보험회사들의 외자 유치가 잇따라 무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생보사들은 국내 규정상 보험사가 손실이 날 경우 대주주의 부담이 지나치게 큰 반면 이익분배에선 대주주의 몫이 적기 때문이라며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럭키 금호 현대 삼신생명 등은 그동안 외자유치를 추진해 왔지만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대는 일본의 메이지생명, 럭키는 미 하트포드생명, 금호는 미 AIG생명 등을 대상으로 외자유치 협상을 벌여 왔으나 대부분 무산됐다.
삼신생명은 리젠트, 살로만스미스바니 등과 접촉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동양생명도 지난 9월말을 시한으로 미국의 WLR펀드로부터 9백억원을 끌어들일 예정이었으나 계속 지연되고 있다.
협상이 여의치 않자 생보사들은 일단 국내에서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럭키생명은 3백억원의 후순위차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호생명은 그룹에서 5백억원을 증자받는 것을 비롯해 국내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신생명 관계자는 "외국 투자자들은 한결같이 국내 생보사의 기업가치를 낮게 보고 있다"며 "생보사의 대주주에 관한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감독규정에 따르면 생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백%를 밑돌 경우 대주주들은 자기 주머니 돈을 털어 채워 넣어야 하지만 이익이 생겼을 땐 10%만 배당받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항상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경영을 잘하라는 뜻으로 그같은 규정을 둔 것"이라며 "외자유치 과정에서 대주주의 권리와 책임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로선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이에 대해 생보사들은 국내 규정상 보험사가 손실이 날 경우 대주주의 부담이 지나치게 큰 반면 이익분배에선 대주주의 몫이 적기 때문이라며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럭키 금호 현대 삼신생명 등은 그동안 외자유치를 추진해 왔지만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대는 일본의 메이지생명, 럭키는 미 하트포드생명, 금호는 미 AIG생명 등을 대상으로 외자유치 협상을 벌여 왔으나 대부분 무산됐다.
삼신생명은 리젠트, 살로만스미스바니 등과 접촉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동양생명도 지난 9월말을 시한으로 미국의 WLR펀드로부터 9백억원을 끌어들일 예정이었으나 계속 지연되고 있다.
협상이 여의치 않자 생보사들은 일단 국내에서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럭키생명은 3백억원의 후순위차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호생명은 그룹에서 5백억원을 증자받는 것을 비롯해 국내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신생명 관계자는 "외국 투자자들은 한결같이 국내 생보사의 기업가치를 낮게 보고 있다"며 "생보사의 대주주에 관한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감독규정에 따르면 생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백%를 밑돌 경우 대주주들은 자기 주머니 돈을 털어 채워 넣어야 하지만 이익이 생겼을 땐 10%만 배당받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항상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경영을 잘하라는 뜻으로 그같은 규정을 둔 것"이라며 "외자유치 과정에서 대주주의 권리와 책임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로선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