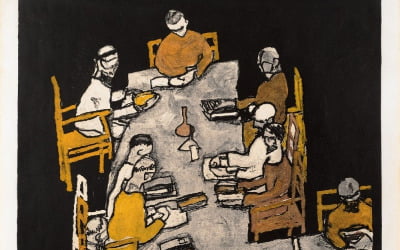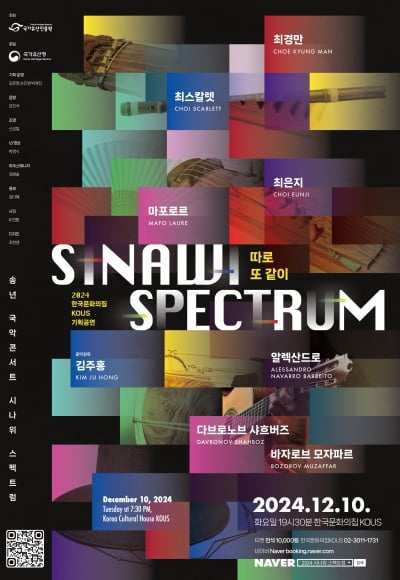[독서] (화제의 책) '맥시멈 코리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 외국인 비평가의 눈에 비친 한국.한국인.
96년 가을 한국땅을 처음 밟은 자유기고가 스콧 버거슨이 독특한 시각의
한국문화 비평서 "맥시멈 코리아"(자작나무, 8천5백원)를 펴냈다.
여행을 좋아하는 그는 부정기발행 잡지 "바그"의 편집.발행인이다.
97년 봄 한국 예술가와 작가 영화감독들의 인터뷰를 담은 "버그" 창간호를
낸 뒤 거리에서 직접 책을 팔아 화제를 모았다.
그는 이번 책을 롤랑 바르트의 일본 관련서 "기호의 제국"과 비교한다.
바르트가 후기 구조주의 이론의 잣대로 쓴 "기호의 제국"을 "둥글고 속이 빈
달콤한 도너츠"라고 평가한다.
무의 개념으로 일본적인 상징체계를 정리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신 그의 "맥시멈 코리아"는 "마구 뒤섞여 있는 행운의 과자"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기호학자인 바르트가 "손이 닿으면 사그라들 것 같은 아름다운 거울의
잔영처럼 파삭파삭한 덴뿌라의 비물질성"에서 일본적인 기호를 발견했다면
그는 한국땅 구석구석에 버티고 서있는 인스턴트 커피 자판기에서 가장
한국적인 코드를 발견한다.
물론 김치나 한같은 요소도 중요하지만 겉치레와 꾸밈이 없으면서도
고품질과 편리함을 한꺼번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남한에만 1천5백만명의 김씨가 있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소쉬르의 구조주의에 등장하는 "다른 유닛(unit)"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고전적 예라는 걸 곧 발견했다.
서양에서는 이름이 자신의 꿈과 욕망을 담아놓는 언어적 그릇이지만
한국에서는 대가족 체제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표시하는 일종의
연계물이라는 것이다.
한국사람들은 왜 방을 좋아할까.
그가 한국에서 첫 키스를 경험한 곳은 비디오방이었고 집필자료를 모은 곳은
PC방, 기생 할머니를 인터뷰한 곳은 다방, 세명의 시골출신 소녀앞에서
도어즈의 "라이트 마이 파이어"를 멋지게 부른 곳은 노래방이었다.
영어를 배우던 아저씨 학생들과 마른 오징어를 씹으며 우정을 돈독히 한
곳은 룸살롱이었고 잡다한 만화를 섭렵한 곳도 만화방이었으니 그럴만하다.
내밀한 은신처를 좋아하는 한국인의 사회성을 관찰한 대목이다.
그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일지언정 관광객은 아니다"라며 "서울의
강북을 전통문화의 메카로 키우고 강남을 도약적인 미래의 터로 육성하자"는
제안도 서슴없이 내놓는다.
< 고두현 기자 k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
96년 가을 한국땅을 처음 밟은 자유기고가 스콧 버거슨이 독특한 시각의
한국문화 비평서 "맥시멈 코리아"(자작나무, 8천5백원)를 펴냈다.
여행을 좋아하는 그는 부정기발행 잡지 "바그"의 편집.발행인이다.
97년 봄 한국 예술가와 작가 영화감독들의 인터뷰를 담은 "버그" 창간호를
낸 뒤 거리에서 직접 책을 팔아 화제를 모았다.
그는 이번 책을 롤랑 바르트의 일본 관련서 "기호의 제국"과 비교한다.
바르트가 후기 구조주의 이론의 잣대로 쓴 "기호의 제국"을 "둥글고 속이 빈
달콤한 도너츠"라고 평가한다.
무의 개념으로 일본적인 상징체계를 정리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신 그의 "맥시멈 코리아"는 "마구 뒤섞여 있는 행운의 과자"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기호학자인 바르트가 "손이 닿으면 사그라들 것 같은 아름다운 거울의
잔영처럼 파삭파삭한 덴뿌라의 비물질성"에서 일본적인 기호를 발견했다면
그는 한국땅 구석구석에 버티고 서있는 인스턴트 커피 자판기에서 가장
한국적인 코드를 발견한다.
물론 김치나 한같은 요소도 중요하지만 겉치레와 꾸밈이 없으면서도
고품질과 편리함을 한꺼번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남한에만 1천5백만명의 김씨가 있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소쉬르의 구조주의에 등장하는 "다른 유닛(unit)"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고전적 예라는 걸 곧 발견했다.
서양에서는 이름이 자신의 꿈과 욕망을 담아놓는 언어적 그릇이지만
한국에서는 대가족 체제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표시하는 일종의
연계물이라는 것이다.
한국사람들은 왜 방을 좋아할까.
그가 한국에서 첫 키스를 경험한 곳은 비디오방이었고 집필자료를 모은 곳은
PC방, 기생 할머니를 인터뷰한 곳은 다방, 세명의 시골출신 소녀앞에서
도어즈의 "라이트 마이 파이어"를 멋지게 부른 곳은 노래방이었다.
영어를 배우던 아저씨 학생들과 마른 오징어를 씹으며 우정을 돈독히 한
곳은 룸살롱이었고 잡다한 만화를 섭렵한 곳도 만화방이었으니 그럴만하다.
내밀한 은신처를 좋아하는 한국인의 사회성을 관찰한 대목이다.
그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일지언정 관광객은 아니다"라며 "서울의
강북을 전통문화의 메카로 키우고 강남을 도약적인 미래의 터로 육성하자"는
제안도 서슴없이 내놓는다.
< 고두현 기자 k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