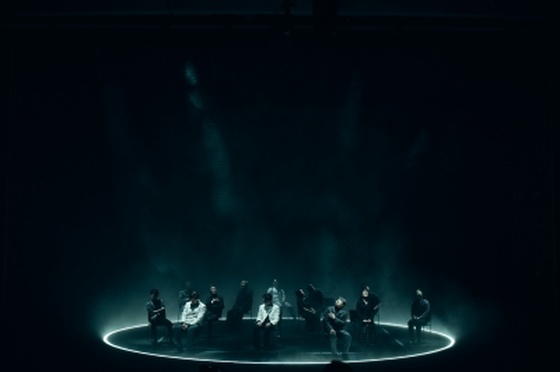[천자칼럼] 세종센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종실록"에는 세종이 자기 아버지에게 그려준 난죽 8폭을 병풍으로 만들어
보관해오다 되돌려주는 집현전 부제학 신석조의 얘기가 나온다.
지금은 없어진 어필이다.
또 음악을 덕의꽃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는 정간보라는 악보를 만들었다.
오늘날까지 단골로 연주되는 "여민락" "보태평" "정대업" 등은
그가 손수 작곡해 남긴 곡이다.
세종이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참고 하면소도 의약이론 기술 음악도
주체성을 살려가며 우리 실정에 맞게 재창조 해 냈다는 사실을 주목할만
하다.
지난78년 정부가 동양 최대규모의 문화회관을 짓고 그 명칭을
"세종문화회관"이라고했다.
그속에는 세종의 문화예술 정신을 본받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곁들어져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
건물앞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문화예술의 전당"이라는 휘호탑도 세워져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은 대규모 행사장으로는 몰라도 연극 오페라 음악회 발레 등
무대예술공연장으로는 적합지 못하다.
한마디로 다목적 강당으로 지어진 셈이다.
외국의 값비싼 공연물을 유치한 흥행업자들의 수지를 맞추는데는
안성맞춤인지는 몰라도 말이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다 못해 재단법인으로 새로 출범한 세종문화회관이
"세종센터"로 이름을 바꾼다는 소식이다.
"회관"이라는 명칭이 "일제의 잔재"라는 것이 이유라지만 "센터"도 우리말은
아닌 것을 보면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영화등 대중예술을 더 많이
끌어들이려는 고육지책인 것처럼 보인다.
외국에는 퐁피두센터 케네디센터등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왠지 돈벌이 업종인
센터 "카센터" "이삿짐 센터" 처럼 들려 탐탁치 않다.
차라리 "세종문화회관"은 그대로 두고 영어로는 "세종홀"이라고 하면
어떨지.
"센터"라고 해서 덩달아 퐁피두센터가 세종센터와 기능이 같아지지는
않는다.
세종문화회관은 애당초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세워진 건물이 아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허구에 찬 이름 바꾸기가 너무 유행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0일자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교육혁신, 사라지는 연수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609646.3.jpg)
![[아르떼 칼럼] AI가 인간보다 더 풍부한 감정을 가질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7036337.3.jpg)
![[천자칼럼] 30년 만에 수출 꿈 이룬 K고속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03613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