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말레이시아 외환규제 '일단 성공작'..'단기해법' 지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환 시장 규제"가 과연 성공할 것이냐는 관심들이다.
외환위기를 당한 아시아국들이나 러시아와 남미국들에겐 남의 얘기도
아니다.
홍콩 증시는 당국의 규제조치가 나온 이후 수직상승세를 계속해 8일 현재
항셍지수 8천선을 탈환했다.
말레시아 주가 역시 7일까지 69%나 뛰어 올랐다.
홍콩과 말레이시아의 "도박"이 일단 산뜻한 출발을 하고 있는 셈이다.
대만 역시 소로스 펀드 매매를 규제하는등 시장규제에 칼을 빼들어
나름대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
사실 홍콩이나 말레이시아는 시장개방논자들이 금기시해왔던 엄격한
시장통제 조치들을 들고 나왔었다.
홍콩은 공매금지등 주식거래 자체를 규제했고 은행들에 달러를 무제한
빌려주면서 금리인상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다.
사실 헤지펀드들은 홍콩달러 집중 매도->금리인상->증시하락->주식공매로
연결되는 일련의 흐름을 통해 이익을 챙겨왔었다.
그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게 홍콩 당국의 속셈이었다.
말레이시아는 한발 더나아가 국경밖(싱가포르 겨냥)에서 거래되는
외환거래는 아예 금지시켜버렸다.
환율도 고정시켰다.
"정부가 직접 외환시장을 통제할 터이니 환투기는 생각지도 말라"(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경고였다.
시장규제를 둘러싼 국제적인 찬반양론도 가열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철수로 결국엔 실패할 것"(배어링증권사 마트 린지이사)
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금융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단기해법"(루디거
돈부쉬 MIT대교수)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적지 않다.
7일에는 ADB(아시아개발은행)까지 지지를 선언할 정도로 찬성론도
적지 않다.
그동안 IMF(국제통화기금)등의 "시장논리"에 밀려 숨죽이고 있던
아시아 지역국가들이 러시아와 남미불안 등을 타고 "규제를 통한
시장안정"이라는 역공세를 시도하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물론 시장규제를 밀고가기엔 풀어야할 내부 문제들도 적지 않다.
홍콩은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라는 이미지를 스스로 손상시켰고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와의 연결을 끊어버림으로써 고립의 길로 가고 있다.
자산가격 하락(홍콩)이나 두자리 숫자의 인플레(말레이시아) 위험도
풀어야할 과제다.
"시장 규제"를 통한 헤지펀드와의 전쟁이 어떤 결말을 맺을 지 두고
볼 일이다.
< 조주현 기자 for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9일자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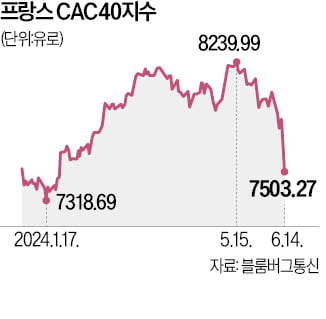
![[포토] 佛 전역서 반극우 시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05102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