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계 최대 실리콘제조업체인 미국 다우코닝사의 전북 새만금지구 투자유치
가 물건너 갔다.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뜻을 유종근 전북지사에게 알려왔다.
다우코닝은 공장부지 건설에 까탈스런 조건을 내걸기는 했지만 단일기업
으로 단군이래 최대인 28억달러 투자를 계획한 비중있는 손님이었다.
제발로 걸어들어온 "큰손"이었다.
그런데 그 손님은 한국에 살림차리기를 거절했다.
왜인가.
유지사는 "한국정부의 늑장행정과 성의부족"이라고 풀이했다.
통산부도 "관련 법령상 제약 등으로 부처간 합의를 도출하는데 시간이
소요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번 과정을 돌이켜 보면 한국이 기업하기 얼마나 어려운 나라인지를
실감케 한다.
특히 정부의 무성의와 무책임은 극에 달해 있다.
다우코닝이 내걸었던 공장건설 조건을 놓고 정부가 관계부처 합의를 도출
하기까지엔 약 1년이 걸렸다.
이 정도면 늑장행정이 아니라 아예 행정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중에는 요구조건의 상당부분을 수용했는데 처음엔 아예 대부분을 거절
했었다.
외환위기가 닥치자 부랴부랴 성의를 보인 셈이다.
그나마 정부의 최종안도 다우코닝 조사팀이 마지막 점검(지난해 12월15일)
을 마치고 돌아간 뒤에야 만들어 졌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까지 나서 직접 구애의 신호를 보냈지만 이미
"버스 떠난뒤의 손들기"였다.
그렇지 않아도 언어소통이 안되고 문화적 풍토가 달라 외국인들이 힘들어
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 상황을 가장 잘아는 사람들이 바로 담당 공무원들이다.
공장부지를 싼 값에 공급해 주는 것은 그렇다치고 어떻게 외국기업에만
전기료를 깎아줄 수 있느냐는 등의 핑계를 대지만 다른 조건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일이었다.
한다미로 무성의가 결과를 달리했다는 점이다.
전적으로 공무원들의 책임이다.
한푼의 달러가 급한 싯점에서도 이정도인데 느긋한 사안에 대해선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힌다.
다우코닝에게 "한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소문이나 내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은 심정이다.
김호영 < 산업1부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2일자).
가 물건너 갔다.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뜻을 유종근 전북지사에게 알려왔다.
다우코닝은 공장부지 건설에 까탈스런 조건을 내걸기는 했지만 단일기업
으로 단군이래 최대인 28억달러 투자를 계획한 비중있는 손님이었다.
제발로 걸어들어온 "큰손"이었다.
그런데 그 손님은 한국에 살림차리기를 거절했다.
왜인가.
유지사는 "한국정부의 늑장행정과 성의부족"이라고 풀이했다.
통산부도 "관련 법령상 제약 등으로 부처간 합의를 도출하는데 시간이
소요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번 과정을 돌이켜 보면 한국이 기업하기 얼마나 어려운 나라인지를
실감케 한다.
특히 정부의 무성의와 무책임은 극에 달해 있다.
다우코닝이 내걸었던 공장건설 조건을 놓고 정부가 관계부처 합의를 도출
하기까지엔 약 1년이 걸렸다.
이 정도면 늑장행정이 아니라 아예 행정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중에는 요구조건의 상당부분을 수용했는데 처음엔 아예 대부분을 거절
했었다.
외환위기가 닥치자 부랴부랴 성의를 보인 셈이다.
그나마 정부의 최종안도 다우코닝 조사팀이 마지막 점검(지난해 12월15일)
을 마치고 돌아간 뒤에야 만들어 졌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까지 나서 직접 구애의 신호를 보냈지만 이미
"버스 떠난뒤의 손들기"였다.
그렇지 않아도 언어소통이 안되고 문화적 풍토가 달라 외국인들이 힘들어
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 상황을 가장 잘아는 사람들이 바로 담당 공무원들이다.
공장부지를 싼 값에 공급해 주는 것은 그렇다치고 어떻게 외국기업에만
전기료를 깎아줄 수 있느냐는 등의 핑계를 대지만 다른 조건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일이었다.
한다미로 무성의가 결과를 달리했다는 점이다.
전적으로 공무원들의 책임이다.
한푼의 달러가 급한 싯점에서도 이정도인데 느긋한 사안에 대해선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힌다.
다우코닝에게 "한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소문이나 내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은 심정이다.
김호영 < 산업1부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2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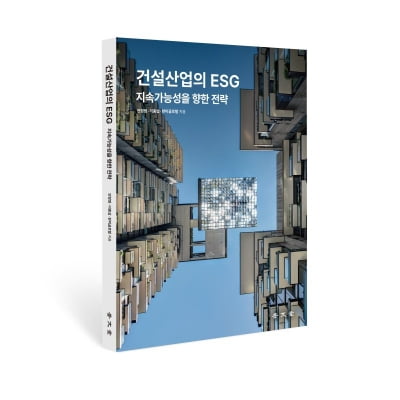
![레이싱 카트인 줄…미니 '팬층'에 제대로 어필한 전기차 [신차털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81598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