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노선 개편] 개혁작업 본격화 첫 시동 .. 의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번 버스노선 개편의 의미는 단순히 버스가 다니는 길을 바꿨다는데
있지 않다.
버스개혁작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것을 뜻한다.
불친절과 불편의 표본처럼 돼 있는 서울시내버스에 시가 본격적으로
"메스"를 대기 시작한 셈이다.
이번 노선 개편은 시가 지난 1년여동안 준비한 시내버스 개혁 종합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할수 있다.
시는 지난해 버스 비리사건이후 버스행정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키로
했다.
그래서 나온 종합대책의 골자는 이렇다.
잘하는 업체는 보조금을 줘 키우고 못하는 회사는 퇴출시키겠다는 것.
이는 만성적인 적자구조 해소가 관건이다.
시는 적자노선은 과감히 정리하고 불가피하게 운영되는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시가 이번에 1회 운행당 20만원이하의 수익을 올리는 노선을 없애버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해소해주되 그래도 못견디겠으면 나가라는 얘기다.
그대신 잘하면 각종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
그러나 시의 이같은 생각이 제대로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우선 시의 계획자체가 큰 난관에 봉착해 있다.
시의회가 버스업체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버스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생각할수 없다.
업계가 "보조금 지급이 병행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노선조성은 모두 죽으라는
얘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노선당 손익분기점은 31만원선.
업계의 계산에 따르면 이번에 개편한 노선도 평균 4만원씩 적자다.
이런상황에서 서비스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사실 시의 버스개선대책은 이미 멈칫거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노선조정은 이미 끝났어야 한다.
또 버스안에 자동징수기를 설치해 손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에
들어갔어야 한다.
그러나 자동징수기는 설치업체도 선정하지 못한 상태다.
또 이번에 노선을 조정하면서 내릴 것이라고 말했던 지역순환버스요금
인하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다.
시는 절차상 업체가 요구해야만 값을 내릴수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모르고 당초 요금인하를 언급했을 리가 없다.
불신을 자초한 셈이다.
개혁이라는 말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녹녹치 않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런 점에서 시가 앞으로 추진할 버스개혁작업은 순탄한 길을 가지 못할게
분명하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2일자).
있지 않다.
버스개혁작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것을 뜻한다.
불친절과 불편의 표본처럼 돼 있는 서울시내버스에 시가 본격적으로
"메스"를 대기 시작한 셈이다.
이번 노선 개편은 시가 지난 1년여동안 준비한 시내버스 개혁 종합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할수 있다.
시는 지난해 버스 비리사건이후 버스행정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키로
했다.
그래서 나온 종합대책의 골자는 이렇다.
잘하는 업체는 보조금을 줘 키우고 못하는 회사는 퇴출시키겠다는 것.
이는 만성적인 적자구조 해소가 관건이다.
시는 적자노선은 과감히 정리하고 불가피하게 운영되는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시가 이번에 1회 운행당 20만원이하의 수익을 올리는 노선을 없애버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해소해주되 그래도 못견디겠으면 나가라는 얘기다.
그대신 잘하면 각종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
그러나 시의 이같은 생각이 제대로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우선 시의 계획자체가 큰 난관에 봉착해 있다.
시의회가 버스업체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버스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생각할수 없다.
업계가 "보조금 지급이 병행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노선조성은 모두 죽으라는
얘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노선당 손익분기점은 31만원선.
업계의 계산에 따르면 이번에 개편한 노선도 평균 4만원씩 적자다.
이런상황에서 서비스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사실 시의 버스개선대책은 이미 멈칫거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노선조정은 이미 끝났어야 한다.
또 버스안에 자동징수기를 설치해 손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에
들어갔어야 한다.
그러나 자동징수기는 설치업체도 선정하지 못한 상태다.
또 이번에 노선을 조정하면서 내릴 것이라고 말했던 지역순환버스요금
인하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다.
시는 절차상 업체가 요구해야만 값을 내릴수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모르고 당초 요금인하를 언급했을 리가 없다.
불신을 자초한 셈이다.
개혁이라는 말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녹녹치 않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런 점에서 시가 앞으로 추진할 버스개혁작업은 순탄한 길을 가지 못할게
분명하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2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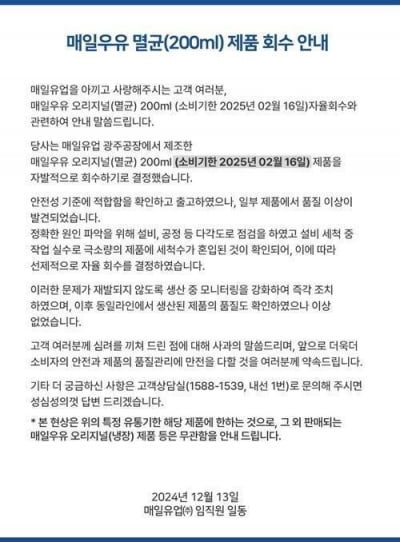

!["하루 2시간씩 한다" 한강이 공개한 루틴…내게도 효과 있을까 [건강!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N.3891664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