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사과와 폐암
재배되었다.
그것이 언제인가 아시아 코카서스지대의 것과 교잡하여 지금과 같은
크기의 탐스러운 사과로 변종되었다.
그뒤 사과는 코카서스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각지로 퍼져
나갔다.
사과는 일찍이 인도-유럽계 부족들의 설화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이 숭앙한 해나 달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문학에서도 사과가 영물로 묘사된다.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결혼축하연장에 황금사과 한알을 던진다.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와 딸인 아테나, 미의 여신인 아폴로디테가 그
사과를 가지려고 다툰다.
그때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사과의 주인을 가리도록 선발된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데려다 주겠다는 아폴로디테에게
그 사과를 준다.
아폴로디테는 스파르타왕의 아내인 헬레네를 넘겨줌으로써 트로이전쟁이
벌어진다.
또 유럽의 어떤 민담에서는 사과가 달에 바쳐진 성스러운 과일로 영생을
상징했다.
배뇨장애증세를 고치는데 술에 사과를 곁들여 먹는 따위의 의료상의
속신이 있었다.
그래선지 오늘날까지도 "하루에 사과 한알이면 의사가 필요없다"는 말이
전해진다.
17세기 전반에 아메리카대륙으로 신세계를 찾아 떠난 영국인들도
사과씨를 가져다 심는 것을 잊지 않았을 정도로 사과는 필수 기호과일
이었다.
동양에서는 1세기께 중국에서 능금이 재배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것이 한국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될 따름이다.
지금과 같은 사과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1884년 서양선교사에 의해서였다.
1960년대 이후 사과의 소득작물 권장과 우량품종 도입, 재배기술 향상
등에 힘입어 한국과일의 주종을 이루게 되면서 한국인들의 상식
기호식품으로 등장했다.
최근 핀란드국립보건원 연구진이 사과를 많이 먹으면 폐암발생률을
58%까지 줄일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더욱이 사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이 담배속의 유해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낭보가 아닐수 없다.
사과를 영물이나 귀물로 생각했던 선인들의 혜안이 되살려지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0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26조원과 5만명](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586123.3.jpg)
![[데스크 칼럼] 부천 시민들이 부러운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20116591.3.jpg)
![[다산칼럼] 바보야, 이번에도 문제는 경제였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2260134.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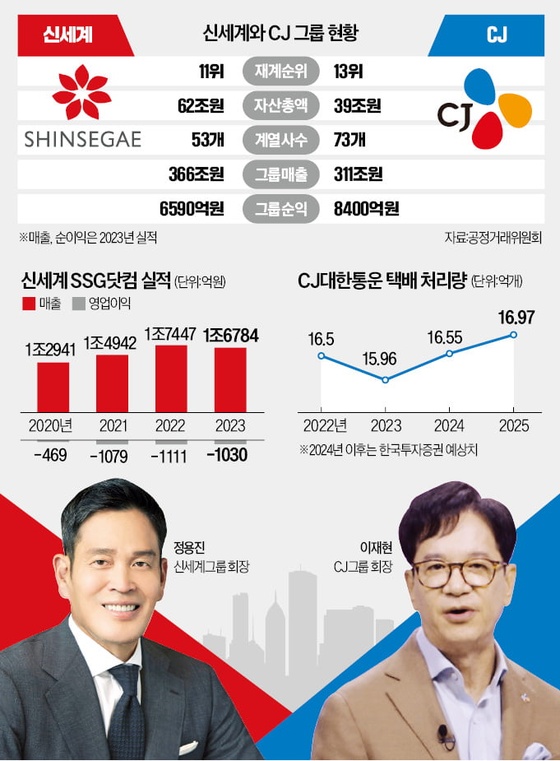





![[오늘의 arte] 티켓 이벤트 : 서울시향 드보르자크 교향곡 8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4448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