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성수대교 재개통
2년8개월전 다리상판이 떨어져나간 바로 그 자리에서 서른 두 송이 하얀
국화가 한강 물위로 떨어져 내렸다.
"광수야 광수야"
희생자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는 한 유족의 모습이 참석자를 숙연케 했다.
그것은 개통식이라기보다는 추모식에 가까운 분위기였다.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침통한 표정을 쉽게 지우지 못했다.
한 시관계자의 말대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날 성수대교 재개통식에는 건설현장소장이 시공자들의 이름을 새긴
동판을 증정했다.
새 교량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안전선언문도 낭독됐다.
조순 서울시장도 인사말을 통해 "부실의 상징이 안전의 상징으로 탈바꿈
하길 기대한다"며 "부실공사는 없다는 새로운 건설문화를 성숙시키자"고
호소했다.
이 모든 염원속에 성수대교는 복구됐다.
새 교량위를 신나게 질주하는 차량을 보면 그 날의 상처는 사라진 듯하다.
마치 "부실공사추방"이란 숙제가 성수대교 재개통으로 다 해결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빨리빨리" "대충대충"이란 오랜 관행이 근절됐는가라는 질문에
딱부러지게 대답할 수 있는 공직자나 건설관계자는 얼마나 될까.
또 그 말을 믿는 국민들은 어느 정도일까.
단군이래 최대 역사라는 경부고속철도가 처음부터 부실투성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얼마전 밝혀졌다.
신축아파트 축대가 비에 무너져내린 일도 있었다.
공사현장마다 벌어진 부실공사추방대회가 구호에만 그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다.
너울너울 다리 난간아래로 떨어지는 꽃송이를 보며 이 땅의 모든 부실도
함께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은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김준현 < 사회1부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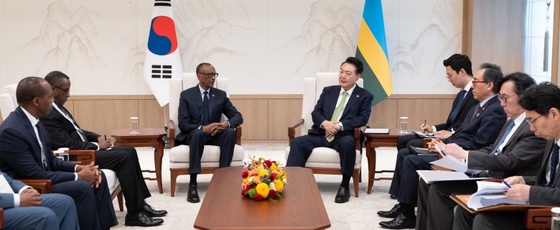


![[단독] 홈플러스,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한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2731.3.jpg)
![[오늘의 arte] 예술인 QUIZ : 가택 연금됐던 러시아의 '反푸틴' 감독](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036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