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추어 정부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즉 투입물 통제에 따른 수동적인 업무 수행에서 탈피, 보다 명확한 목표를
세운뒤 능동적인 업무를 통해 달성여부정도를 파악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업형이다.
이제까지 정부 기준으로 공공재 및 서비스를 제공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소비자이자 고객인 국민의 만족도 증진을 우선시하는 노력이다.
뉴질랜드는 국세청의 경우 <>서신문의 카운터문의 문제해결 등에 대한
처리건수의 예산치와 실제치 <>응답시한 준수정도 <>비용 등을 비교하는 등
부처별로 목표달성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영국은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헌장"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미국도 "대국민서비스기준"을 도입, 운용중이다.
효율성 제고목 적의 과감한 조직개편도 이뤄지고 있다.
경쟁개념을 집어넣기 위해 <>계약제 <>기업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각종 집행업무를 별도의 "Next Stop"사업소로 조직화했다.
경영상의 재량권을 완전히 보장해 주었다.
사업소장은 한정된 임기의 계약직으로 채용된다.
호주는 기존 여러 중앙부처의 일반행정업무를 행정서비스부로 이관한뒤
<>차량 및 운송 <>출판서비스 <>자산관리 등의 많은 업무를 상업화된 산하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영국은 기존 업무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가 <>반드시 정부가 책임을
맡아야 하나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하나 <>정부가 수행할 경우 효율성
증대방안이 있는가 등의 "시장성 테스트"를 실시한뒤 불필요한 업무를
외부계약이나 민영화시켰다.
영국의 공무원 및 공기업인력은 80년 6백55만명에서 92년에는
4백91만명으로 줄었고 뉴질랜드의 공공부문인원도 85년 34만7천명에서
92년에는 30만명으로 감축됐다.
미국은 오는 99년까지 27만9천명의 연방공무원을 퇴직시킬 계획이다.
이는 94년 연방공무원수의 12%에 달하는 수준이다.
선진국의 경우 조기.명예퇴직조치가 공무원에도 일반화된지 오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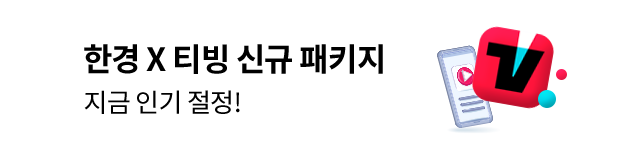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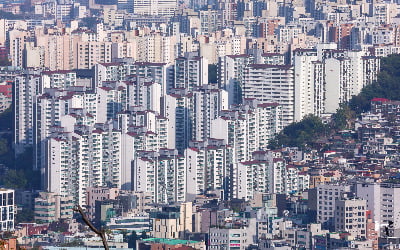
![경제학자 97% "의대 증원 필요"…의사 반대 본질은 "과점 이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ZA.3867838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