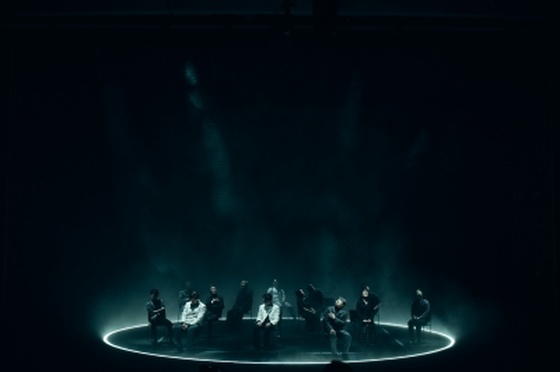[천자칼럼] 석굴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작은 석재를 쌓아올려 만든 인공석굴이다.
옛기록에 "직조석감"이라고 한 것은 돌로서 비단을 짜는 것처럼 감실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바로 이점이 석굴암 건축상의 특색이다.
황수영 박사 (문화재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이 석굴외부의 정상부에는
축조당시부터 기와가 덮혀 있었다.
역시 기와를 얹은 목조전실도 있었다.
그는 석굴주변에서 신라이래 각 시대의 기와편이 고루 발굴된 것을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석굴이 1200여년동안 버텨올 수 있었던 것도 앞의 목조전실이 보호해
준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제때 석굴을 수리하면서 이같은 석굴의 원형은 완전히 무시돼
버렸다.
전실이 있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복원하지 않고 석굴의
전면을 개방해 그대로 외부에 노출시켜온 것이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특히 1913년부터 3년동안 석굴을 완전 해체해 복원하는 과정에서
석굴외부에 시멘트 콩크리트를 하고 흙을 덮은 뒤 잔디를 심은 것은
석조물을 약화시켜 오늘날까지 석굴암보존상 큰 문제거리를 남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석굴암중수에 관한 기록은 조선중기 이후의 자료만이 남아 있다.
1703년 승려 종열이 석굴암을 중수하고 굴앞의 돌계단을 쌓았다는
기록과 1758년 대겸이 중수했다는 기록이 "불국사금창기"에 전한다.
또 조선말기에 울산병사 조례상이 석굴을 대대적으로 중수해 사람들이
석굴암을 "조가절"이라고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일제때 석굴암은 1913~15년, 1917년, 1920~23년 세차례에 걸쳐 중수됐다.
제1차는 황폐화된 석굴암을 완전 해체했다가 재조립하는 대대적인
공사였으나 2,3차는 석굴내의 누수 및 침수, 결로방지 습기제거를 위한
부분적 보수공사에 그쳤다.
광복후 거의 잊혀지다시피 했던 석굴암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것은
62년부터 64년까지 대대적 중수 복원공사를 거친뒤부터 였다.
20년만에 공개된 석굴암의 안쪽 돔에 균열이 생기고 곳곳에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신의 습도조절기나 유리차단벽도 근본적인 결함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나 보다.
석굴암을 하나의 응결된 콩크리트덩어리로 만든 과거 일본인들만
원망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하루속히 근본원인을 구명해 훼손을 막아야 한다.
석굴암은 이제 우리의 문화재일뿐아니라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교육혁신, 사라지는 연수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609646.3.jpg)
![[아르떼 칼럼] AI가 인간보다 더 풍부한 감정을 가질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7036337.3.jpg)
![[천자칼럼] 30년 만에 수출 꿈 이룬 K고속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03613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