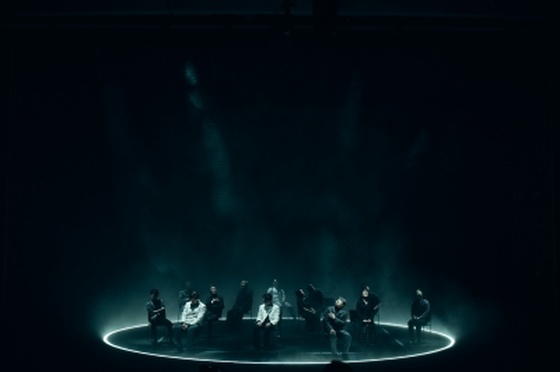[Y-파일] (직업의 세계) '큐레이터'..기획서 홍보까지 총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소 낯선 말이지만 큐레이터를 가장 적절히 나타내는 말이다.
큐레이터는 미술관등 문화공간에서 예술작품 소개및 전시를 기획하고
유치하며 고객을 관리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미술품을 소장 관리하면서 관람객이 가장 효과적으로 즐길수
있도록 하기위한 총체적인 작업을 맡은 "전시 기획가"이자 "미술행정가"
이다.
이같은 큐레이터가 20대 젊은이에게 인기직종으로 부상한 것은
최근 몇년 사이.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사람들이 점차 정신적인 면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시대적 흐름도 한몫했다.
이들은 동양화 서양화 조각 도예등을 전공했거나 미술사나 미학등을
전공한 미술관련 전공자들이 대부분.
그만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는 얘기다.
급여는 소속된 곳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줄잡아 초봉이 연 1,500만원
수준으로 학력에 비해 못미치는 편.능력에 따라 고소득을 올릴수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보다 예술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없이는 불가능 한 일이라는게
더 맞다.
외국의 경우 경력이 10년이상 넘어야 직함을 붙일 정도다.
하지만 이같은 전문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의
대상은 아니다.
"그림"이 좋다, "작가"가 좋다, "전시회"가 괜찮다는 말은 나와도
이를 기획한 큐레이터를 기억하는 관람객은 거의 없는 탓이다.
몇달에 걸쳐 주제를 설정하고 작가를 발굴하고 온갖 잡일을 다 하면서
전시회를 열지만 항상 무대 뒤의 그림자 역할이다.
현재 미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큐레이터는 근 100여명.
하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큐레이터다운 큐레이터는
30명선이라는게 미술계의 평이다.
전시회를 보기는 쉬워도 만들어 상품으로 내놓는 것은 어렵다.
어떤 주제로 어떤 작가의 작품을 전시할 것인가에서부터 고민이다.
전시기획을 하고 작가를 섭외하고 팜플렛을 제작하고 홍보하고 전시하고
작가의 사후관리도 해야한다.
보통 한명의 큐레이터가 1년에 3~4개 기획 전시회를 하면 많이한
셈.
그만큼 하나 하나의 전시회에 피땀이 들어간다.
작가 발굴도 많이 달라졌다.
"돈되는" 작가를 선택해 무조건 전시회를 열던 옛날과는 다르다.
요즘은 작품이 많이 팔리지 않더라도 가능성 있는 작가를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는 큐레이터도 많아졌다.
대중에게는 문화향수를 전해주고 신인작가에게는 무료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전시회의 기회를 주자는 뜻이다.
금호미술관의 큐레이터 박영택씨는 "학연등과는 무관하게 소외되고
좋은 작가들을 발굴해 소개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미술계가 지나치게 상업화된 것에 대한 비판이다.
큐레이터들의 역할중 또 하나는 바로 대중들에게 미술품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는 것.
예술감상은 소유가 아니라 공유이기 때문이다.
돈많은 사람은 가치있는 미술품을 소장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감상을 통해 그 진정한 가치를 안다.
"아는 만큼 느낀다"는 유홍준교수의 말이 이처럼 잘 들어맞는데도
없다.
큐레이터는 전시회를 기획하면서 또 다른 비상을 꿈꾼다.
각종 행사이벤트는 1회성 행사로 끝나지만 전시회는 그 자체가 하나의
연구과정이다.
끊임없는 진행과정이다.
그 소비형태도 다르다.
큐레이터에게는 미술과 시대의 흐름을 알게하고 대중에게는 문화향수를
주고 작가에게는 냉정한 비판과 자기성찰의 기회가 된다.
그 속에서 미술계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에게는 미술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지가 있다.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고싶은 일을 한다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 김연희씨)는 말에는 이런 자부심이
가득 담겨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8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교육혁신, 사라지는 연수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609646.3.jpg)
![[아르떼 칼럼] AI가 인간보다 더 풍부한 감정을 가질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7036337.3.jpg)
![[천자칼럼] 30년 만에 수출 꿈 이룬 K고속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03613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