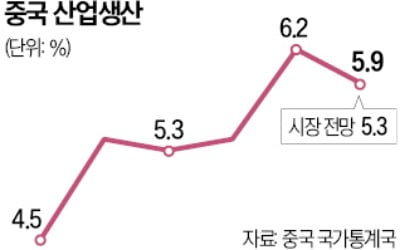['고비용' 벽을 깨자] (1) 시리즈를 시작하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제가 어렵다.
성장도 물가도 국제수지도 정상궤도를 일탈해 질주하고 있다.
기업들은 한국이 불모의 땅이라도 되는 양 해외 탈출극을 벌이고 있다.
이러다간 우리 모두 망하는 것 아니냐는 방정맞은 소리까지 들린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진단도 갖가지다.
정치 사회적 분위기가 기업마인드를 위축시켰다는 등 소프트 측면의
접근도 있다.
그러나 근원적인 진단과 처방은 한가지다.
경쟁력 약화란 하드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비용-저효율구조가 근인이고 따라서 저비용-고효율구조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사실 한국경제의 병은 "고비용 벽"에서 비롯됐다.
고임금 고지가 고금리 고물류비 고규제 고소비로 6중의 벽을 높게 쌓고
있다.
먼저 임금은 "철밥통"이다.
일을 하든 않든,잘하든 못하든 "평등"하다.
자연히 인건비는 비쌀 수 밖에 없다.
한국 근로자 1명을 고용할 돈이면 동남아지역에선 10명의 현지인을 쓸 수
있다.
85년 대만의 64% 수준이었던 한국의 인건비는 95년 1백20%로 "대역전극"을
벌일 정도로 치솟았다.
한국의 땅은 예나 지금이나 금싸라기다.
공장부지값은 다른 나라에 비해 20배에서 최고 1백배 가까이 더 든다.
금리는 "경제깡패"라고 불릴 정도로 높고 물류비 역시 일본이나 미국의
2배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로 인한 비용과 기업의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에도
하나같이 고자가 붙어 있다.
"금싸라기" 땅에 공장을 세워 "경제깡패"에 시달리며 "철밥통"에 사정해
만든 한국제품의 원가는 보나마나다.
한국을 대표하는 Q전자의 집적회로(IC)는 중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50%나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다고 경쟁력의 또 한 축인 고기술이나 고품질의 상품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러니 수출이 잘될 리 없고,국내 소비자라고 국산품을 찾을 까닭이 없다.
"생산효율이 수반되지 않는 한 아시아국가들의 성장은 한계에 부닥칠 것"
(폴 크루그먼 미스탠포드대학 교수)이라는 지적이 지금 한국에서 검증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고비용 저효율구조-
한국경제의 구조적 병인은 경제주체 모두에게 일단의 책임을 돌릴 수 있다.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식의 천민자본주의를 떠받들어온 일부 기업이나
고도성장기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떤 식으로든지 보상받고야 말겠다는 근로
계층은 "한국병"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쪽은 역시 정부였다.
그 수단은 대부분 "행정규제"였다.
노동정책은 의도했건 아니건 임금의 급상승을 유발했고, 공급규제 일변도의
토지정책은 부동산버블을 야기했다.
호송선단식 금융정책은 그대로 금리의 고공비행으로 이어졌으며, 투자순위
에서 밀린 사회기반시설 정책은 고물류비용을 가중시켜 왔다.
이렇게 보면 한국경제가 발생시키는 고비용은 정부의 과잉개입으로 생긴
정부실패비용(Government failure costs)의 총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보다는 고비용이 고가격을 만들어내고,고가격이 다시 저효율을 빚어내는
악순환을 차단하는게 더 급선무다.
예컨대 노동에 대한 대가가 평등해야 된다고 해서 악평등주의로 흐른다면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
"금융 쇄국"주의가 고금리의 주범이라면 "금융 개국"을 서두를 일이다.
필요하다면 은행구조도 바꿔야 한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논리와 시장경쟁의 원칙에 어긋난 제도와 시스템이
있으면 그건 하루빨리 뜯어 고쳐야 한다.
일시적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그런 논리와 원칙을 고집한다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고효율 저비용구조가 싹틀 것이다.
그게 바로 개혁이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제도를 바꾸고 개혁정책을 써서야 되겠느냐고.
그에 대한 답은 "목욕탕 수리는 여름에 하는 법"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는 어려울 때 합심했다.
좋을 때보다 위기 때 고통을 분담하면서 더 저력을 발휘했다.
한번 고치겠다고 마음먹으면 끝내 그것을 해내고 말았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가난으로부터 일어서서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땅에 이만한 삶의 경제를 건설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한다면 정말 했다.
지금도 한다면 할 수 있다.
< 유화선 부국장대우 / 산업1부장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9일자).
성장도 물가도 국제수지도 정상궤도를 일탈해 질주하고 있다.
기업들은 한국이 불모의 땅이라도 되는 양 해외 탈출극을 벌이고 있다.
이러다간 우리 모두 망하는 것 아니냐는 방정맞은 소리까지 들린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진단도 갖가지다.
정치 사회적 분위기가 기업마인드를 위축시켰다는 등 소프트 측면의
접근도 있다.
그러나 근원적인 진단과 처방은 한가지다.
경쟁력 약화란 하드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비용-저효율구조가 근인이고 따라서 저비용-고효율구조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사실 한국경제의 병은 "고비용 벽"에서 비롯됐다.
고임금 고지가 고금리 고물류비 고규제 고소비로 6중의 벽을 높게 쌓고
있다.
먼저 임금은 "철밥통"이다.
일을 하든 않든,잘하든 못하든 "평등"하다.
자연히 인건비는 비쌀 수 밖에 없다.
한국 근로자 1명을 고용할 돈이면 동남아지역에선 10명의 현지인을 쓸 수
있다.
85년 대만의 64% 수준이었던 한국의 인건비는 95년 1백20%로 "대역전극"을
벌일 정도로 치솟았다.
한국의 땅은 예나 지금이나 금싸라기다.
공장부지값은 다른 나라에 비해 20배에서 최고 1백배 가까이 더 든다.
금리는 "경제깡패"라고 불릴 정도로 높고 물류비 역시 일본이나 미국의
2배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로 인한 비용과 기업의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에도
하나같이 고자가 붙어 있다.
"금싸라기" 땅에 공장을 세워 "경제깡패"에 시달리며 "철밥통"에 사정해
만든 한국제품의 원가는 보나마나다.
한국을 대표하는 Q전자의 집적회로(IC)는 중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50%나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다고 경쟁력의 또 한 축인 고기술이나 고품질의 상품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러니 수출이 잘될 리 없고,국내 소비자라고 국산품을 찾을 까닭이 없다.
"생산효율이 수반되지 않는 한 아시아국가들의 성장은 한계에 부닥칠 것"
(폴 크루그먼 미스탠포드대학 교수)이라는 지적이 지금 한국에서 검증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고비용 저효율구조-
한국경제의 구조적 병인은 경제주체 모두에게 일단의 책임을 돌릴 수 있다.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식의 천민자본주의를 떠받들어온 일부 기업이나
고도성장기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떤 식으로든지 보상받고야 말겠다는 근로
계층은 "한국병"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쪽은 역시 정부였다.
그 수단은 대부분 "행정규제"였다.
노동정책은 의도했건 아니건 임금의 급상승을 유발했고, 공급규제 일변도의
토지정책은 부동산버블을 야기했다.
호송선단식 금융정책은 그대로 금리의 고공비행으로 이어졌으며, 투자순위
에서 밀린 사회기반시설 정책은 고물류비용을 가중시켜 왔다.
이렇게 보면 한국경제가 발생시키는 고비용은 정부의 과잉개입으로 생긴
정부실패비용(Government failure costs)의 총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보다는 고비용이 고가격을 만들어내고,고가격이 다시 저효율을 빚어내는
악순환을 차단하는게 더 급선무다.
예컨대 노동에 대한 대가가 평등해야 된다고 해서 악평등주의로 흐른다면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
"금융 쇄국"주의가 고금리의 주범이라면 "금융 개국"을 서두를 일이다.
필요하다면 은행구조도 바꿔야 한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논리와 시장경쟁의 원칙에 어긋난 제도와 시스템이
있으면 그건 하루빨리 뜯어 고쳐야 한다.
일시적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그런 논리와 원칙을 고집한다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고효율 저비용구조가 싹틀 것이다.
그게 바로 개혁이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제도를 바꾸고 개혁정책을 써서야 되겠느냐고.
그에 대한 답은 "목욕탕 수리는 여름에 하는 법"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는 어려울 때 합심했다.
좋을 때보다 위기 때 고통을 분담하면서 더 저력을 발휘했다.
한번 고치겠다고 마음먹으면 끝내 그것을 해내고 말았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가난으로부터 일어서서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땅에 이만한 삶의 경제를 건설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한다면 정말 했다.
지금도 한다면 할 수 있다.
< 유화선 부국장대우 / 산업1부장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9일자).
![[포토] 카뱅, 소상공인 ‘안심통장’ 지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AA.3984182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