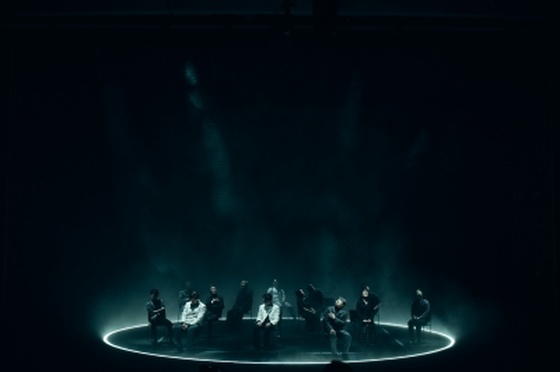[오피니언] 고급두뇌 방황않도록 사회분위기 조성을..홍양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도 G7 경제대국그룹에 들어설수 있다는 부푼
희망에 가득차 있다.
국민적 차원의 미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분석과 예측을 토대로
하여 이러한 희망을 갖도록 해 놓았다고 믿고 싶다.
그러나 내일 세계시장에 떳떳이 내놓을수 있는 상품을 계속 개발하지
않고서는 경제대국으로의 부푼 꿈은 한갓 희망사항으로만 끝날수 있다.
우선 기술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환언하면, 오늘이 없는 미래가 없듯이 현재의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내일의 기술선진화는 더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기술선진국이 될수
있다는 확신은 어느 정도 유보를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유보논리의 기준은 바로 오늘의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하자원과 시장규모가 빈약한 우리로서는 오로지 기술개발의 산물인
새로운 상품수출이 전제되어야만 경제활성화를 논할수 있을 것이다.
1994년 현재 자연 공학계 박사학위자수는 약 4만여명.
이중 대학교에 78% 국.공립연구기관에 14%, 기업체 연구기관에 약 8%정도가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통계수치이자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이다.
선진국에서는 산업체 연구기관에서 기술개발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한국의 현실은 대다수의 고급 두뇌들이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선진국과 동등수준 또는 그 이상의 상품을 개발하려는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기술인력의 분포현황이다.
기술선진국이라 함은 기업 또는 국가의 자본자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고, 바로 인력 그자체가 자본이 되어 기술선진국을 이루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개발자본인 오늘의 기술인력 현황을 들여다 볼때 산업체 기술
인력의 미래지표는 바로 "방황"이라는 단순언어 하나로 표현하고 싶다.
고급인력의 방황은 곧바로 기술개발의 방황을 의미하며 따라서 G7경제대국
그룹멤버의 꿈은 현실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수많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설립되어 많은 신규임용 교수들을
찾고 있는 현실앞에서, 많은 기업들이 고급두뇌들을 끌어 안기에 역부족을
느끼는 현실이다.
대학이라는 직장의 급여수준이 그리 만만치 않으며, 스스로 Managing 할수
있는 시간, 65세까지의 안정된 직장, 교수직에 대한 우리사회의 높은 인식
등 이러한 제반조건이 기업에서의 근무조건보다 훨씬 좋다는 판단에 따라
많은 고급 두뇌들이 기업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항상 교수직에 대한
동경으로 마음 한 구석을 메우고 있거나 또는 이해득실의 결과로 이직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기술개발과 상품개발에 전념치 못하고 방황하는 고급두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긍지를 갖지 못하는 기업 연구종사자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기업과
정부는 깊이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여 방황하지 않는 고급 두뇌들을 기업에서
포용할수 있는 대응방안이 시급하다.
과학 기술자들의 연구철학이 또한 심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가 왔다.
기업에서는 과학 기술자들이 연구에 전념하여 상품개발까지 연계할수
있도록 시간을 허용해야 되며 인센티브와 긍지를 갖고 일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구원으로 시작해서 연구원으로서의 정년을 다할수 있는 환경마련이
시급하다.
기업연구소의 개발제품을 상품화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므로
상업화에 따른 기업비용에 대하여 정부의 배려가 필요함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모두 알고 있다.
특히 대학당국은 과학 기술박사의 78%를 수용하고 있다는 자부심보다는
이 인력을 어떻게 하면 기술발전에 도움이 되게 할수 있는가를 재고할 때가
되었다.
박사학위가 끝나자마자 조교수로 부임하여 정년을 보장하기보다도 기업과
같이 경쟁속에서 연구성과를 국가사회에 환원할수 있는 교수에게만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연구시설과 분위기가 변변치 않은 대학내에서는 학과강의에 전념할수
있도록 개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대학이 연구중심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지만, 교과과정 강의 역시
미래의 고급두뇌를 생산하는 자원임을 강조하고 싶다.
교과과정을 강의함에 있어서 꼭 박사학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최근 국내경제의 지표가 일부 악화되는 것을 느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쾌한 한마디 답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이유중의 하나는 바로 내일 세계시장에 내놓을 만한 자랑스러운 고유기술
상품이 없다는 점이다.
바로 고급 두뇌들의 방황하는 결과이다.
아직까지는 우리사회 모두가 기업내의 고급두뇌집단들의 방황에 대하여
평가를 유보해 온 것은 사실이다.
G7 경제대국에 끼어들기 위해서는 두뇌들이 방황하지 않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왜 기업의 고급두뇌들이 방황하는가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솔직히 털어놓음으로써 내일의 상품개발에 희망을
가질수 있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교육혁신, 사라지는 연수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609646.3.jpg)
![[아르떼 칼럼] AI가 인간보다 더 풍부한 감정을 가질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7036337.3.jpg)
![[천자칼럼] 30년 만에 수출 꿈 이룬 K고속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03613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