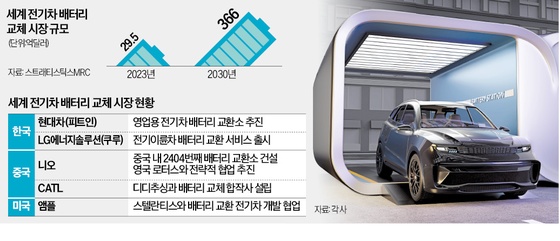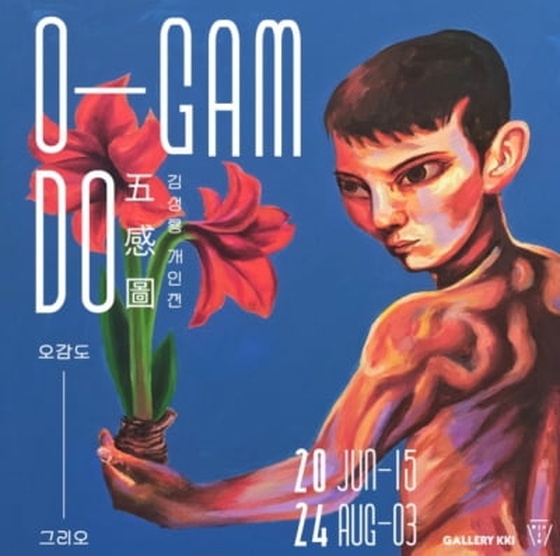[한경독자광장] 납골당 이용 늘려 묘지난 해결하자..이혁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장묘시설을 둘러보았다.
전부터 "벽제화장터"라고 불려온 장묘사업소가 말끔히 단장돼 그동안
왠지 꺼림칙하기만 하던 "화장장"이라고 보여지지 않았다.
특히 6,000위 이상의 납골을 모실수 있는 "봉안당"은 매우 인상 깊은
납골당이었다.
화장장과 납골당이 결코 "혐오시설"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사업소장과 직원의 안내로 공개된 화장장 납골묘 유택동산등 장묘시설은
소위 장례식장이라는 분위기 바로 그것이었다.
아직 우리에겐 장례 예식장이라는 말이 낯설지만 외국의 경우는 화장이후
납골당에 모시는 일련의 절차가 경건한 예식으로 일반화된지 오래다.
그럴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묘지난이 심각한 수준에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의 장례문화가 묘지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묘지면적은 서울시의 1.6배이며, 매년 여의도 3배크기의
묘지가 새로 생기며 국토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다 간과할수 없는 문제의 하나가 35%에 달하는 700만기가 무연고
묘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흔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장묘문화만큼 의식전환이 필요한 분야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묘지만이 조상을 바로 모시는 방법이라는 지금까지의 우리 의식과 정서가
변해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이견이 있을수 있다.
하지만 좁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산림보존차원에서, 분묘제도를 없앤
일본 대만등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혁진 < 서울 금천구 독산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5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육성이 경영이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598454.3.jpg)
![[이응준의 시선] 견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23536927.3.jpg)
![[차장 칼럼] 빌라에 새겨진 주홍글씨](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16018106.3.jpg)


![논란의 560억 달러 결국 받는다…"자율주행 전환 큰 진전"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140723069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