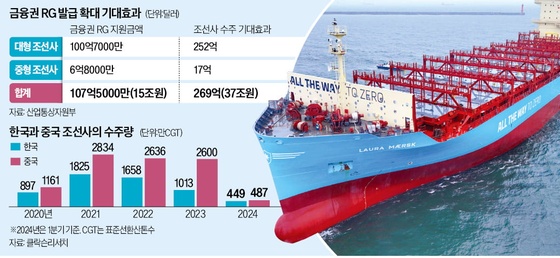[한경시론] 신원보증제의 불합리성 .. 박동섭 <변호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실제로 신원보증책임을 지게 된 어머니와 딸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남편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의 딸이 회사에 취직한다고 신원보증을
서주었다.
친구의 딸이 취직후 회사에 다니면서 3억원이 넘는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말았다.
그래서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사망하고 회사는 그 상속인들인
어머니와 딸, 아들을 상대로 보증책임을 지라는 소송을 걸었다.
재판결과는 보증인이 그 손해액 중에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보증인이 사망하였으니 상속인들이 각자 3,000여만원씩을 배상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한가지 딱한것은 남편 사망후 경황이 없이 시간이 흘러서 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신고(사망후 3개월안에 하여야 함)를 놓친 것이다.
보증인의 채무가 고스란히 상속인들에게 승계되고 만것이다.
상속포기등 법을 잘 알았더라면 이러한 보증채무를 면할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제는 어쩔수 없게 되었다.
아버지의 인정때문에 그 아들과 딸, 그리고 어머니는 의외의 빚, 그것도
거액의 채무를 떠맡게 된것이다.
신원보증은 근로자(공무원 포함)가 취직을 할때, 앞으로 혹시라도 근로자가
회사에 입힐지도 모르는 손해를 보증인으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사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서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받는 계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다.
고용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이지, 보증인에게는
아무 관계도 없는것이다.
더구나 보증인은 인정에 못이겨 아무 대가관계없이 보증을 서주는 것이
보통이다.
보증을 설 당시 주위에서는 "이 보증서가 형식적인 구비서류에 지나지
아니한다.
걱정말라"는 말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일이 잘못되면 그 손실은 보증인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만다.
불확실한 장래의 손해를 미리 방지하는 제도는 보험이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고 일단 보험사고가 생기면 손실보상을 해 준다.
그러나 보증인은 아무 것도 받은 것이 없이 손해가 생기면 책임만 진다.
예측가능한 손해배상이 현대법의 원칙이다.
보증인은 어느 날 느닷없이 집이 압류당하고 하루 아침에 길거리에 나가
앉아야 한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바로 이런 경우다.
이러한 신원보증제도를 아직도 유지하여야 할 것인가.
사용자는 자기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사전에 충분하고 자세하게
신원을 조사하여 채용하여야 하고 일단 채용한 다음에는 자기책임하에 그
사람을 믿고 일을 시키면서 계속 감독도 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사고의 경우는 사용자가 자기의 감독.관리상의 태만이나 잘못을
보증인에게 떠넘기는 식이다.
물론 "보증인은 자기가 보증서기 싫으면 안서면 될것 아닌가?"하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용자나 국가등 이른바 강자측에서 신원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이상 약자인 근로자는 취직하기 위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보증인을 찾아서 세우지 아니할수 없다.
이는 과실책임의 원칙과 개인주의 법의 기본원칙에도 배치되는 어거지
제도다.
개인책임주의 법이 발달된 영국이나 미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
우리나라의 어느 1개 보험회사의 1994년도 1년간 신원보증보험계약
체결건수를 알아보니 총 가입건수는 50만건인데 보험료수입은 74억원
보험사고건수는 190건 보상금액은 13억원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 보험회사는 1년간 61억원의 순수입을 얻었다는 결과다.
하루빨리 신원보증인 개인에게 억울한 책임을 지우는 신원보증제도는
없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보증보험으로 대체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것이 예측가능한 손실보상이라는 현대법의 원리에도 들어맞는다.
그리고 사회적강자들도 이러한 보증사고 희생자를 더이상 만들어내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기고] 글로벌 경영의 필수품 'ESG 전략'](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62998.3.jpg)
![[한경에세이] 떠오르는 인도, 동방의 등불 코리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629524.3.jpg)
![[주용석 칼럼] 연금개혁, 정부안부터 내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14477123.3.jpg)


![美소비자 심리 둔화에 반락한 유가…"수요 강세 전망은 호재" [오늘의 유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03937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