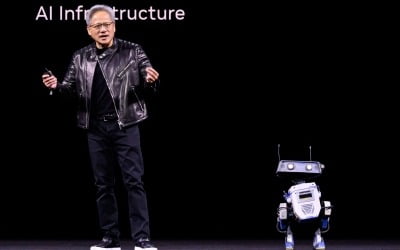[32회 저축의날] 풀죽은 '저축의 날' .. 노씨 비자금 파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1일은 "제32회 저축의 날".
은행등 금융기관들에겐 "최대의 명절"이다.
적어도 예년 같았으면 그랬다.
그러나 올해는 어쩐지 신명이 나지 않는 분위기였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고전적인 표어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저축은 미덕"이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힘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힐금힐금 고객들의 눈치만 볼뿐 금융기관직원들은 웬지 주눅들어
있었다.
물론 은행등 금융기관들은 예년처럼 풍성한 행사를 준비하기는 했었다.
국민 기업은행등은 "저축증대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한미은행은 "거리음악회"를 열었다.
다른 은행들도 각 영업점에 큼지막한 현수막을 내걸고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고객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전직 대통령이 5천억원을 순식간에 빼돌리는 마당에 무슨 저축이냐"는
핀잔을 주기 일쑤였다.
다른 때 같으면 자기순서를 잘도 기다리던 고객들도 "왜 일을 빨리 처리해
주지 않는냐""5천억원만 처리하다보니 소액 예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느냐"
고 거칠게 항의했다.
현금자동지급기(CD)가 고장나면 "돈세탁은 잘 해주는 은행이 기계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느냐"고 따지고 들었다.
한 영업점관계자는 "비자금판문으로 "대도무문"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티끌모아 태산"을 주장할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예년같으면 "저축상"이니 뭐니해서 떠들썩할 저축의날에 은행들에 다가온
과제는 추락한 공신력의 신속한 회복이라는 얘기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일자).
은행등 금융기관들에겐 "최대의 명절"이다.
적어도 예년 같았으면 그랬다.
그러나 올해는 어쩐지 신명이 나지 않는 분위기였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고전적인 표어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저축은 미덕"이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힘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힐금힐금 고객들의 눈치만 볼뿐 금융기관직원들은 웬지 주눅들어
있었다.
물론 은행등 금융기관들은 예년처럼 풍성한 행사를 준비하기는 했었다.
국민 기업은행등은 "저축증대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한미은행은 "거리음악회"를 열었다.
다른 은행들도 각 영업점에 큼지막한 현수막을 내걸고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고객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전직 대통령이 5천억원을 순식간에 빼돌리는 마당에 무슨 저축이냐"는
핀잔을 주기 일쑤였다.
다른 때 같으면 자기순서를 잘도 기다리던 고객들도 "왜 일을 빨리 처리해
주지 않는냐""5천억원만 처리하다보니 소액 예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느냐"
고 거칠게 항의했다.
현금자동지급기(CD)가 고장나면 "돈세탁은 잘 해주는 은행이 기계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느냐"고 따지고 들었다.
한 영업점관계자는 "비자금판문으로 "대도무문"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티끌모아 태산"을 주장할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예년같으면 "저축상"이니 뭐니해서 떠들썩할 저축의날에 은행들에 다가온
과제는 추락한 공신력의 신속한 회복이라는 얘기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