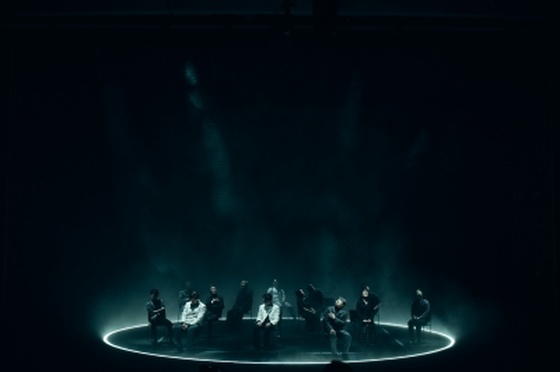[사설] (8일자) 컴퓨터통신 지재권보호 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나오면 습관처럼 움츠러들지 않을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미국으로부터 4년 연속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돼 지재권에
관한 통상압력수단인 "스페셜301조"의 칼날을 항상 의식해야 하는 데서 오는
긴장감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컴퓨터통신 저작물의 지재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같다는 소식이 국내 관련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번에 거론되고 있는 컴퓨터통신 시스템의 지재권보호 강화문제는 미국이
한국을 PWL로 지정한 가장 큰 이유인 컴퓨터프로그램 무단 복제문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컴퓨터를 통한 정보전송을 복사로 규정해
저작권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미정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할 경우 세계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그간 국내에서의 지재권보호는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산업 분야에서 크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들어 당국에서도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침해사범을 단속하는등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아직도 "까짓것 좀 베껴 쓴들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는
따위의 안일한 의식이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그런 터에 컴퓨터통신관련 저작물까지 지재권으로 보호해야 할 판이니
국내정보서비스산업의 곤혹스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 할만하다.
특히 인터넷등 국제정보통신망의 대부분이 미국에 접속돼 있어 대미 정보
의존율이 95%에 이르는 우리의 경우 엄청난 부담을 안게될 공산이 크다.
그래도 규모가 큰 정보서비스 회사들은 지금처럼 돈을 주고 외국정보를
사오면 된다지만 지금까지 외국정보를 무단 복제하거나 약간만 손질해
팔아온 중소업자들은 대부분 딱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컴퓨터통신 관련 저작물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분쟁에 대응
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효과적인 분쟁조정 장치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또 컴퓨터통신 관련 정보의 자급도를 높이기 위해 인하우스(In-House)
데이터베이스구축 등에 업계 스스로 발벗고 나서야 한다.
아울러 지금이야말로 지재권 전반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재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미국의 압력에 의해 우리 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라는 일방적인 피해의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우리도 후발개도국
등에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 세계 지재권보호의 파수꾼을 자처하는 미국도 19세기 중엽에는 유럽의
지재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하던 요주의 국가였지 않은가.
지재권보호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기업의 기술개발 의욕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컴퓨터통신 저작물의 지재권보호강화
를 계기로 확실하게 정립돼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8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교육혁신, 사라지는 연수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609646.3.jpg)
![[아르떼 칼럼] AI가 인간보다 더 풍부한 감정을 가질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7036337.3.jpg)
![[천자칼럼] 30년 만에 수출 꿈 이룬 K고속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03613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