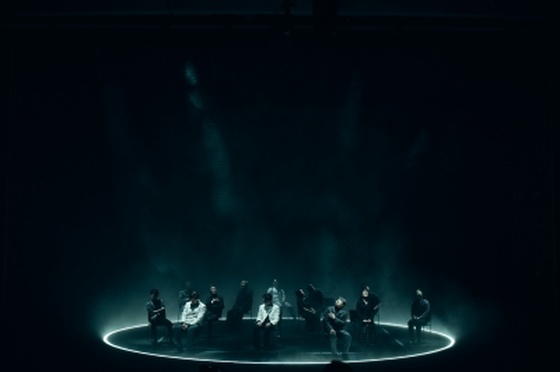[천자칼럼] 가짜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무소유"를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다.
그래서 출가한 사문에게는 누더기 옷과 걸식에 필요한 발우 한 벌이
전재산이다.
남에게 무엇을 보시할 때도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특히 "내"가 주었다는 생각마려 없을 때 그런 상태를 "삼륜청정"이라
하여 포시행의 이상으로 삼는다.
현대의 고승이라 칭송을 받고 있는 혜월선사(1862~1937)가 부산
선암사에 있을때 절에 큰 제가 들어 시장을 보러 가는 길에 구걸하는
여인을 만났다.
여인의 품에는 병든 어린아들까지 안겨있었다.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들은 스님은 장을 보기위해 가지고 가던 돈을
몽땅 그 여인의 손에 쥐어주고 휘적휘적 절로 되돌아 왔다.
그리고는 누구에게 무엇을 준 것은 몰론 시장에 가던 일까지 깡그리
잊어버렸다고 한다.
이것이 불교적 구휼의 모델이다.
조선왕조 500년동안 산속에 밀려나 살면서 외곬으로 "상구보제"의
길만을 아 았던 불교가 "하화중생"을 외치고 나선것은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근래에 들어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 상회참여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불교계다.
스님들이나 신도들의 의식구조도 그만큼 달라졌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잇는 불교복지시설이 법인 24개,비법인
66개에 이르고 있는것도 불교계의 달라진 모습의 하나이다.
부랑자보호시설인 "소쩍새마을"을 운영하던 전과8범인 일력이란 승려가
후원금을 착복해 토지등 200여억원상당의 재산을 모으고 10대원생
성추행과 운영비리가 드러나자 10억원을 빼내 중국으로 도주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그곳에서 한국의 반정부운동가로 자처하면서 후원금중 100억원을
밀반출하려 했다고 한다.
"소쩍새마을"이 법인은 아니라고 해도 13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용돼 있는 시설에 대한 관계당국의 무관심도 문제지만 승적도 없는
가짜 승려가 버젓이 승려행세를 하면서 축재를 하고 부정을 저지르게
한 것은 불교계가 그만큼 허술했다는 반증도 된다.
가짜승 하나가 불교복지사업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 버린 꼴이니
작은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도 "미친원숭이"처럼 날뛰는 가짜승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세상에서는 흔히 남을 위하는 일을 착하다고들 하지만 가짜승들에게는
그것이 생사윤회의 시까 될뿐이니 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교육혁신, 사라지는 연수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609646.3.jpg)
![[아르떼 칼럼] AI가 인간보다 더 풍부한 감정을 가질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7036337.3.jpg)
![[천자칼럼] 30년 만에 수출 꿈 이룬 K고속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03613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