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칼럼] 인재는 많아도 백락이 없다..유안진 서울대교수
박사학위를 받고도 취직을 못한 제자들 보기가 민망하여 푸념처럼
뇌이는 말이다. 옛날 중국에는 천리마같은 인재를 알아볼줄 아는
백락과 같은 임금들이 있었단다.
즉 주의 문왕은 낚싯터에서 강태공을,은의 탕왕은 부엌에서 요리사인
이윤을,그리고 고종은 도로공사판에서 막노동인부인 부열의 인재됨을
가려보고는 각기 재상으로 발탁하여 나라를 맡겼던바 과연 명재상들
이었다지만 오늘 우리나라에는 천리마같은 인재들을 알아볼줄 아는
백락같은 이가 없는가.
아니면 있으되 주문왕이나 은탕왕과 고종같은 막강한 힘을 갖지
못했는가.
그래서 국내외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재들이 재상자리는 고사하고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자리조차도 얻지 못하는건가.
바늘구멍같은 취직자리를 두고 몇번이고 추천서를 쓸때마다 "천리마는
많아도 백락이 있어야지"라고 자조적인 말만 씹을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다시 선생의 직업이 얼마나 안좋은 직업인가를 확인하게
되어 슬퍼지곤 한다.
백락은 본래 천마를 주전(주전)하던 별의 이름이라 하는데 백락일고에
의하면 춘추전국시대 진(진)나라 진목공때에 말상을 잘 본 손양을
백락이라 불렀다고 한다.
백락이 늘그막에,진목공이 부탁하기를 자식을 시켜 좋은 말을 구해
달라고 했다.
이부탁에 백락은 이렇게 대답했다.
"좋은 말이란 현용,즉 뼈대와 근육을 보면 가려낼수가 있지만 천하의
명마란 불때에 이미 그현상이 없어져가는 것도 같기 때문에 현상만
보고서는 잘 알수도 없을뿐 아니라 먼지를 일으키지도 않고 발자국도
남기지 않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 자식들은 재주가 시원찮아서 좋은 말을 고를순 있어도
천하명마를 가려볼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내집에 땔감과 소채를 대주는 구방연(구방연)이 나보다 말을
더 잘 볼줄 압니다"하고 추천했다.
이에 진목공은 구방연을 시켜서 명마를 구하게 했던바 석달만에
구방연으로부터 사구지방에 구해뒀다는 보고를 받았다.
진목공은 구방연을 별로 신통찮게 여겼던바 어떻게 생긴 말이냐고
묻자,암놈이고 누렁말이라고 아뢰었다.
진목공이 다른 사람을 시켜 알아보게 했더니 암말이 아닌 수놈이었고
검정말이 아닌가.
매우 실망한 진목공은 백락에게 "말의 빛깔도 못보고 암수도 구별못하는
사람을 천거했다"고 언짢아 하자 백락은 한숨을 쉬면서, "이를두고
천만명의 신하가 있다해도 세어 꼽을만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방연이 본 것은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는 말의 정수만 간파하고
불필요한 나머지는 잊어버렸고 또한 그 속은 꿰뚫었으되 그외양은
무시한 것입니다. 구방연은 살펴봐야 할것만 살펴봤지 필요없는 것들은
보지않은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진목공은 백락의 이같은 말때문에 하는수없이 그말을 데려오게
하였더니 과연 천하명마였다고 한다.
이고사에서 세상에는 천리마는 항상 있으나 백락은 항상 있지 않다하여
인재는 늘 있음에도 인재를 알아보는 사람은 항상 있는게 아니라는
비유가 생겼다고 한다.
또 염차지감이라는 말도 있으니 한 천리마가 소금수레를 무겁게 끌고
고갯길을 오르다가 백락과 마주치자 멍에를 맨채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백락을 쳐다보며 소리쳐 울자 백락도 말을 알아보고는 "너같은 명마에게
소금수레를 끌게하다니?"라고 탄식하며 말의 목을 안고 함께 울었다고도
한다.
온갖 고생을 다하여 최고학위까지 취득한 제자들이 가히 바늘구멍같은
교수자리를 얻지못할때마다 이 고사가 생각나서 슬퍼지곤 한다.
또한 제자들보다 못하면서도 먼저 자리를 차지한 자로서의 미안하고
민망함까지도 겸하여 떠오르는 고사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누가 요직에 등용되었다는 보도에도 과연 천리마인가,
명마를 가려볼줄 아는 백락인가를 생각해보곤 한다.
더구나 지자제선거철인 요즘에는 후보들이 명마인가,조랑말인가를
판별할줄아는 백락의 안목을 우리국민이 갖춰야 할텐데하고 걱정도
해본다.
제자취직도 못시키는 주제꼴에도 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9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특파원 칼럼] 100년 후 연금까지 고민하는 일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564071.3.jpg)
![[홍영식 칼럼] 헌법 전문은 '장바구니'가 아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5703783.3.jpg)
![[취재수첩] 기업엔 '기울어진 운동장'인 증선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5967907.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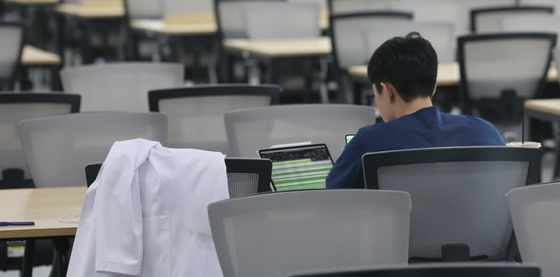

![[단독] 홈플러스,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한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273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