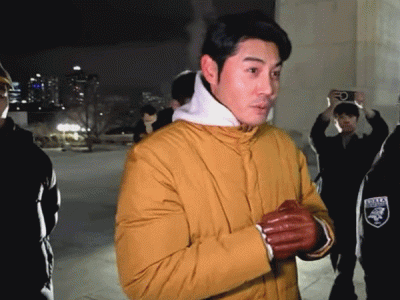콩쿠르에서 우승한 이면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심사위원중 한사람이었던 대피아니스트 리히터(S Richter)가 그의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클라이번에게 모든
항목에 걸쳐 최고점인 25점을 준 반면 나머지 사람에게는 예외없이 0점을
주었다고 한다.
콩쿠르의 결과는 이미 그에 의해 결정이 나 버린 셈이 되었다. 클라이번의
재능에 반하기도 했지만 심사하는 일을 너무 지겹게 느낀 나머지 빨리
끝내려고 그렇게 했다는 후일담이 있다.
과반수제를 위시한 대부분의 표결방법은 각 투표자가 단순히 찬반 여부
만을 표현할수 있을뿐 그 선호의 강도를 표현할수 없게 해놓고 있다.
어떤 의안에 대해 목숨을 내걸고 반대하는 사람이나 마지못해 반대하는
사람이나 다같이 반대 한 표씩만을 던질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표결방식에 의해 집단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최선의
결정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51%의 미온적인 찬성의견을 좇아
49%가 한사코 반대하는 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선호의 강도까지 표현할수 있게 만드는 표결방법으로서 점수투표제가
있다. 각 투표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배정하고 선호에 따라 적절히 점수를
배정하게 하는 표결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투표자가 전략적 행동을
통해 결과를 좌우할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는다.
전략적 행동이란 표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위해 자신의 선호를 왜곡하여
투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히터는 선호를 과장해 투표했을뿐이므로
엄밀히 말해 전략적 행동을 한것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것이 전략적
행동의 전형적인 예가 된다.
A군을 가장 좋아하나 아무리 점수를 몰아 주어도 우승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한 심사위원이 있다고 하자.
그렇지만 클라이번의 우승만은 한사코 막으려 하고 있다. 만약 B양에게
점수를 몰아주면 그녀가 우승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점수를
몰아준다.
사실 그녀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면서 클라이번의 우승을 막기위해
의도적으로 선호를 왜곡하여 투표했다는 의미에서 전략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이처럼 전략적 행동이 개입되어 얻은 표결결과에 문제가 있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난번에 과반수제는 투표의 역설현상을 일으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설명한바 있다. 게다가 투표자가 가진 선호의
강도를 표현할 방도가 없다는 약점까지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 본 점수투표제는 투표자의 전략적 행동에 취약성을 갖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표결방식 어느것이라 해도 나름대로
문제점을 갖고 있음이 입증된 정리가 있다.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려할때
믿고 사용할 방법이 없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담고 있는 정리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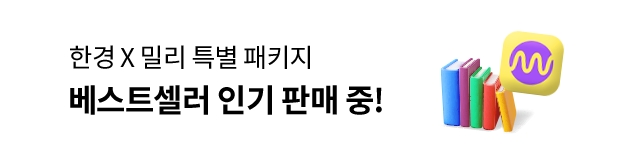
![[박영실 칼럼]"패션으로 역사 만드는 리더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옷차림"](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Q.38846526.3.jpg)
![[한경에세이] 고향 모래사막과 메가 샌드박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38566129.3.jpg)
![[조일훈 칼럼] 윤 대통령의 계엄령 파동…대한민국 피크아웃인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3538334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