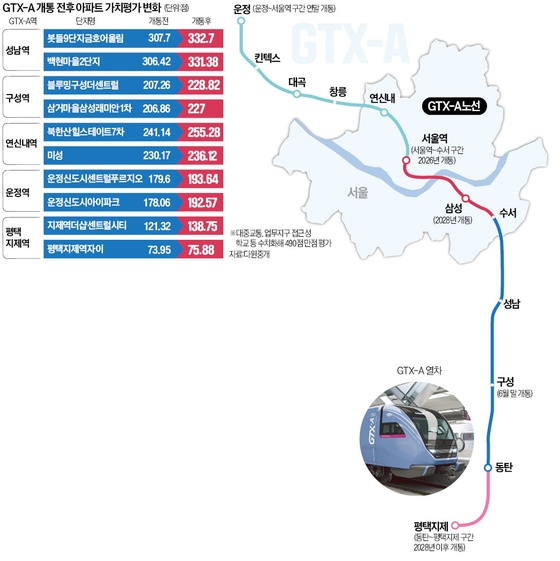[천자칼럼] 서훈의 조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무더기로 공신들이 생겨났다. 태조는 개국공신을 두지 않을수 없는 처지
였고 정종은 정사공신을 봉해야 했다. 태종도 좌명공신을 만들어 포상하지
않을수 없었다. 단종은 정난공신을 두었다. 특히 세조는 좌익.적희공신을
두어 공신들의 비호로 근근히 왕권을 유지했다. 예종도 익대공신을 두었다.
유일하게 공신을 두지않은 임금은 세종뿐이었다.
성종역시 예외일수가 없었다. 즉위 다음해인 1471년 성종은 70명이나 되는
신하들을 좌리공신으로 봉하겠다는 뜻을 적어 리조에 보냈다. 이들이 나라
가 어려운때를 만나 왕의 좌우에서 마음과 힘을 다해 일한 결과 민심이
안정되어 나라가 태평스러워 졌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대간들의 반대가 극렬했다. 공신은 난세를 수습했거나 나라의 창업, 중흥
에 공이 있을때 봉하는 것인데 이들이 무슨 공이 있느냐고 통박하면서 명분
없는 논공행상을 거두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심지어 좌리 4등공신으로
봉해진 대사간 김수령은 "신이 무슨 공이 있어서 공신의 반열에 참여하는지
모르겠다"고 상소까지 올려 왕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물론 그런 와중에서도
공신에 끼지 못한 39명이 스스로 자신의 공을 적어 올렸다가 백성들의 빈축
만 샀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왕조시대에는 일단 공신이 되면 공신적에 올리고 등급에 따라 왕이 노비
토지 말등을 하사했다. 더구나 그것이 세습되는 특전도 누렸으니 다투어
공신이 되려했다는 것을 이해할만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양철로 만든 꽃다발"에 지나지 않는 서양식 훈장을 주기
시작한 것은 1904년 고종황제가 칙령으로 "훈장조례"를 발효시키면서 부터
이다. 그런데 아직도 그 훈장을 타고 싶어하는 "공신"들이 있는 것을 보면
"훈장을 주면 신도 꼼짝 못한다"는 그리스의 격언이 한층 더 실감나게
들린다.
요즘 항간에는 26명이나 되는 전직 장.차관및 차관보들에게 근정훈장을
주기로 국무회의에서 슬그머니 의결한 것이 알려져 심심치않게 화제가 되고
있다. 훈장을 주려면 상훈심의회에서 공적을 심사한뒤 각의에서 다시 심의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적서에 그들의 공로가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몹시 궁금하다.
공없는 상과 이유없는 예물은 받지말라는 것은 우리 선인들이 남겨놓은
값진 교훈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다산칼럼] 금융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27877087.3.jpg)
![[취재수첩] 美암학회에 초대받지 못한 韓 AI 신약 벤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955477.3.jpg)
![[차장 칼럼] 포기하기 전에 가볼만한 곳](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5272590.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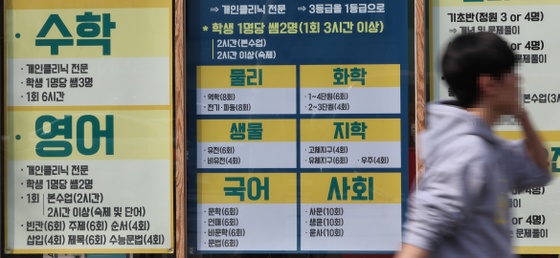

![옥수수 가격 반등…에탄올 수요가 견인 [원자재 포커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5973355.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