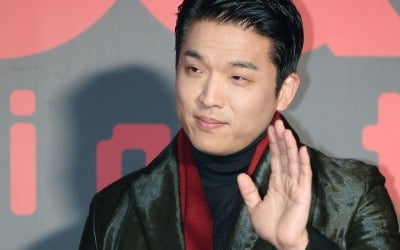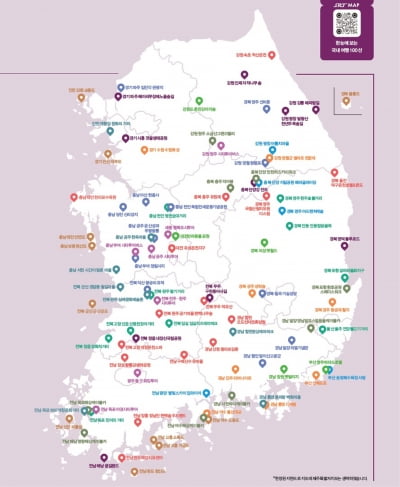[명인명창] (9) 판소리고법 김청만씨..타악기의 '달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청만씨(48.국립국악원 민속연주단연주원)는 치는 악기면 무엇이든 자신
있는 타악기의 달인이다. 꽹과리든 징이든 그의 손에 잡히면 천상의 변화와
지상의 흐름을 관통하는 자연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조화를 부린다.
그에게는 오래전에 붙은 묘한 버릇이 있다. 다른 타악기는 모두 오른손
으로 치는데 유독 북과 장구만은 왼손이다.
"열세살 때였습니다. 설장구 명인 최막동선생 앞에서 혼자 익힌 장구를
선보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최선생은 왼손으로 장구를 치는 그를 보고 "쌍장구치기에 안성맞춤"
이라며 칭찬을 했다. 그때 이후 그는 북과 장구를 칠 때만은 의식적으로
왼손을 사용했다. 일상생활에서는 오른손,직업의 세계에서는 왼손을 쓰는
독특한 버릇이 붙어버린 것이다.
46년 목포에서 출생한 김씨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농악걸립을 구경
다니며 혼자 타악기장단을 익혔다.
"바이올린을 배운 적이 있던 부친의 반대가 심하셨어요. 몇번 붙잡혀
다락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61년 김이삼씨가 운영하던 "일이삼악극단"에 들어가 최선생과 함께 설장구
공연을 자주했고 64~66년엔 임춘앵여성국극단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견우와 직녀" "너는 누구냐" "와룡산 아침 햇빛"의 장구반주를 맡았다.
북도 자주 쳤지만 판소리 완창이 없던 시절이라 토막소리 공연때 가끔
고수노릇을 하는 정도였다.
그가 고수의 길을 걷게 된것은 64년 한일섭 선생을 만나면서였다. 한선생
은 아쟁 태평소등을 연주하는 민속음악의 대가였지만 당시에는 이정업선생
과 함께 고수로도 활동했다.
"고수는 창자의 입에서 눈을 떼면 안된다"고 강조하던 한선생은 그에게
"10년이 지나면 고수가 달릴 것"이라며 그에게 북채를 잡을 것을 권했다.
"그때는 그말이 무슨 뜻인줄 몰랐습니다. 60년대중반 이후 박동진선생을
위시한 명창들의 완창무대가 이어지면서 고수가 부족해졌지요" 하지만 그가
제대로 된 직업을 갖게 된 것은 그로부터도 훨씬 후인 82년.
67년 입대, 70년 제대후 10여년에 걸친 "재야"연주인 생활을 청산하고서
였다. 한선생과 그 제자 박종선씨에게서 아쟁을 배운 김씨는 82년 아쟁
연주자로 국립창극단에 들어간다.
아쟁도 즐겼지만 평생 타악기의 매력을 잊지 못하던 김씨는 마침 국립
창극단에 몸담고 있던 명고수 김동준선생에게 매달렸다. 김선생은 박동실
명창에게 사사,판소리 다섯마당을 꿰는 명창출신 고수.
김씨는 김선생의 운전기사 노릇까지 하면서 배우러 다녔다. 그러나 김선생
의 교육방법은 독특했다. "북은 선생에게 배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가락
을 많이 배워봐야 어차피 제대로 못쓴다"며 몇 가락만 가르쳐주고는 항상
자습만 시켰다. 자꾸 더 가르쳐달라고 조르면 "나 하는것 보고 도둑질하란
말이여"라며 핀잔을 주기 일쑤였다. 어쩌다 김선생의 공연을 보지 않으면
"썩을 놈,그렇게 배우기 싫으냐"며 불호령을 내리곤 했다.
84년부터 완창무대의 정식고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오정숙명창의
무대가 데뷔무대였다.
선생들과의 무대가 부담돼 "너무 떨린다"고 말하면 오선생은 "담력
길러주려고 그런다"며 용기를 북돋워주곤 했다.
88년 국악원으로 옮기며 그는 국악계의 든든한 명고수로 자리잡는다.
단순히 리듬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의 역할까지 필요한 고법의
일가를 마침내 이뤄냈다. 김동준 김명환 김득수 명고들이 사라진 자리에
그가 남은 것이다. 91년1월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보유자후보로
지정될 때 45세라는 그의 젊은 나이를 문제삼는 이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실기인"의 자리를 더 아낀다. 이제는 "김청만
고법발표회"을 여는 것이 어떠냐는 주위의 권고에 그는 꿈쩍도 않는다.
1년에 갖는 1백50회 공연 모두가 발표회아니겠느냐고 반문한다.
"80년대만 해도 추임새가 멋들어진 노인청중이 많았지요. 해가 갈수록
사라지는 얼굴들이 많습니다" "얼씨구""잘한다""그렇지"등 추임새로 호흡을
맞춰주던 청중들은 사라지고 어쩌다 노랑목이 칼칼한 젊은 추임새가 있지만
공연에 방해만 된다고 아쉬워한다. 국악을 좋아하는 젊은이들도 판소리와
탈춤의 추임새가 다르다는 것을 알지못한다고 얘기한다. 예부터 "일고수
이명창"이란 말이 있지만 그는 김득수선생의 "일청중 이고수 삼명창"이란
말을 요사이 부쩍 실감하고 있다.
"국악의해는 너무 서둘렀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국악의해가 시작된 만큼
욕심내지 말고 저변확대와 대국민보급에만 주력했으면 합니다" 판소리의
고향인 호남지방에 가도 국악을 제대로 아는 이가 적은 현실을 자주 보게돼
안타깝다는 김씨가 국악의해에 거는 작은 바람이다.
<권녕설기자>
있는 타악기의 달인이다. 꽹과리든 징이든 그의 손에 잡히면 천상의 변화와
지상의 흐름을 관통하는 자연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조화를 부린다.
그에게는 오래전에 붙은 묘한 버릇이 있다. 다른 타악기는 모두 오른손
으로 치는데 유독 북과 장구만은 왼손이다.
"열세살 때였습니다. 설장구 명인 최막동선생 앞에서 혼자 익힌 장구를
선보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최선생은 왼손으로 장구를 치는 그를 보고 "쌍장구치기에 안성맞춤"
이라며 칭찬을 했다. 그때 이후 그는 북과 장구를 칠 때만은 의식적으로
왼손을 사용했다. 일상생활에서는 오른손,직업의 세계에서는 왼손을 쓰는
독특한 버릇이 붙어버린 것이다.
46년 목포에서 출생한 김씨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농악걸립을 구경
다니며 혼자 타악기장단을 익혔다.
"바이올린을 배운 적이 있던 부친의 반대가 심하셨어요. 몇번 붙잡혀
다락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61년 김이삼씨가 운영하던 "일이삼악극단"에 들어가 최선생과 함께 설장구
공연을 자주했고 64~66년엔 임춘앵여성국극단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견우와 직녀" "너는 누구냐" "와룡산 아침 햇빛"의 장구반주를 맡았다.
북도 자주 쳤지만 판소리 완창이 없던 시절이라 토막소리 공연때 가끔
고수노릇을 하는 정도였다.
그가 고수의 길을 걷게 된것은 64년 한일섭 선생을 만나면서였다. 한선생
은 아쟁 태평소등을 연주하는 민속음악의 대가였지만 당시에는 이정업선생
과 함께 고수로도 활동했다.
"고수는 창자의 입에서 눈을 떼면 안된다"고 강조하던 한선생은 그에게
"10년이 지나면 고수가 달릴 것"이라며 그에게 북채를 잡을 것을 권했다.
"그때는 그말이 무슨 뜻인줄 몰랐습니다. 60년대중반 이후 박동진선생을
위시한 명창들의 완창무대가 이어지면서 고수가 부족해졌지요" 하지만 그가
제대로 된 직업을 갖게 된 것은 그로부터도 훨씬 후인 82년.
67년 입대, 70년 제대후 10여년에 걸친 "재야"연주인 생활을 청산하고서
였다. 한선생과 그 제자 박종선씨에게서 아쟁을 배운 김씨는 82년 아쟁
연주자로 국립창극단에 들어간다.
아쟁도 즐겼지만 평생 타악기의 매력을 잊지 못하던 김씨는 마침 국립
창극단에 몸담고 있던 명고수 김동준선생에게 매달렸다. 김선생은 박동실
명창에게 사사,판소리 다섯마당을 꿰는 명창출신 고수.
김씨는 김선생의 운전기사 노릇까지 하면서 배우러 다녔다. 그러나 김선생
의 교육방법은 독특했다. "북은 선생에게 배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가락
을 많이 배워봐야 어차피 제대로 못쓴다"며 몇 가락만 가르쳐주고는 항상
자습만 시켰다. 자꾸 더 가르쳐달라고 조르면 "나 하는것 보고 도둑질하란
말이여"라며 핀잔을 주기 일쑤였다. 어쩌다 김선생의 공연을 보지 않으면
"썩을 놈,그렇게 배우기 싫으냐"며 불호령을 내리곤 했다.
84년부터 완창무대의 정식고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오정숙명창의
무대가 데뷔무대였다.
선생들과의 무대가 부담돼 "너무 떨린다"고 말하면 오선생은 "담력
길러주려고 그런다"며 용기를 북돋워주곤 했다.
88년 국악원으로 옮기며 그는 국악계의 든든한 명고수로 자리잡는다.
단순히 리듬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의 역할까지 필요한 고법의
일가를 마침내 이뤄냈다. 김동준 김명환 김득수 명고들이 사라진 자리에
그가 남은 것이다. 91년1월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보유자후보로
지정될 때 45세라는 그의 젊은 나이를 문제삼는 이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실기인"의 자리를 더 아낀다. 이제는 "김청만
고법발표회"을 여는 것이 어떠냐는 주위의 권고에 그는 꿈쩍도 않는다.
1년에 갖는 1백50회 공연 모두가 발표회아니겠느냐고 반문한다.
"80년대만 해도 추임새가 멋들어진 노인청중이 많았지요. 해가 갈수록
사라지는 얼굴들이 많습니다" "얼씨구""잘한다""그렇지"등 추임새로 호흡을
맞춰주던 청중들은 사라지고 어쩌다 노랑목이 칼칼한 젊은 추임새가 있지만
공연에 방해만 된다고 아쉬워한다. 국악을 좋아하는 젊은이들도 판소리와
탈춤의 추임새가 다르다는 것을 알지못한다고 얘기한다. 예부터 "일고수
이명창"이란 말이 있지만 그는 김득수선생의 "일청중 이고수 삼명창"이란
말을 요사이 부쩍 실감하고 있다.
"국악의해는 너무 서둘렀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국악의해가 시작된 만큼
욕심내지 말고 저변확대와 대국민보급에만 주력했으면 합니다" 판소리의
고향인 호남지방에 가도 국악을 제대로 아는 이가 적은 현실을 자주 보게돼
안타깝다는 김씨가 국악의해에 거는 작은 바람이다.
<권녕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