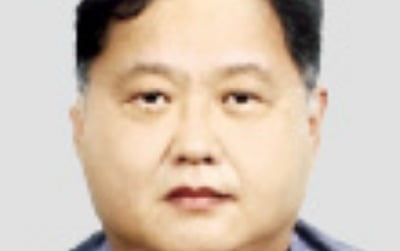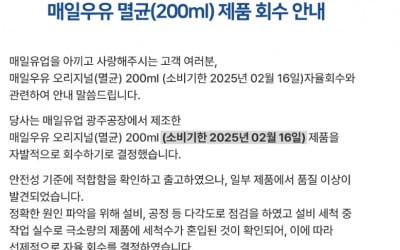인플레심리가 물가에 가장 큰 영향..산은, 75~92년 통계분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리나라의 물가는 소비.투자 등의 수요측면보다 임금과 이자율등 비용
요인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경향이 있으며 물가인상은 즉각 임금과
이자율을올리는 상호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임금과 금리를 안정시키고 지속적인
기술개발과생산성향상을 통해 비용인상압력을 흡수함으로써 물가와
임금.이자율이 서로 상승효과를 미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은행은 9일 "물가변동과 국민경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
75~92년사이의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물가를 변동시키는 요인은
인플레심리의 영향을 받아 물가 스스로 받는 상승압력이 42.5%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임금 21.1%, 이자율15.1%,투자 8.3%,수출 5.5%,소비
4.9%,수입 2.6%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따라서 임금과 이자율을 합한 비용측면의 인상효과가 36.2%로
소비.투자등의 상승압력 15.8%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물가가 1% 포인트 오를 경우 임금에 미치는 인상압력은
1~2분기의0.27% 포인트에 이어 3분기에 0.34% 포인트로 최고조에 달한후
점차 둔화되며 이자율은 1~2분기에 0.30% 포인트가 올라간 후 4분기에
1.1%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가점차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 1%상승이 실물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의 경우 1~2분기에 0.04%포인트
가 줄어든 후 7분기에 0.34% 포인트 감소로 정점에 달했다가 14분기 이후
에야 완전히 사라져 물가상승이 소비자들의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구매력을
떨어뜨림을 반영했다.
투자도 1~2분기에 0.34% 포인트 줄어든 후 6분기에는 1.47% 포인트까지
높아지며 수출에 대해서는 4분기까지 0.1~0.2% 포인트의 증대효과를
가져오다가 이후에는 감소효과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인플레는 일단 발생하면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각 경제주체의
인플레 기대심리를 통해 지속성을 갖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플레기대를
축소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통화.총수요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직접적인 가격통제는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압력을
가중시키므로 물가정책은 행정적 규제보다 총수요안정.수요조절 등을
중심으로 운용돼야하며 공공요금도 인상요인을 과도하게 누적시키기 보다는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그래도 불가피한
때에는 곧바로 현실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영춘기자>
요인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경향이 있으며 물가인상은 즉각 임금과
이자율을올리는 상호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임금과 금리를 안정시키고 지속적인
기술개발과생산성향상을 통해 비용인상압력을 흡수함으로써 물가와
임금.이자율이 서로 상승효과를 미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은행은 9일 "물가변동과 국민경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
75~92년사이의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물가를 변동시키는 요인은
인플레심리의 영향을 받아 물가 스스로 받는 상승압력이 42.5%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임금 21.1%, 이자율15.1%,투자 8.3%,수출 5.5%,소비
4.9%,수입 2.6%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따라서 임금과 이자율을 합한 비용측면의 인상효과가 36.2%로
소비.투자등의 상승압력 15.8%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물가가 1% 포인트 오를 경우 임금에 미치는 인상압력은
1~2분기의0.27% 포인트에 이어 3분기에 0.34% 포인트로 최고조에 달한후
점차 둔화되며 이자율은 1~2분기에 0.30% 포인트가 올라간 후 4분기에
1.1%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가점차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 1%상승이 실물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의 경우 1~2분기에 0.04%포인트
가 줄어든 후 7분기에 0.34% 포인트 감소로 정점에 달했다가 14분기 이후
에야 완전히 사라져 물가상승이 소비자들의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구매력을
떨어뜨림을 반영했다.
투자도 1~2분기에 0.34% 포인트 줄어든 후 6분기에는 1.47% 포인트까지
높아지며 수출에 대해서는 4분기까지 0.1~0.2% 포인트의 증대효과를
가져오다가 이후에는 감소효과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인플레는 일단 발생하면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각 경제주체의
인플레 기대심리를 통해 지속성을 갖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플레기대를
축소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통화.총수요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직접적인 가격통제는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압력을
가중시키므로 물가정책은 행정적 규제보다 총수요안정.수요조절 등을
중심으로 운용돼야하며 공공요금도 인상요인을 과도하게 누적시키기 보다는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그래도 불가피한
때에는 곧바로 현실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영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