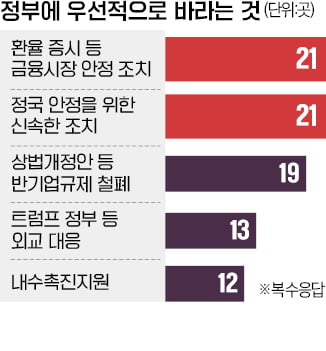[천자칼럼] 국악의 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3년전부터 문화예술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키고자 해마다 특정분야의
해를 지정해 각종 행사를 벌임으로써 안간힘을 기울여 왓다. 그러나 그
성과는 미미하다. 91년 연극.영화의 해에 연극향수인구의 저변확대를 가져온
것을 제외한다면 두드러진 것이 없다.
92년 춤의 해에는 무용계의 기둥격인 몇몇교수의 대학입시부정사건 연후로
계획된 행사마져도 제대로 치루지 못했을 정도였으니 그 결실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올 책의 해에도 기치만 요란했을뿐 출판문화가 뿌리를 깊이 내릴수 있는
기반을 다지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올 한해동안의 베스트셀러들의 면면
들을 음미해 본다면 어느 해나 다름없이 악화가 양화를 구독하는 격의 독서
풍토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을 국악의 해로 지정한 것은 그 어느 해의 것보다 의미
가 크다하지 않을수 없다. 한국인 심성과 한국의 토양에서 생겨나 자라고
가꾸어진 음악이기 때문이다.
조선조 실학자 다산 정야용은 음악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한바 있다.
"음악이 없어진 후에 형벌이 무겁게 되고... 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거짓이 성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국악은 오랜 세월에 걸쳐 한민족
의 영혼과 정서를 순화시켜 온 지주의 하나였음을 부인할수 없다.
그러나 국악은 일제의 강점기와 해방뒤에 서양음악이 물밀듯이 이입되면서
딴 나라의 소리처럼 뒷전으로 밀려났던 적이 있었다. 근년들어 전통자각의
물결과 더불어 국악도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동안 국악의 전통고수와 현대화의 갈등이 빚어진 적도 있었지만 그 저변
이 놀랄만큼 확산되어 온 것은 물론이다. TV에 방영시간이 배정되고 전용
극장이 신설되었는가 하면 오케스트라와 공연단체들이 생겨나고 창작활동이
활발해진 것들이 그것이다.
국악이 뿌리를 내릴 국악의 해로 지정을 지금에도 준비위원회가 치루어질
행사를 확정짓는 것은 고사하고 조직위마져 구성하지 못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비롯 시간적으로 늦기는 했으나 국악계의 모든 지혜를 모아
국악을 지키고 확산시켜 가는 한해로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해를 지정해 각종 행사를 벌임으로써 안간힘을 기울여 왓다. 그러나 그
성과는 미미하다. 91년 연극.영화의 해에 연극향수인구의 저변확대를 가져온
것을 제외한다면 두드러진 것이 없다.
92년 춤의 해에는 무용계의 기둥격인 몇몇교수의 대학입시부정사건 연후로
계획된 행사마져도 제대로 치루지 못했을 정도였으니 그 결실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올 책의 해에도 기치만 요란했을뿐 출판문화가 뿌리를 깊이 내릴수 있는
기반을 다지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올 한해동안의 베스트셀러들의 면면
들을 음미해 본다면 어느 해나 다름없이 악화가 양화를 구독하는 격의 독서
풍토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을 국악의 해로 지정한 것은 그 어느 해의 것보다 의미
가 크다하지 않을수 없다. 한국인 심성과 한국의 토양에서 생겨나 자라고
가꾸어진 음악이기 때문이다.
조선조 실학자 다산 정야용은 음악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한바 있다.
"음악이 없어진 후에 형벌이 무겁게 되고... 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거짓이 성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국악은 오랜 세월에 걸쳐 한민족
의 영혼과 정서를 순화시켜 온 지주의 하나였음을 부인할수 없다.
그러나 국악은 일제의 강점기와 해방뒤에 서양음악이 물밀듯이 이입되면서
딴 나라의 소리처럼 뒷전으로 밀려났던 적이 있었다. 근년들어 전통자각의
물결과 더불어 국악도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동안 국악의 전통고수와 현대화의 갈등이 빚어진 적도 있었지만 그 저변
이 놀랄만큼 확산되어 온 것은 물론이다. TV에 방영시간이 배정되고 전용
극장이 신설되었는가 하면 오케스트라와 공연단체들이 생겨나고 창작활동이
활발해진 것들이 그것이다.
국악이 뿌리를 내릴 국악의 해로 지정을 지금에도 준비위원회가 치루어질
행사를 확정짓는 것은 고사하고 조직위마져 구성하지 못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비롯 시간적으로 늦기는 했으나 국악계의 모든 지혜를 모아
국악을 지키고 확산시켜 가는 한해로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