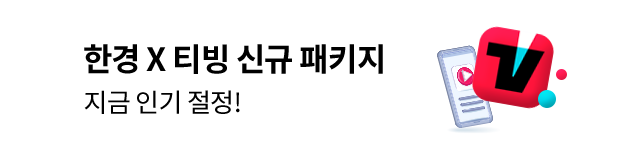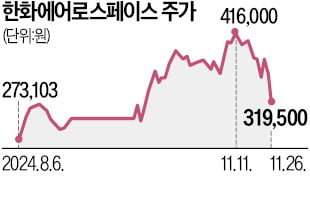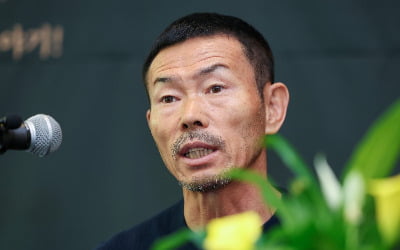잡혀가면서 어렵게 확보한 특혜적인 조건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최종의정서
(DFA)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심거리중의 하나이다.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어렵사리 설득해 아무리 합의를 이끌어내도
모든 GATT(관세무역일반협정)회원국이 서명하는 최종의정서에 유예조항이
제대로 포함돼야만 비로소 효력을 갖는 탓이다.
이해당사국이나 주요 관심국간의 합의는 어디까지나 개별국가간의 "흥정"
일뿐 세계각국이 인정하는 국제적인 규범으로서의 영향력은 갖지못한다는
말이다.
국가별 설득전 못지않게 의정서의 조문화작업이 중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
이다.
더구나 예외일정조항을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반영하느냐에 따라 해당
조문의 위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홀히 다룰수있는 문제가 아니기도
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쌀시장 개방유예조건들은 개별특성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인 원칙의 형태로 기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나 일본의 "쌀"에
대해서는 최소시장 개방폭을 "몇%"로 하고 "몇년"간 관세화를 유예한다는
식으로 국가명이나 상품명 이행조건들을 곧바로 쓰는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나라나 품목에 대해선 일반적인 효력을 갖는 단서조항을
둔다는 것이다.
예컨대 쌀의 최소시장개방에서 예외적인 낮은율을 적용할경우엔 <>최근
일정기간동안 특정품목의 수입실적이 소비규모의 일정수준이내이고<>정부의
보조금이 없고<>생산이나 경지면적이 일정기간이상 감소세를 지속한 품목
등으로 일정요건을 제시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요건을 어떻게 조문화하느냐에따라 특정국가나 품목의 사활이
달라지게 된다. 품목별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예를들어 한국의 쌀은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한다는등의 세부규정은 국가별 이행계획서를 통해
부속서류로 제출하게 되는 수순을 거친다.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형식인데 크게 각주(foot note)방식과 부칙
(annex)방식을 쓰게 될 전망이다. 각주방식은 최종의정서중 농산물시장
개방 관련 조항의 본문에 단서조항으로 병기하는 형식이다.
일반적인 원칙을 설정한뒤 "단,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식의 단서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부칙방식은 말 그대로 본문을 모두 정리하고난 말미에 본문의 효력을 보다
확실히 하기위한 부속요건의 하나로 정리하는 형태다. 일반법률에서도 흔히
있는 방식이다.
얼핏보면 어떤 형식을 취하건 특혜조치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형식 역시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일반적으로 본문에 삽입되는 각주방식은 "본문"의 하나이므로 조항을
설정하기가 까다로운 반면 개정요건도 엄격히 제한한다. 어렵지만 한번
정해놓으면 그만큼 안정성을 보장받는다는 얘기다.
이에비해 부칙은 대개 일정기간의 적용기간을 따로 제한하는 수가 많고
본문에 비해 개정요건도 덜 까다롭게 하는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만큼
조문의 위엄이 적다는 얘기인 셈이다.
결국 각부문에서 각종 유예를 적용받는 나라나 품목은 내용도 충실히
하면서 가급적 본문으로 보장받기를 원하게 될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쌀시장과 관련한 개방조건들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처리키로
돼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일단 미국측의 합의를 얻어내기가 어렵지
합의만되면 특별한 대우를 받도록 미국측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준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 협상대표단은 아직 쌀시장과 관련한 이행조건을
명문화하는 작업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게 사실이다.
다시말해 마무리를 소홀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상은 그 내용이 제대로
활자화돼야만 생명력을 갖는다는건 기본적인 상식이다. 다된 밥에 코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마무리작업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지적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