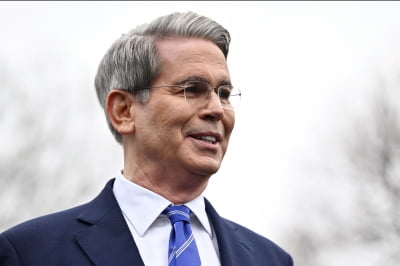[세계의창] 바멀의 병..변상근 재미자유기고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술과 생산성이 향상되면 제품의 제조원가는 그만큼 절감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생산성은 좀체로 늘지않고 제조코스트
(비용)만 상대적으로 높아가는 부문이 있다.
사람의 손끝과 두뇌 그리고 정성이 고도로 투입되는 의료와 교육
법률서비스 예술분야등이 그런 범주다.
사람의 손으로 짜는 카펫은 시대가 달라져도 생산성은 제자리 걸음이다.
1793년 모짜르트가 현악 4중주곡 하나를 작곡하는데 4개의 현악기와 네
사람의 연주자 그리고 35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자. 2세기가 지난 지금
이를 작곡한다해도 악기와 주자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은 마찬가지다.
하이테크 전자 현악기들이 동원된다 해도 작곡시간을 단축시키지는 못한다.
"바멀의 병"은 무슨 결핵이나 에이즈같은 죽음의 바이러스가 아니다.
생산성은 그대로인채 비용만 높아가는 이들 부문을 발견자인 뉴욕대학의
경제학자 "윌리엄 바멀"(William Baoumal)의 이름을 따 하나의 병으로
규정한 것이다.
바멀은 이를 "사람 서비스의 코스트 병"이라 이름짓고 이 추세대로 갈
경우 미국 전체 국내총생산의 60%를 의료비와 교육비에 빼앗기는 불행이
닥칠 것으로 경고한다.
제조업분야의 생산성은 가장 뒤쳐져 있다는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도 75년
1백명이 만들던 것을 90년에는 66명이 만들정도로 향상됐다. 석유정제업의
생산성은 지난 15년동안 38%, 철강은 74%, 반도체는 6백39%가 높아졌다.
반면 의료 교육 법률 복지 우편및 위생처리 공연예술분야등은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서비스 정체"지대다. 경찰예산은 팽창해도 범죄는 줄지않고
공립교육지출은 늘어나도 교육효과는 뒷걸음질이며 법률상담이나 치료의
경우 사람의 서비스는 그대로인 채 인건비 상승을 들어 값만 올려받는
"비용고 증후군"이다. 이 증후군은 공교롭게도 공공부문에 많다.
밀턴 프리드맨은 경제를 생산적인 민간부문과 비생산적인 공공부문으로
구분짓고 공공부문의 비생산성은 정치및 관료의 타성에다 돌렸다. 바멀은
이들 내부에 잠복해 있는 "코스트 병"에서 새로운 해답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생산성은 좀체로 늘지않고 제조코스트
(비용)만 상대적으로 높아가는 부문이 있다.
사람의 손끝과 두뇌 그리고 정성이 고도로 투입되는 의료와 교육
법률서비스 예술분야등이 그런 범주다.
사람의 손으로 짜는 카펫은 시대가 달라져도 생산성은 제자리 걸음이다.
1793년 모짜르트가 현악 4중주곡 하나를 작곡하는데 4개의 현악기와 네
사람의 연주자 그리고 35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자. 2세기가 지난 지금
이를 작곡한다해도 악기와 주자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은 마찬가지다.
하이테크 전자 현악기들이 동원된다 해도 작곡시간을 단축시키지는 못한다.
"바멀의 병"은 무슨 결핵이나 에이즈같은 죽음의 바이러스가 아니다.
생산성은 그대로인채 비용만 높아가는 이들 부문을 발견자인 뉴욕대학의
경제학자 "윌리엄 바멀"(William Baoumal)의 이름을 따 하나의 병으로
규정한 것이다.
바멀은 이를 "사람 서비스의 코스트 병"이라 이름짓고 이 추세대로 갈
경우 미국 전체 국내총생산의 60%를 의료비와 교육비에 빼앗기는 불행이
닥칠 것으로 경고한다.
제조업분야의 생산성은 가장 뒤쳐져 있다는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도 75년
1백명이 만들던 것을 90년에는 66명이 만들정도로 향상됐다. 석유정제업의
생산성은 지난 15년동안 38%, 철강은 74%, 반도체는 6백39%가 높아졌다.
반면 의료 교육 법률 복지 우편및 위생처리 공연예술분야등은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서비스 정체"지대다. 경찰예산은 팽창해도 범죄는 줄지않고
공립교육지출은 늘어나도 교육효과는 뒷걸음질이며 법률상담이나 치료의
경우 사람의 서비스는 그대로인 채 인건비 상승을 들어 값만 올려받는
"비용고 증후군"이다. 이 증후군은 공교롭게도 공공부문에 많다.
밀턴 프리드맨은 경제를 생산적인 민간부문과 비생산적인 공공부문으로
구분짓고 공공부문의 비생산성은 정치및 관료의 타성에다 돌렸다. 바멀은
이들 내부에 잠복해 있는 "코스트 병"에서 새로운 해답을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