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과밀부담금제의 찬반논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도권과밀을 막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건설부가 입법추진중인
과밀부담금제에 대한 찬반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건설부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의 상업용건물을 지을때
땅값을 포함한 건축비의 10%를 과밀부담금으로 내게 한다는 것이다. 이
금액의 50%를 수도권이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현재 당정협의를 끝내고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뒤 빠르면
내년 3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인 과밀부담금제에 문제점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과밀부담금제가 수도권집중을 완화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점이 중요하다. 남한인구의 절반가까이가 몰려있는 수도권의
정치 경제 문화적 비증은 인구비율보다 훨씬 더커서 압도적이라 할만하다.
이에따라 교통 환경 교육 주택등 많은 점에서 엄청난 비용발생과 불편을
겪고있으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막기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각종
시설의 지방이전권장등 온갖 방법이 동원되었다. 이같은 노력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 지방분산을 유도하자는 시도라고 풀이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수도권집중을 막기위한 경제적 유인책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문화등 생활여건의 격차가 엄청나고 직장등
생계수단이 유리한 현실을 무시한채 이 제도를 강행할 경우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는 기업이 수도권의 경계지역에 몰려 수도권의 외연적 팽창이라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이같은 예상은 몇해전 집값이 크게 올랐을때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이 일어난 것과 같은
이유때문이다.
만일 과밀부담금제가 인구분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부담금이
임대료로 전가됨으로써 물가상승만 부채질할수 있다. 이를 막기위해 또
다른 규제가 필요할지 모르며 이같은 악순환은 문제해결은 커녕
관료주의라는 고질병만 악화시킬 뿐이다.
또 하나 우려할 점은 민간기업과 지역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이 제도
도입이 재량권 확대를 노리는 부처이기주의 탓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수도권 인구분산은 역사적 배경과 이유가 있는만큼 시간을 갖고
지방자치제실시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과밀부담금제에 대한 찬반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건설부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의 상업용건물을 지을때
땅값을 포함한 건축비의 10%를 과밀부담금으로 내게 한다는 것이다. 이
금액의 50%를 수도권이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현재 당정협의를 끝내고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뒤 빠르면
내년 3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인 과밀부담금제에 문제점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과밀부담금제가 수도권집중을 완화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점이 중요하다. 남한인구의 절반가까이가 몰려있는 수도권의
정치 경제 문화적 비증은 인구비율보다 훨씬 더커서 압도적이라 할만하다.
이에따라 교통 환경 교육 주택등 많은 점에서 엄청난 비용발생과 불편을
겪고있으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막기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각종
시설의 지방이전권장등 온갖 방법이 동원되었다. 이같은 노력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 지방분산을 유도하자는 시도라고 풀이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수도권집중을 막기위한 경제적 유인책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문화등 생활여건의 격차가 엄청나고 직장등
생계수단이 유리한 현실을 무시한채 이 제도를 강행할 경우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는 기업이 수도권의 경계지역에 몰려 수도권의 외연적 팽창이라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이같은 예상은 몇해전 집값이 크게 올랐을때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이 일어난 것과 같은
이유때문이다.
만일 과밀부담금제가 인구분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부담금이
임대료로 전가됨으로써 물가상승만 부채질할수 있다. 이를 막기위해 또
다른 규제가 필요할지 모르며 이같은 악순환은 문제해결은 커녕
관료주의라는 고질병만 악화시킬 뿐이다.
또 하나 우려할 점은 민간기업과 지역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이 제도
도입이 재량권 확대를 노리는 부처이기주의 탓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수도권 인구분산은 역사적 배경과 이유가 있는만큼 시간을 갖고
지방자치제실시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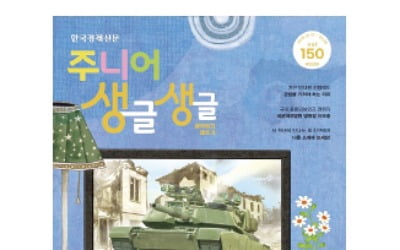
![[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국가 채무](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AA.3969138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