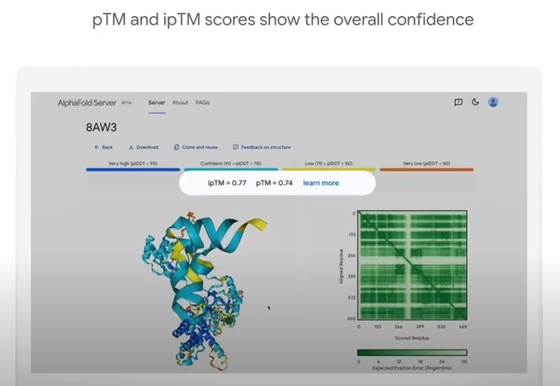"스타골퍼 우리 조에 …" 프로암, 청탁 '골머리'
일부 VIP '非매너'도 문제

여자프로골프대회의 실무 담당자들은 이런 청탁에 시달리기 일쑤다. 본 대회 전에 프로와 아마추어를 한 조로 편성해 경기하는 프로암 때문이다. 프로암은 대회를 열 수 있도록 도와준 후원사에 대한 감사의 뜻에서 마련하는 이벤트다.
하지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 따르면 올 시즌 29개 대회 가운데 프로암을 열지 않는 대회는 개막전 롯데마트 여자오픈을 비롯해 두산매치플레이 챔피언십,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등 4개나 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10개가 넘는 프로암 대회가 취소됐던 작년보다는 적지만 대부분 프로암을 치르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보다는 많은 숫자다.
프로암을 열지 않는 대회의 주최사들은 “프로암 비용을 선수들의 상금에 보태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골프업계 관계자들은 “해봐야 골치만 아픈 프로암은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게 속사정일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스폰서와 KLPGA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스타 선수 모시기 경쟁’이다. 전인지(21·하이트진로), 허윤경(24·SBI저축은행), 김자영(24·LG), 윤채영(28·한화) 등 실력과 미모를 갖춘 선수들과 동반 라운드를 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문제는 뜻대로 매치가 되지 않았을 때다.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와 골프를 치지 못할 경우 실망을 넘어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는 VIP도 있어서다. KLPGA 관계자는 “프로암 대회에 나오는 VIP는 대부분 지위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인물들이라 어느 한쪽만의 비위를 맞출 수 없다”며 “조 편성 때문에 프로암 일정이 막판까지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반말과 저속한 농담을 던지는 일부 VIP도 골칫덩이다. 한 프로골퍼는 “일부라고는 해도 초청 손님한테 기분 나쁜 상황을 한 번이라도 겪고 나면 프로암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며 “‘야’ 또는 ‘언니’라고 부를 때가 가장 기분 나쁘다”고 말했다. 그는 “스폰서를 위한 자리여서 어쩔 수 없이 꾹 참는 선수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골프브리핑] 코브라골프, 다크스피드 볼리션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660129.3.jpg)
![[골프브리핑] 테일러메이드, 무신사와 협업해 팝업스토어 오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653711.3.jpg)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금지 '직격탄'...인텔 2.2% 급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90647304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