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세입자가 甲인 나라도 있다는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치경영연구소 지음 / 홍익출판사 / 276쪽 / 1만5000원
![[책마을] 세입자가 甲인 나라도 있다는데…](https://img.hankyung.com/photo/201404/AA.8589280.1.jpg)
네덜란드에선 저녁 6시만 되면 상점이 줄줄이 문을 닫는다. 아무리 작은 가게의 자영업자라도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린다. 유통업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 덕분이다. 저자는 ‘우리 다 같이 쉬자’고 약속하고 경쟁의 마지노선을 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전한다.
노르웨이에서는 부모의 경제력 차이가 자녀의 학력을 좌우하지 않는다. 노르웨이의 국립대학교엔 등록금이 없다. 학생들은 매달 170만원씩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졸업 후 40%는 갚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이고 60%는 낮은 이율로 갚는다.
노르웨이가 북해 유전 개발로 부유해지기 이전부터 만들어진 이 교육 시스템은 누구나 동일 출발선상에서 출발한다는 ‘기회의 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정치인이 세금으로 비즈니스석을 타면 나라가 들썩이는 덴마크, 법 규제 없이도 선한 정치의 선례를 만든 영국 등 다양한 유럽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최종석 기자 ellisica@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뒤로 밀린 피벗…Fed, 연내 금리인하 전망 3회서 1회로 줄여 [Fed 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16187.3.jpg)
![[속보]Fed, 연내 금리 1회 인하 시사…올해말 5.1%유지 [Fed 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2.22579247.3.jpg)




![[단독] 새마을금고 '초비상'…124곳에 '부실 딱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001326.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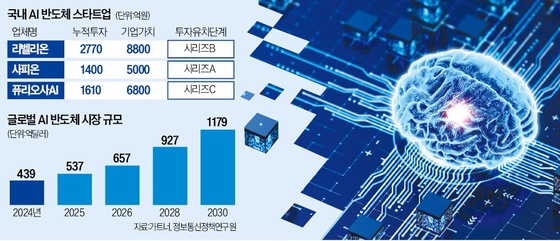





![[오늘의 arte] 티켓 이벤트 : 뮌헨 체임버 오케스트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01060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