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기적은 평범함 속에 살아 숨쉬는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레지너 브릿 지음 / 문수민 옮김 / 비즈니스북스 / 320쪽 / 1만4000원
《인생의 끝에서 다시 만난 것들》의 저자 레지너 브릿의 회고다. 그는 이날 이후 자신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한다. 불평불만이 많았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지만 이제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이 책에는 주차장 수금원처럼 이웃과 동네에 잔잔한 변화를 일으키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보통 사람들과 그들의 일상이 만드는 45가지의 ‘기적’이다.
저자 자신도 ‘인생의 끝’까지 가본 경험이 있다. 기자로 한창 일하고 있던 1998년 갑작스럽게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누군가 내 삶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는 절망과 회의감으로 살았고 그럼에도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간다는 게 억울했다. 하지만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암을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였다. 피아노를 샀고 신문 칼럼을 쓰고 배구를 했다. 점점 삶의 자세가 바뀌었고 살아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게 됐다. 저자가 사는 동네 성당 사제의 강론이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기적은 평범한 사람들 안에 있다는 얘기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슐츠 작가님, 스누피 만화에는 왜 흑인 캐릭터가 없나요" [서평]](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07937.3.jpg)






![[단독] 새마을금고 '초비상'…124곳에 '부실 딱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001326.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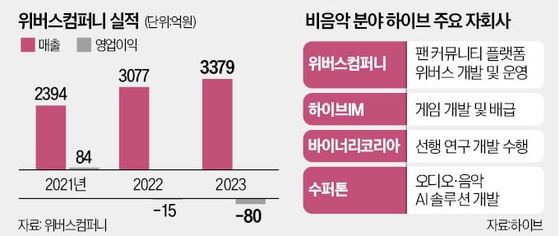




!["슐츠 작가님, 스누피 만화에는 왜 흑인 캐릭터가 없나요" [서평]](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700793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