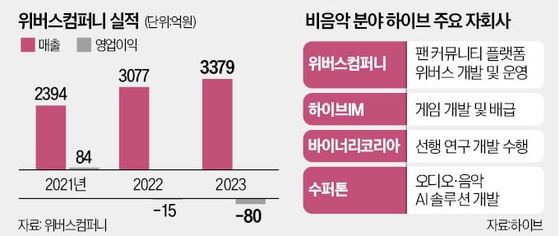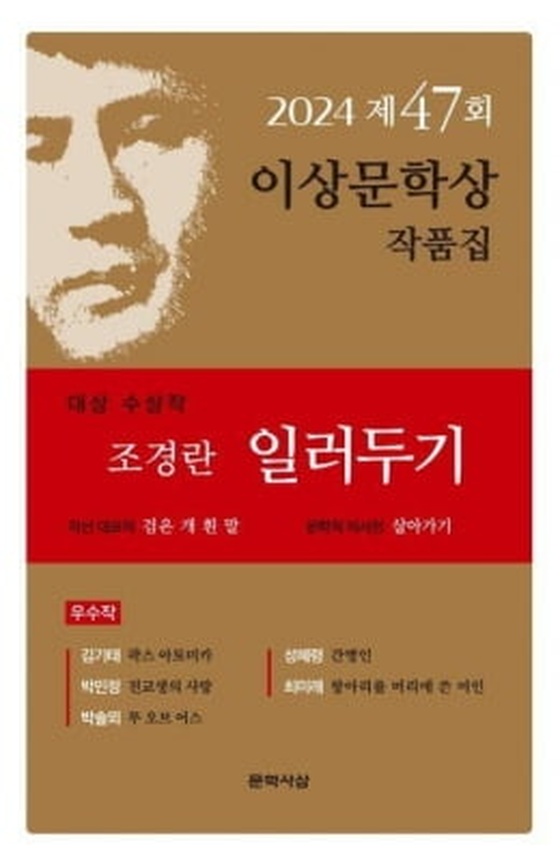[책마을] 일상에서 건져올린 老학자의 지혜와 통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영문학자 겸 평론가 이태동 교수, 사소함 속에서 발견한 특별함…담담한 필치로 그려낸 53편
![[책마을] 일상에서 건져올린 老학자의 지혜와 통찰](http://editor.hankyung.com:7001/photo/ImageSprayer.jsp?kind=CART&aid=2012011260651&indate=&photoid=201201121448&size=1)
![[책마을] 일상에서 건져올린 老학자의 지혜와 통찰](http://editor.hankyung.com:7001/photo/ImageSprayer.jsp?kind=CART&aid=2012011260651&indate=&photoid=201201121449&size=1)
이 교수는 “내가 그동안 저문 강에 이르도록 눈 내리는 들판을 건너오면서도 꺼지지 않은 의식의 눈과 통찰력으로 발견한 삶의 아름다운 진실과 그 내면적인 진실을 언어로 바꾸어 써놓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자기만의 방’ ‘마음의 섬’ ‘시간의 빈터’ ‘침묵의 의미’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된 53편의 글에서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 대화의 중요성, 행복의 의미, 새롭게 인생을 바라보게 된 경험과 만남을 수많은 예화를 통해 들려준다.
“노동을 해서 얻은 돈으로 읽고 싶었던 책들을 한아름 사 들고 서점 문을 나왔을 때 눈부셨던 대낮의 햇빛,/…/곰팡내 나는 수십만 권의 책들이 꽂혀 있는 대학 도서관 서가를 지나는 순간 가난했지만 학문을 하겠다는 욕망을 불태웠을 때,/…/이 모든 것 또한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행복의 순간이다.”
그는 가난하고 힘들었던 유학시절, 책을 쓰거나 번역하면서 젊음을 불태웠던 일 등 행복했던 순간을 잔잔하게 기록한다. 고서, 램프, 시계 등을 수집하는 취미 등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따뜻하게 묘사한다.
“저문 강가에 이르러 조용히 되돌아보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축복받은 행복의 조각 같지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보다 기억 속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동의할 수 있는 정신적 만족도임을 역설한다. 이 교수는 문학, 음악, 미술의 아름다움에서부터 삶의 미학까지 두루 관조한다. “인생이 신비로움 속을 탐색하는 여행이라면, 고흐가 화폭 위에 새로이 창조한 신비로움은 삶의 진폭을 그만큼 더 넓힌 미학적 공간과도 같은 것”이라고 평한 뒤 “인간이 처해 있는 실존적인 상황은 그 누구에게나 비극적이지만 누구나 ‘인간의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웃음을 보일 수 있다”고 말한다.
여름의 풍요로움과 겨울 속의 봄, ‘시간의 빈터’처럼 느껴지는 12월의 슬픔 등 계절의 변화에 따른 단상을 섬세하고 아름다운 필체로 담아낸 글들도 눈길을 붙든다. 사라져 가는 간이역, 기와집, 종소리 등 잊혀져가는 추억에 대한 아쉬움과 유년시절의 기억들도 되새긴다. 침묵이 공포스러웠던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고 말보다 더 깊고 무거운 의미를 지닌 침묵의 신비에 대해 얘기한다. 그는 “침묵과 정적을 죽음과 같다고 무서워했지만, 그 시간이 없었으면 사색의 깊은 샘을 팔 수도 없었고, 아무런 창조적인 일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회고한다. 노교수가 삶 속에서 길어 올린 지혜와 성찰의 글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준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속보] 기상청 "전북 부안 남남서쪽서 규모 4.7 지진 발생"](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2.22579247.3.jpg)




![애플, 하루 만에 7% 폭등…월가 "교체수요 자극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12072531320.jpg)

![[단독] 새마을금고 '초비상'…124곳에 '부실 딱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00132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