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복지 축소…美 "재정적자 해소 모든 방법 고려"
크루그먼 "성장정책이 정답"
미 의회 예산국은 12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미 연방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22년에는 10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적자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앨런 심슨 전 공화당 상원의원과 어스킨 볼스 전 대통령 비서실장(빌 클린턴 정부)은 12일 CNN에 출연해 "증세는 물론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등 의료보험 개혁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적자 해소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첫 회의를 열고 연방정부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방정부의 중기 재정계획대로라면 2015년 GDP의 4.3%까지 높아질 재정적자를 3% 이내로 낮추는 게 이 위원회의 당면 목표다.
◆지출 줄이고 세금 늘리고
재정적자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총론에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시행 각론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복잡해진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지난 6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가진 연설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세금을 늘리든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교육과 국방비를 줄이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지 못하면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해 경제성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금정책센터는 만약 미 의회에서 증세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꾀하려면 매년 500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하자면 세율 상한선은 현재의 35%에서 48% 수준으로 높아진다. 오바마 정부가 연봉 2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세금 부과를 확대한다면 최고 세율은 77%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정부 지출을 40%까지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사회보장연금과 의료보험 혜택을 25%까지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마틴 설리번 세금 전문 칼럼니스트는 "근본을 바꾸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연방 세금을 평균 8%가량 올리고 지출을 7%가량 줄이는 방안을 찾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적자 해소 상책은 경제성장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NYT) 칼럼에서 "미 연방정부가 2차대전 직후인 1946년 GDP 대비 122%까지 급등했던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증세 혹은 지출 삭감에 의한 게 아니라,경제성장과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덕분이었다"고 지적했다.
1946년 미 연방정부는 2710억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다. 이 빚 규모는 1960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경제가 좋아지면서 부채 비율은 45.7%까지 하락했다. 그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 재정으로 돌아서면 자칫 경제성장이 급격히 둔화돼 재정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성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증세가 가장 바람직한 적자 해소 방안이란 주장이다. 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재정 건전화의 첩경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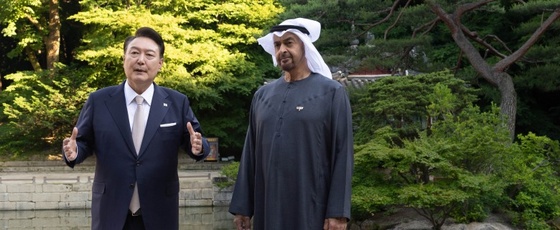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