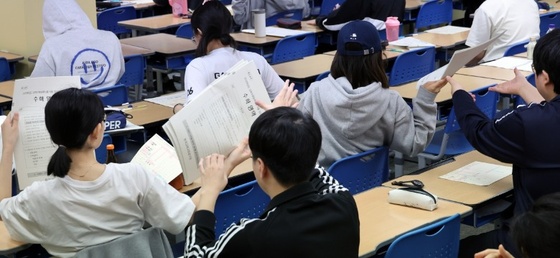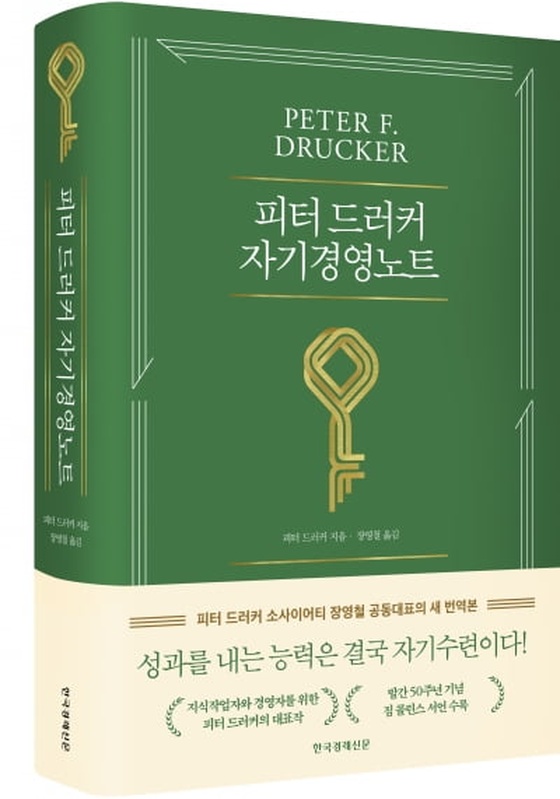[金과장 & 李대리] 직장내 성희롱‥1차땐 '러브샷' 2차 가선 '블루스' 추근…"저걸 그냥!"
노래방에서 은근슬쩍 허벅지에 손을 올려 놓는 상사.음흉한 눈빛을 흘리며 "오늘 보기 좋은데"라고 내뱉는 동료.누가 있든 말든 음담패설을 영웅담인 양 늘어놓는 새까만 후배.그런가하면 술자리에서 "똑바로 하라"며 갑자기 주먹을 날리는 바로 1년 위 고참.
달나라 사람들 얘기가 아니다. 직장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김 과장,이 대리가 몸담은 회사에서도 이런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이런 사람과 맞부딪친 김 과장,이 대리.욕이 목구멍까지 치밀어오르지만 침 한번 꿀꺽 삼키고 참는다. 참다 참다 못하면 허공에 주먹질을 해 본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 생명줄은 길다. 비단 성희롱이나 성폭력만이 아니다. 언어적 · 물리적 폭력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다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공론화하지 않을 뿐이다.
◆성희롱? 없는 게 아냐, 넘어가주는 거지
중견회사에 다니는 K씨(여 · 30)는 입사 6개월 때 당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가 쳐진다. 어느 날 회사 선배가 술이나 한잔 하자고 제안했다. 막내이기도 했지만,그동안 선배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말을 많이 들었기에 거부감 없이 나갔다. 맥주를 여러 잔 마셨고 상사들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다. 남의 뒷담화 듣는 재미가 쏠쏠했다.
2차가 끝나고 선배는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다. K씨는 서울 홍대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여러 차례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선배는 골목이 무서운 거라며 굳이 집 앞까지 가기를 고집했다.
문 앞에서 인사를 하고 들어갔다.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커피 한잔만 하고 가면 안 되겠느냐"고."안 된다. 돌아가시라"고 했더니 2~3분 후 갑자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커졌다. 밤 11시 조용한 원룸 복도에 쩌렁쩌렁 소리가 울렸다. 당황한 K씨는 문을 열어줬다. 선배는 편의점에서 사온 캔커피를 들이밀며 집안으로 들어왔다. 취해 있었지만 목적은 명확해 보였다. K씨는 침착하게 그를 달래려고 노력했다.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협박도 했다. 그렇지만 별무소득이었다. 참다못한 K씨는 선배를 제치고 집에서 뛰쳐나왔다. 그길로 택시를 타고 친구집에 가서 잤다. 두근대는 심장을 거머쥔 채로.그렇지만 문제 삼지는 못했다.
◆당신의 '못된 짓',다 기록되고 있다
직장생활 하는 여성들이 몇 명만 모이면 비슷한 사례가 헤아릴 수 없다. 광고회사에 다니는 P대리(여 · 28)의 책상 서랍에는 검은 수첩이 하나 있다. 그 수첩에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남성 동료 직원의 성희롱 · 성폭력 행태가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발단은 이랬다. 동료는 작년 여름 회식을 마친 뒤 집까지 에스코트해 주겠다고 자청했다. 이후 평일 에스코트를 요청하더니,'차 한잔 달라'고 매달렸다. 때론 '가택 침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근무시간에도 메신저로 '하체가 볼륨있다' 운운하며 짜증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문제를 키우기 싫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건 아니다' 싶어 기록을 시작했다. 조만간 인사팀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할 계획이다.
한 벤처기업 사장은 여직원들 사이에선 '개'로 불린다. 술만 들어가면 남직원은 삐끼로,여직원은 술집 아가씨로 착각한다. 교묘한 것은 술에 취해서 더듬으면서도 '결정적인 부위'는 피한다는 것.가슴을 노리는 대신 어깨와 가슴 사이에 손을 올린다거나 엉덩이 대신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만지작거리는 식이다. 임원들도 사장의 이런 행태를 어느 정도 안다. 그렇지만 누구도 문제 삼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사장이 마이크를 잡으면 손짓으로 '나가서 춤 좀 같이 추라'는 신호를 보내 여직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이 회사 직원 김모씨(여 · 33)는 "회사 여직원들이 사장이 하는 못된 짓을 휴대폰에 다 하나씩 저장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언어적 성희롱은 여전하다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상당히 줄어든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말이나 그림 메시지를 통한 성희롱은 여전하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L씨(여 · 28)는 음담패설에 이골이 났다. 부서 상사나 동료들은 어찌된 게 여직원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음담패설을 해댄다. 뭐가 좋은지 자기들끼리 수시로 킬킬거린다. 이 정도면 못 들은 척 넘길 수 있다.
그렇지만 자신을 직접 부른 뒤 "여자들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건 어차피 다 남자들 눈길 끌려는 것 아냐"라거나,"가슴도 없으면서 브래지어 하고 다니는 여자들 보면 꼴불견 아냐"라는 식의 '농담'을 건넬 때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한 남자 동료는 '이상한 그림'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다.
성희롱 피해자가 여성만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남성도 심심찮게 성희롱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K대리(33)는 영업을 담당하면서 주 고객인 '아줌마들' 때문에 곤경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직 미혼인 K대리는 "젊은 남자가 왜 이리 부실하게 생겼어"라거나,"요즘은 연상이 더 낫다는데"라는 등의 말을 들을 때면 그냥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다고 한다.
◆물리적 폭력은 또 어떻고?
성희롱만 문제가 아니다. 언어적 · 물리적 폭력도 의외로 많다. 대기업 P사에 다니는 이경민 대리(남 · 33)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돌아오는 회식이 두렵다. 끝없이 돌아오는 소주잔이나 가시돋친 상사의 잔소리 때문만이 아니다. 자기 옆자리에 앉길 좋아하는 김 과장의 무차별 폭력 때문이다.
악연은 4년 전 시작됐다. 신입사원이었던 이씨는 선배들로부터 술잔을 받다가 김 과장에게서 봉변을 당했다. 이씨에게 술을 따라주던 김 과장은 느닷없이 "똑바로 일해"라며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부지불식간에 당한 한 방이라 충격은 더 컸다. 더 당황스러웠던 건 다른 선배들의 반응.본체만체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태반이고 웃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날만 술취해서 실수한 줄 알았더니,4년 내내 변하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 팀장에게 고충을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후배인 네가 참으라"며 달래기만 했다.
중소기업 K사에 다니는 박모 대리(36)에게는 직속 부장이 공포 그 자체다. 평소 말이 거칠기로 유명한 부장은 화가 나면 사무실에서 그의 머리마저 쥐어박는다. 처음엔 잘못했을 때 혼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7년차에 접어든 지금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다.
성희롱이나 사내폭력을 당하는 직장인들은 매일같이 '칼'을 간다. 물론 마음속으로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공법으로 문제 삼든지,아니면 그런 상황을 대처할 자신만의 노하우를 체득하는 수밖에 없다.
이상은/이관우/이정호/정인설 기자 sele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