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인 I♥KOREA] 최초의 외국인 교생 끈끈한 情에 푹 빠지다
"왜 한국에 왔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파란 눈의 영국인 총각 선생의 대답은 다소 엉뚱했다.
마크 토머스(29).외국어대 영어교육과(영교과)에 재학 중인 한국 최초의 외국인 교생이다.
그는 5월 초까지 한 달간 서울 동대문구 전농중학교에서 교생으로 처음 교사생활을 체험했다.
이달 초 만난 토머스씨는 "영국인들은 홀로 떠도는 꽃씨 같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꽃을 피우지 못한다"며 "한국인 특유의 패거리 문화가 한국의 매력"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과 얽히고설키고 부대끼며 사는 한국이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머스씨는 고국을 생각하면 날씨처럼 외롭고 쓸쓸했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고등학교를 마친 뒤 특별히 하고 싶은 공부가 없어 직업 전선에 뛰어든 뒤 5년간 백화점 점원으로 근무했다.
"영국에선 하루 수백 명의 사람을 만났지만 늘 혼자였어요. 친구들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영국 생활에 대해 회의를 품고 새로운 길을 찾았다.
토머스씨는 1999년 결단을 내렸다.
일단 배낭을 메고 떠난 뒤 일본을 경유해 한국을 찾았다.
두 달간의 한국 생활에서 '한국 문화'에 푹 빠져 들었다.
한국 맛을 본 뒤 영국으로 돌아갔으나 머릿속엔 온통 한국뿐이었다.
토머스씨는 독학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결국 2002년 아예 짐을 싸들고 와 한국어 학당에 정식으로 등록했다.
"아르바이트로 한국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어요.
생각보다 재미있었죠.그때 중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올때만 해도 '선생님'이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나 한국 생활을 하면서 뿌리를 내려야 겠다는 뜻이 강해졌다.
토머스씨에겐 운도 따랐다.
2004년 한국어 학당을 졸업한 뒤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입학했다.
한국외대 영교과 04학번 17번.대학 공부가 크게 어렵진 않았다.
평균 학점은 B+.한국사와 같은 생소한 교양 과목은 C학점을 받기도 했다.
그를 설레게 한 것은 영어교육과 특유의 선후배 문화였다.
영교과는 선배가 번호가 같은 후배를 챙겨준다.
2003학번 17번 선배가 공부는 물론 일상 생활까지 일일이 돌봐줬다.
입학 동기보다 다섯 살이나 많은 그가 학교 생활에 무난히 적응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다.
현재 토머스씨의 휴대폰에는 80명이 넘는 한국 친구들의 번호가 등록돼 있다.
그는 "영국에서 스쳐간 수백명보다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과 훨씬 친하다"며 "이들이야말로 내 인생에 의미 있는 '꽃'"이라고 미소지었다.
토머스씨는 5년 만에 '한국 사람'이 다 됐다.
그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떡볶이 등 한국 음식이라면 닥치는 대로 먹는다.
그가 하숙을 하는 것도 주인 아주머니가 많은 신경을 써주기 때문이다.
입학 동기인 김혜란씨는 "토머스씨는 우리보다 더 한국적인 것 같다"며 "학교 앞 막걸리 집의 빈대떡 안주를 무척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생 생활도 멋지게 해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퇴근 후 매일 밤 학생 이름과 얼굴을 대조해 가면서 소리 내 읽고 외웠다.
일주일 만에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했다.
자신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는 그의 열성에 학생들도 감동했다.
토머스씨는 "아이들과 빨리 친해질 줄은 몰랐다"면서 "학생들과 하나가 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밝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교생 생활 기간 중 '스타'였다.
토머스씨가 맡은 반의 장윤숙 담임 교사(43)는 "하루에도 수십통씩 토머스 선생을 찾는 전화가 걸려 왔다"며 "저도 얼굴보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래도 어려움은 있었다.
한국 교단을 점령한 미국식 발음이 그를 힘들게 했다.
한국 학생들은 '영국 본토' 영어를 낯설어 했다.
결국 그는 학생들을 위해 영국식 발음을 버리고 미국식 발음으로 바꿨다.
지금도 매일 연습 중이다.
36명의 교생 실습반 학생들은 이런 토머스씨를 마냥 좋아했다.
"마크 토머스 선생님이 수업할 때면 영어 카세트 테이프가 필요 없어요.
선생님 발음만 따라하면 되니까요."
교생 실습을 마친 토머스씨는 내년 2월이면 교단에 선다.
그는 "이번 교생 실습 기간을 통해 교사가 되고 싶은 열망이 더욱 강해졌다"면서 "학생들과 함께 한 시간은 잊을 수 없이 소중하다"며 환한 표정을 지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뉴욕증시, 나스닥 사상 첫 17,000선 돌파마감...엔비디아 7%↑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290642359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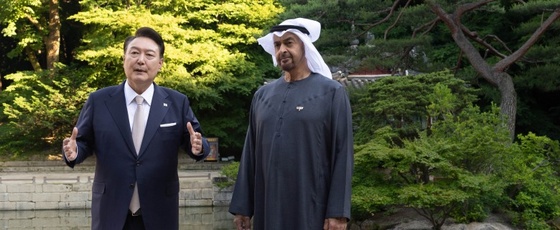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