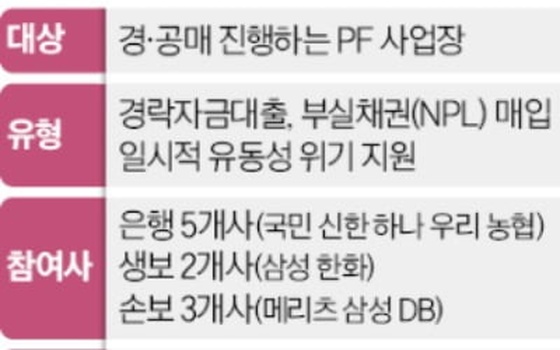[CEO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최평규 S&T그룹 회장 'M&A 귀재' 비결은
최평규 회장에게 붙은 닉네임이다.
오늘날의 S&T그룹이 탄생한 것은 전적으로 그의 탁월한 M&A 능력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가 직접 창업한 S&Tc를 제외한 S&T중공업(옛 통일중공업·2003년 인수),S&T대우(옛 대우정밀·2006년 인수),S&T모터스(옛 효성기계·2007년 인수) 등 현재 주력 계열사는 모두 인수한 기업들이다.
그만의 비결은 뭘까.
사전 준비가 철저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최 회장은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회계·재무 지식에 밝다.
독학의 결과다.
최 회장은 "분식회계가 없다는 전제 아래 어느 기업이든 재무제표를 보면 '이 회사는 얼마짜리'인지 바로 나온다. 그게 거의 80~90%는 맞는다"고 말했다.
그럼 어떤 기업을 M&A 대상으로 삼을까.
최 회장은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때 M&A를 한다"고 소개했다.
하나는 인수한 뒤 영업을 잘 할 자신은 없지만 매수 대상이 기업가치에 비해 턱없이 쌀 때다.
하지만 이건 그의 '전공'은 아니다.
이보다는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내 '장사를 잘 할 자신이 있는 기업'을 선호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가장 좋아한다"고 했다.
2003년 S&T중공업을 인수한 게 좋은 사례다.
"전 처음에 S&T중공업을 인수할 생각이 없었어요. 한때 창원을 흔들었던 강성노조가 있는 회사를 내가 왜 삽니까. 근데 귀신에 홀린 건지 어느 날 S&T중공업 옆을 지나가는데 그 공장이 왠지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다음 날 공장을 둘러보고 그 자리에서 인수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버렸죠.S&T중공업의 뛰어난 기술력을 봤기 때문이죠."
요즘에도 추가적인 M&A를 물색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쪽으로 하나만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도 배가 고픈 모양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뜨겁다고 하지 않겠다"…CPI 앞두고 사상 최고가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2010747338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