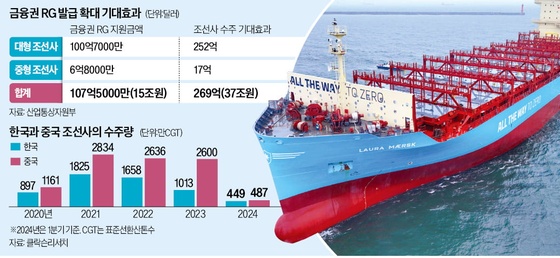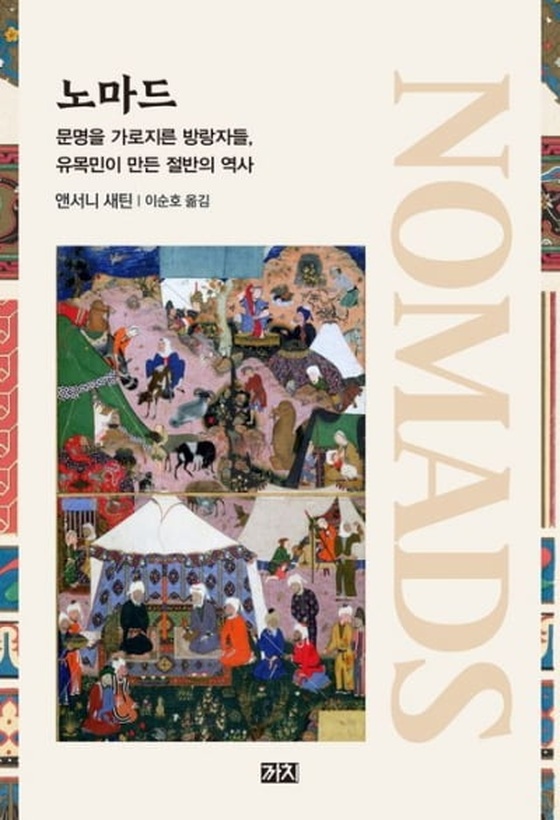[천자칼럼] PPL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처럼 특정회사를 대놓고 홍보할 뿐만 아니라 소품을 통해 한 회사를 은근슬쩍 부각시킨다. 외로움을 달래려 사람 얼굴을 그린 다음 말 상대로 삼는 배구공의 이름을 제조사인 '윌슨'으로 지어 계속 부르는 것이다. 근작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엔 샤넬,알마니 등 유명 브랜드가 줄줄이 등장한다.
영화나 드라마 속 배경이나 명칭,로고,물건 등을 이용한 간접광고, 곧 PPL(Product Placement)의 사례들이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광고라는 생각에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되는 직접광고와 달리 PPL은 별다른 거부감 없이 보는 사람의 눈과 마음에 와닿는다. 해당 회사나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 모두 자연스레 높아지는 것이다.
PPL의 대상엔 제한이 없다.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시계 핸드백 의류 맥주같은 소비재는 물론 기업 브랜드와 레스토랑 등 자영업소,심지어 특정지역까지. '모래시계' 방송 뒤 강원도 정동진에 관광객이 급증한 뒤 지자체들이 촬영지 제공에 앞장서는 건 PPL의 영역과 영향력을 보여주고도 남는다.
수요가 많으면 부작용이 따르는 걸까. 첫회는 으레 해외에서 촬영되고,나왔다 하면 외제자동차고,괜한 장면에서 손목을 들어 시계를 비추거나 핸드백을 클로즈업하는 등 지나치다 싶은 대목이 많더니 PPL 대가로 뒷돈을 받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관계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고 한다.
PPL을 무작정 백안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많다. 제작비 보전의 필요성과 한류붐에 따른 드라마의 한국 제품(기업) 홍보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규제를 완화했는데도 위반 건수가 늘었다더니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논란이 따르더라도 차제에 PPL에 대한 보다 분명한 원칙과 지침이 마련됐으면 싶다.
박성희 논설위원 psh77@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특파원 칼럼] 코너에 몰린 중국 경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5460097.3.jpg)
![[기고] 글로벌 경영의 필수품 'ESG 전략'](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7063344.3.jpg)
![[한경에세이] 떠오르는 인도, 동방의 등불 코리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629524.3.jpg)


![뉴욕증시, S&P500 또다시 사상 최고...테슬라 5%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1806353664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