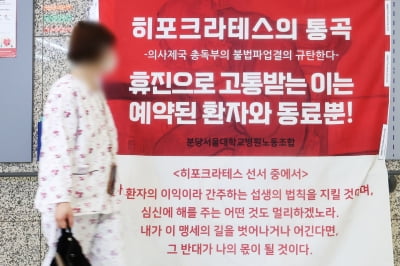[한국 현대시, 한시로 만나다] <송춘(送春) 특집> 봄이 간다커늘(시조), 무명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 현대시, 한시로 만나다] <송춘(送春) 특집> 봄이 간다커늘(시조), 무명씨](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Q.25814412.1.jpg)
봄이 간다커늘
무명씨
봄이 간다커늘 술 싣고 전송 가니
낙화 쌓인 곳에 간 곳을 모르노니
유막(柳幕)에 꾀꼬리 이르기를 어제 갔다 하더라
– ≪병와가곡집(甁窩歌曲集)≫
[태헌의 한역]
今春云將去(금춘운장거)
載酒欲送行(재주욕송행)
落花處處積(낙화처처적)
不知在何方(부지재하방)
柳幕黃鳥曰(유막황조왈)
昨日離此鄕(작일리차향)
[주석]
今春(금춘) : 금년 봄, 올 봄. / 云(운) : ~라고 말하다, ~라고 하다. / 將去(장거) : 장차 가려하다, 장차 떠나려 하다.
載酒(재주) : 술을 싣다. / 欲(욕) : ~을 하고자 하다. / 送行(송행) : 전송하다, 배웅하다.
落花(낙화) : 낙화, 떨어진 꽃. / 處處(처처) : 곳곳에. / 積(적) : 쌓다, 쌓이다.
不知(부지) : ~을 알지 못하다. / 在(재) : ~에 있다. / 何方(하방) : 어느 쪽, 어느 방향.
柳幕(유막) : 버들막. 휘늘어진 버들가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버들 숲을 가리키기도 한다. / 黃鳥(황조) : 노란 새, 꾀꼬리. / 曰(왈) : ~라고 말하다, ~라고 하다.
昨日(작일) : 어제. / 離(리) : ~를 떠나다. / 此鄕(차향) : 이 고을, 이 마을, 이곳.
[직역]
올 봄이 곧 갈 것이라 하여
술을 싣고 전송하려 했더니
낙화는 곳곳에 쌓여 있는데
봄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네
버들 숲에서 꾀꼬리 말하길
어제 이곳을 떠났다고 하네
[漢譯 노트]
다음 주면 벌써 6월이니 지금이 봄이라 하더라도 가장 막바지 봄이겠다.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 봄을 돌아보면서 역자는 특별히 현대시가 아닌 옛 시조 한 수를 한역해 보았다. 오늘 소개하는 이 시조가 가는 봄을 노래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송춘(送春)’을 노래한 시편(詩篇)과는 사뭇 다른 정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실타래가 엉키기 십상인 이즈음에 감상해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듯하여 ‘송춘 특집’을 마련해보게 되었다.
옛 사람들의 시에 송춘시(送春詩)와 함께 송추시(送秋詩)가 심심찮게 눈에 띄는 까닭은, 봄이 가는 것을 기쁨 혹은 청춘(靑春)이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가을이 가는 것을 시련 혹은 노경(老境)을 뜻하는 겨울이 다가오는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해와 인식의 연장선 위에서 보자면, 겨울이나 여름이 가는 것을 안타까워한 시 혹은 글이 거의 없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겨울이 다하면 약동하는 봄이 오고, 여름이 다하면 성숙의 계절 가을이 오기 때문에 가는 겨울과 가는 여름을 안타까워할 까닭이 별로 없다. 그리고 겨울과 여름은 현실적으로 지나기 힘든 계절이기도 하다. 그 힘든 계절을 지나왔는데 안타까울 것이 뭐 있겠는가? 이에 비해 봄과 가을의 경우는 제법 다르다. 어떻게 보든 가는 봄을 아쉬워하는 시나 가는 가을을 안타까워하는 시는 기실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허허로운 인생이기에, 이 두 계절의 소멸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실어 세월을 노래한 옛 시들은, 기본적으로 비애의 정서를 밑그림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위의 시조는 가는 봄을 노래한 것임에도 비애를 기조로 한 시가 아니다. 술을 싣고 전송하러 간다는 것은 마음에 슬픔이 고여 있을 때 취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의 시조는 적어도 심사(心事)가 고단하지 않고 나름대로 득의(得意)하였을 때 지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걸음마다 발자국에 눈물이 고이는 상황이라면 저와 같은 풍류(風流)를 어찌 쉽게 보여줄 수 있겠는가! 이 시조에서의 ‘술’은 ‘봄의 수고에 대한 격려’의 뜻으로 읽히기 때문에 비애와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인이 설령 득의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혹은 심사가 다소 고단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요샛말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즐기고 있는 사람임은 분명하다. 최소한 그것마저 없었다면 술 싣고 전송하러 갈 여유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인이 감사를 표하면서 봄을 전송하고자 했지만 결국 한 발 늦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시인이 한 발 늦지 않았다면 이 시는 상당한 혼란에 빠지고 말았을 것이다. 아직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는 봄에게 도대체 무슨 재주로 전별주(餞別酒)를 권한단 말인가! 그러므로 시인이 한 발 늦어야만 말이 되고 시가 되고 또 멋이 되는 것이다.
심사가 고단하면 가는 봄날에 시름이 없을 수 없다. 세월이 가도 시름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대개 어떤 시름이 사라졌다 해도 새로운 시름이 또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의 뜰에 지금도 시름의 풀이 무성하니, 역자가 예전에 아프게 읊었던 아래 시는 여전히 진행형인 셈이다.
送春(송춘)
芳花謝了滿山靑(방화사료만산청)
細雨霏霏布穀聽(세우비비포곡청)
春日傷悲如草長(춘일상비여초장)
何時得釤刈心庭(하시득삼예심정)
봄을 보내며
향그런 꽃 져버려 온 산 푸른데
가랑비 부슬부슬 뻐꾸기 울음 울다
봄날 시름은 풀처럼 자라거늘
어느 때 낫을 얻어 마음의 뜰 베리오
※ 작자가 불분명한 위의 시조를 역자는 6구로 구성된 오언고시로 한역하였다. 한역시는 짝수구마다 압운하였으며, 그 압운자는 ‘行(행)’·‘方(방)’·‘鄕(향)’이다.
2020. 5. 26.
강성위 한경닷컴 칼럼니스트(hanshi@naver.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서울 최고 핫플" 2030 극찬했는데…"이럴 줄은" 충격 실태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3564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