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시, 한시로 만나다] 병든 짐승, 도종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 현대시, 한시로 만나다] 병든 짐승, 도종환](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Q.25812924.1.jpg)
병든 짐승
도종환
산짐승은 몸에 병이 들면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다
숲이 내려보내는 바람 소리에 귀를 세우고
제 혀로 상처를 핥으며
아픈 시간이 몸을 지나가길 기다린다
나도 가만히 있자
[태헌의 한역(漢譯)]
病獸(병수)
山獸忽有病(산수홀유병)
靜靜踞而蹲(정정거이준)
植耳林間風(식이임간풍)
己舌舐傷痕(기설지상흔)
忍待痛日過(인대통일과)
吾亦今安存(오역금안존)
[주석]
* 病獸(병수) : 병든 짐승.
山獸(산수) : 산짐승. / 忽(홀) : 문득, 갑자기. / 有病(유병) : 병이 있다, 병이 들다.
靜靜(정정) : 고요히, 가만히. / 踞而蹲(거이준) : 웅크리고 있다. ‘踞’나 ‘蹲’ 모두 웅크린다는 뜻이다.
植耳(식이) : 귀를 세우다, 귀를 기울이다. / 林間風(임간풍) : 숲 속의 바람.
己舌(기설) : 자기 혀. / 舐(지) : ~을 핥다. / 傷痕(상흔) : 상흔, 상처.
忍待(인대) : ~을 참고 기다리다. / 痛日過(통일과) : 아픈 날이 지나가다.
吾(오) : 나. / 亦(역) : 또한, 역시. / 今(금) : 이제. / 安存(안존) : 편안히 있다, 가만히 있다.
[직역]
병든 짐승
산짐승은 문득 병이 들면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다
숲 속의 바람에 귀를 세우고
제 혀로 상처를 핥으며
아픈 날이 지나가길 참고 기다리나니
나도 이제 가만히 있자
[漢譯 노트]
역자가 출강하는 대학에서 ‘영물시(詠物詩)’에 대해 강의를 한 후에 학생들에게 4행으로 된 한글 영물시를 지어 제출하라고 한 적이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당(唐)나라 시기에 굳어진 일반적인 영물시의 양식은, 음영(吟詠)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물상을 나타내는 글자는 물론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어휘조차 쓰지 않으면서 시를 짓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물시는 시의 본문이 문제가 되고 시의 제목이 답이 되는 일종의 수수께끼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수업 시간에 이점을 강조하면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건’을 음영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하나가 불쑥 아래와 같은 과제를 제출하였다.
모든 것을 낳는 어머니
모든 걸 가져가는 탐관오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매정한 사람
길을 나서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나그네
학생이 제출한 이 시는 논자에 따라서는 영물시로 간주하지 않을 수도 있을 만큼 영물시에서는 아주 드물게 보이는, 개념 내지 관념을 음영의 대상으로 삼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에서 사람으로 묘사한 음영의 대상은 다름 아닌 ‘시간(時間)’이다. 도종환 시인의 위의 시를 이해하는데 관건이 되는 키워드 역시 이 시간이다. 모든 것을 낳지만 또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버리고, 뒤를 돌아보지도 돌아오지도 않는 그 시간은 생명체에게는 한없이 고마우면서도 때로 한없이 야속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야생의 짐승에게는 병원도 의사도 약사도 없다. 병이 들면 견디다가 낫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게 자연의 섭리이다. 자연계에서 종(種)이, 같은 종(種)이나 또 다른 종(種)을 치료하는 일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인간이 만물의 영장(靈長)인 것이리라. 시간이 치유해주기를 바라며 아픈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짐승에게는 스쳐가는 바람소리도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취약해진 짐승에게는 상위 포식자뿐만 아니라 하위 생명체조차 적이 되기 때문이다. 나의 약점이 곧 치명적인 독이 되고 마는 야생(野生)은 정말이지 비정하기만 하다.
시인이 마지막 1행을 한 연으로 삼은 ‘나도 가만히 있자’는, 시인이 자연계에서 배운 교훈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다. 몸이든 마음이든 조금만 아파도 난리를 치는 군상(群像)들을 볼 때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가끔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고쳐줄 존재도, 위로해줄 존재도 없는 저 야생의 짐승에게 우리가 부끄럽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2연 5행으로 된 원시를 역자는 6구로 이루어진 오언고시로 재구성하였다. 한역시는 짝수 구에 압운하였으며 그 압운자는 ‘蹲(준)’·‘痕(흔)’·‘存(존)’이다.
기왕에 모두(冒頭)에서 영물시 얘기를 꺼냈으니 영물시로 마무리 해보기로 한다. 마찬가지로 도종환 시인의 작품인 아래 시는 한글로 쓰여진 한 편의 멋진 영물시라고 할 만하다. 자, 이제 인터넷에 의지하지 말고 자력으로 이 시의 제목을 한번 맞추어 보자.
너 없이 어찌
이 쓸쓸한 시절을 견딜 수 있으랴
너 없이 어찌
이 먼 산길이 가을일 수 있으랴
이렇게 늦게 내게 와
이렇게 오래 꽃으로 있는 너
너 없이 어찌
이 메마르고 거친 땅에 향기 있으랴
2019. 12. 3.
강성위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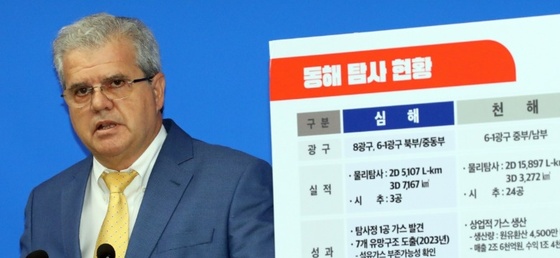

![옥수수 가격 반등…에탄올 수요가 견인 [원자재 포커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597335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