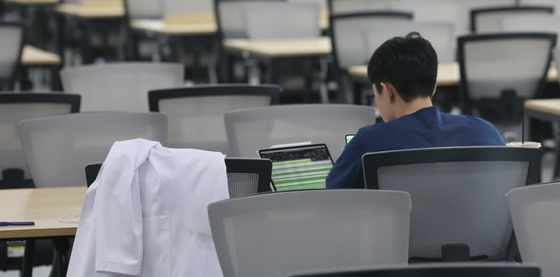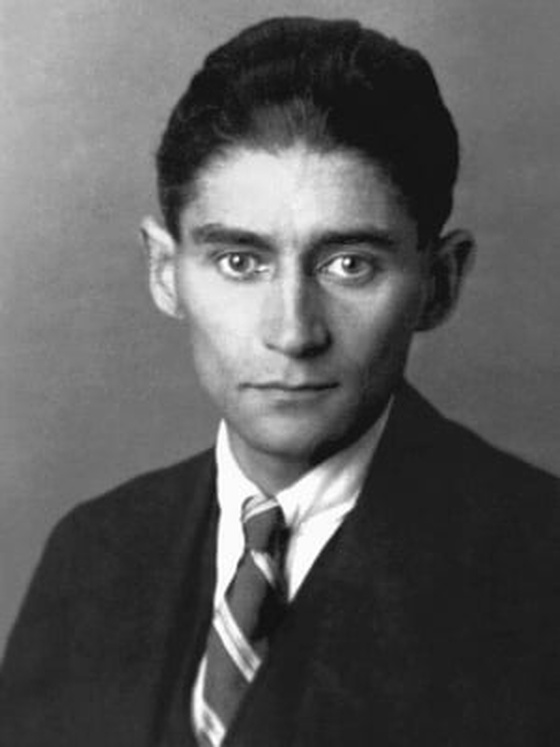코로나 치료제 유럽 승인 받고도…셀트리온 주가 속터지는 이유
“렉키로나 개발에 집중하느라 본업 약화”
증권사들 목표가 줄하향

다만 한국에서 렉키로나에 대한 긴급사용승인과 정식승인이 각각 이뤄진 뒤 셀트리온 주가는 오히려 약세를 보인 바 있다. 또한 실적을 비롯해 기존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이 떨어지고 있어 우려는 남아 있는 상태다.
15일 오전 9시1분 현재 셀트리온은 직전 거래일 대비 1만500원(4.92%) 오른 22만4000원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3800원(4.44%) 상승한 8만9300원에, 셀트리온제약은 8300원(7.02%) 뛴 12만660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렉키로나에 대한 유럽 시판승인이 나온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승인 권고 의견을 낸지 하루만에 승인을 내줬다. 보통 1~2달 걸리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셀트리온 주가가 이날 장 초반 이후에도 강하게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CHMP의 승인권고 소식이 전해진 지난 12일에도 장 초반에만 강하게 오르다가 상승분을 반납한 바 있다.
지난 12일 셀트리온은 장중에 9.41% 오른 23만2500원까지 치솟았지만 종가는 0.47% 상승하는 데 그친 21만3500원이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도 장중 9만3000원(8.52%↑)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종가는 직전 거래일인 지난 11일 종가보다 0.23% 빠진 8만5500원이었다.
또 한국에서 렉키로나에 대한 긴급사용승인과 정식승인이 각각 나온 이후에도 오히려 주가가 직전보다 더 빠지는 일이 반복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렉키로나의 긴급사용승인을 내준 지난 2월5일 셀트리온은 직전 거래일과 같은 34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문제는 이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하며 2월24일에는 28만2000원으로 12거래일동안 17.42% 하락했다.
추석 연휴 직전이었던 지난 9월17일 렉키로나의 국내 정식 승인이 나왔을 때도 주가 흐름이 비슷했다. 국내 정식 승인 소식이 증시에 반영된 같은달 23일에는 3.27% 오른 28만4500원을 기록했지만, 그 다음날부터 가파른 내리막을 탔다. 9거래일이 지난 10월7일 셀트리온의 주가는 25.13%가 빠진 21만3000원으로 추락했다.
렉키로나의 경쟁 약물의 사용 범위가 더 넒은 점도 불안 요인이다. 유럽에서는 미국 리제네론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로나프레베’도 렉키로나와 같은 일정으로 시판승인을 받아냈다.
렉키로나와 로나프레베 모두 항체치료제이지만, 사용 범위는 레나프레베가 더 넓다. 유럽에서의 렉키로나 사용 범위는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성인 중 보조적인 산소긍급이 필요하지 않고 중증으로 전환할 위험이 높은 환자다. 로나페레베는 최소 몸무게 40kg의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의 치료와 12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의 코로나19 예방에도 사용될 수 있다.
먹는 알약 형태인 경구용 치료제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는 점도 정맥주사 제형인 항체치료제 개발 기업에는 악재다. 렉키로나의 경우 병원에 내원해 60분동안 정맥주사(IV)를 맞아야 하기에 머크앤컴퍼니와 화이자가 각각 개발 중인 경구용 치료제보다 편의성이 떨어진다.
렉키로나 개발에 집중하느라 실적을 갉아 먹은 점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목표주가 하향이 이어지고 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치료제의 개발, 허가, 생산에 집중하면서 셀트리온의 단기 펀더멘탈은 약화됐다”며 “생산 여력이 부족해 외부 CMO 물량을 늘렸, 그룹의 역량이 이 부분에 집중되면서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성장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이 지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목표주가를 낮춘 증권사는 KB증권(28만원), KTB투자증권(28만원), 유안타증권(25만원), 유진투자증권(30만원), 한화투자증권(30만원) 등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