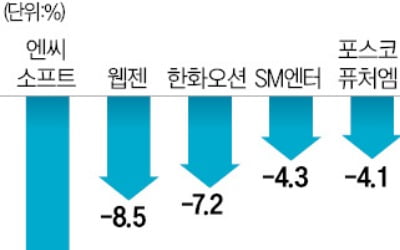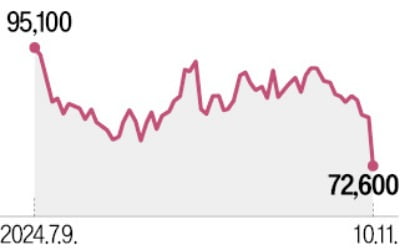올 'IPO 고배' 기업 사상 최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진 철회·미승인 38개社 달해
심사 빨라진만큼 더 까다로워져
일각선 "미래가치 외면" 지적도
심사 빨라진만큼 더 까다로워져
일각선 "미래가치 외면" 지적도
▶마켓인사이트 10월 11일 오후 1시 57분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기업공개(IPO) 기업이 올해 사상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공모주 시장 호조세로 다수 기업이 상장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거래소가 심사 문턱을 높이자 상장을 철회하는 기업이 더욱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뒤 자진 철회하거나 미승인을 통보받은 IPO 기업은 총 38곳이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2021년과 같은 수치다.
자진 철회를 선택한 기업은 32곳, 심사에서 미승인을 통보받은 기업은 6곳이다. 자진 철회한 대부분 기업이 거래소로부터 잠정적 미승인 통보를 받은 뒤 철회를 선택해 실질적으로는 거래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거래소 심사가 더욱 꼼꼼해진 데 이어 올해 심사 속도가 빨라진 결과로 분석된다. 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미래 실적 근거와 내부 통제 등을 이전보다 자세히 심사하고 있다. 공모주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지만 일각에서는 미래 성장성보다 현재 실적을 기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거래소는 지난 6월 말부터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심사에 속도를 냈다. 기존에는 보완 사항을 알려주고 개선할 시간을 줬지만 지나치게 심사 시간이 길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선했다.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기업에는 곧바로 미승인 의견을 통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공모주 시장 호황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모주 열기가 뜨겁던 2020년에도 다수 기업이 서둘러 상장에 나섰다 이듬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는 거래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IPO 기업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심사받는 기업은 48곳이며, 이 중 절반가량이 규정상 심사 기간인 45영업일을 넘겼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기업공개(IPO) 기업이 올해 사상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공모주 시장 호조세로 다수 기업이 상장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거래소가 심사 문턱을 높이자 상장을 철회하는 기업이 더욱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뒤 자진 철회하거나 미승인을 통보받은 IPO 기업은 총 38곳이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2021년과 같은 수치다.
자진 철회를 선택한 기업은 32곳, 심사에서 미승인을 통보받은 기업은 6곳이다. 자진 철회한 대부분 기업이 거래소로부터 잠정적 미승인 통보를 받은 뒤 철회를 선택해 실질적으로는 거래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거래소 심사가 더욱 꼼꼼해진 데 이어 올해 심사 속도가 빨라진 결과로 분석된다. 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미래 실적 근거와 내부 통제 등을 이전보다 자세히 심사하고 있다. 공모주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지만 일각에서는 미래 성장성보다 현재 실적을 기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거래소는 지난 6월 말부터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심사에 속도를 냈다. 기존에는 보완 사항을 알려주고 개선할 시간을 줬지만 지나치게 심사 시간이 길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선했다.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기업에는 곧바로 미승인 의견을 통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공모주 시장 호황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모주 열기가 뜨겁던 2020년에도 다수 기업이 서둘러 상장에 나섰다 이듬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는 거래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IPO 기업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심사받는 기업은 48곳이며, 이 중 절반가량이 규정상 심사 기간인 45영업일을 넘겼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