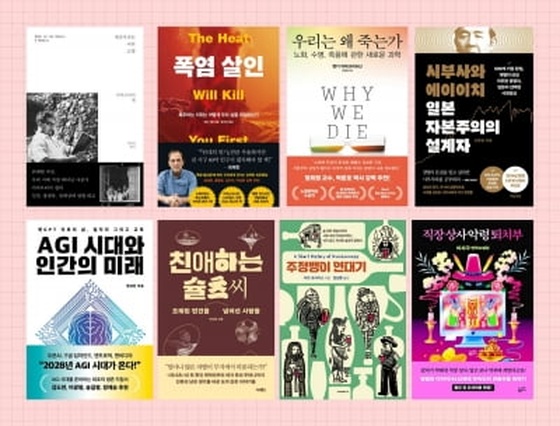[다시! 제주문화] (85)"말고기 먹으면 부정탄다? 사실은 의도된 공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말고기 부정(不淨) 관념은 양반에 의해 유포됐을 것"
[※ 편집자 주 = 제주에는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생성된 독특한 문화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세대가 바뀌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지만, 문화와 함께 제주의 정체성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고 불안합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후진적이고 변방의 문화에 불과하다며 천대받았던 제주문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속에서 피폐해진 정신을 치유하고 환경과 더불어 공존하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제주문화가 재조명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라는 우리말은 '하던 것을 되풀이해서'란 뜻 외에 '방법이나 방향을 고쳐서 새로이' 또는 '하다가 그친 것을 계속해서'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제주문화를 돌아보고 새롭게 계승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연합뉴스는 이번 기획 연재를 통해 제주문화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계승해 나갈 방법을 고민합니다.
]
![[다시! 제주문화] (85)"말고기 먹으면 부정탄다? 사실은 의도된 공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PYH2010121502590001300_P4.jpg)
오늘날 말고기가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처럼 대중화된 음식은 아니지만 말의 고장 제주에서만큼은 점차 향토음식으로 자리 잡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의 말고기 식용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아본다.
◇ 알다가도 모를 제주의 말고기 식문화
언제부터 제주에서 말고기를 먹었던 것일까.
제주 신화를 통해 예부터 제주에 말고기 식용 문화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농경신이 된 자청비의 이야기를 담은 '세경본풀이'(제주에선 '신화'를 '본풀이'라 일컫는다)를 보면 자청비의 하인인 '정수남'이 아홉마리의 소와 말을 몰래 먹는 내용이 나온다.
![[다시! 제주문화] (85)"말고기 먹으면 부정탄다? 사실은 의도된 공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PYH2024031003060005600_P4.jpg)
농경사회에 들어서면서 말고기를 먹는 일이 크게 줄었지만, 고려 시대 몽골식 목마장이 들어서면서 제주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몽골식 도살법과 요리법이 전해졌다.
고려말 조선 초기에는 말과 말가죽 교역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고 도축 과정에 나온 고기를 먹었다.
제주에서 말은 농사의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은 웬만해선 식용으로 말을 잡으려 하진 않았지만, 죽거나 다친 말을 잡아먹기도 했다.
말을 접할 기회가 드물었던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에는 목마장이 있었고 말을 소처럼 농사에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제주에는 '말궤기론 떼 살아도 쉐궤기론 떼 못 산다'(말고기로 끼니를 삼는 것이 가능하지만, 소고기로는 불가능하다), '애기 가졍 말고기 먹으면 좋다'(임신 중에 말고기를 먹으면 좋다), '말고기를 먹으면 어지럼증에 좋다' 등 말과 관련한 속담이 많다.
![[다시! 제주문화] (85)"말고기 먹으면 부정탄다? 사실은 의도된 공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PCM20231016000028990_P4.jpg)
또 원기를 회복시키고 뼈와 근육, 인대와 관절을 튼튼하게 한다고 해서 말고기 외에 말뼈를 고아 먹곤 했다.
하지만 말고기를 오랫동안 먹어왔으면서도 일각에선 말고기를 먹으면 재수가 없다고 해서 금기시하기도 했다.
'말고기를 먹으면 난산(難産)한다'(말고기를 먹으면 순조롭지 못하게 아이를 낳는다), '말고기를 먹으면 부정(不淨)탄다', '정구불식(正拘不食), 이마불식(二馬不食)'(정월에 개고기를 안 먹고, 이월에 말고기를 안 먹는다) 등 금기(禁忌)가 남아 있어 말고기는 제사와 명절 등에 쓰이지 않는다.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중요한 의례에 모두 부정하게 여겨지면서도 몸에 좋다는 이유 등으로 알음알음 추렴의 방식을 통해 말고기를 먹어온 제주.
이렇듯 알다가도 모를듯한 제주의 말고기 식문화는 왜 생겨난 것일까.
![[다시! 제주문화] (85)"말고기 먹으면 부정탄다? 사실은 의도된 공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PYH2018110116630006000_P4.jpg)
말고기가 부정하다는 인식은 지방관리와 양반, 토호 등 지배계급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윤숙은 '제주도 말고기 식용 전통과 말고기 식용 부정(不淨) 관념 분석'이란 논문을 통해 "말고기를 먹으면서도 한편으론 '말고기를 부정하다'는 관념이 존재한다는 것은 문화적 비밀"이라며 "말고기가 부정하다는 관념은 말이 통제의 대상이 되면서 통제의 한 방편으로 '부정하다'는 관념을 유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고기 부정' 관념 생성과 관련 있는 이들은 말 진상(進上)을 담당했던 지방관과 개인목장을 소유한 토호들, 그리고 향리들이라 할 수 있다"며 "(이들은) 말을 농업이나 식용 등 생계에 이용했던 백성들과 달리 사냥이나 뇌물 진상을 이유로 말의 식용을 금하고 말고기 부정 관념 생성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말은 가장 중요한 제주의 진상품이었다.
조선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말을 진상토록 했는데 그 종류는 해마다 바치는 세공마(歲貢馬), 설날·동짓날 및 왕의 탄일에 바치는 삼명일진상마(三名日進上馬), 수시로 보내는 흉구마(凶咎馬), 국가 간 교역에 쓰이는 교역마(交易馬) 등 그 종류도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들어 한 해에 바쳐야 하는 말이 많을 때는 600필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다시! 제주문화] (85)"말고기 먹으면 부정탄다? 사실은 의도된 공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PYH2014021403600005600_P4.jpg)
심지어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 초기 국가에서 말고기를 먹는 것도 금지하는 등 강력하게 통제한 기록이 나온다.
'제주에서 공물로 바치는 건마육(乾馬肉, 말린 말고기)을 금했다.
제주의 풍속은 매년 섣달에 암말을 잡아서 포를 만들어 토산물로 바쳤는데, 도안무사 황군서(黃君瑞)가 제주에서 돌아와서 아뢰므로 이를 파하게 했다.
'(태조 4년 1395년 7월 1일)
세종 때에는 말을 몰래 도살하고 가죽과 고기 등 부산물을 팔았다가 잡힌 제주도민을 북쪽 평안도까지 강제 이주시킬 정도로 엄하게 다스렸다.
또 건마육을 뇌물로 제공한 제주목사가 파직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통제 정책과 엄격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말 도축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관과 양반, 말을 소유한 토호들은 물리적인 강력한 통제 외에 다른 방법을 고안해내기에 이른다.
'음사'(淫祀·귀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숭상했던 제주의 풍속을 역으로 이용해 '말고기를 먹으면 재수가 없다'는 등의 말고기에 대한 부정(不淨) 관념과 금기를 만들어 유포한 것이다.
![[다시! 제주문화] (85)"말고기 먹으면 부정탄다? 사실은 의도된 공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PYH2018122714750001300_P4.jpg)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 제주에서는 '말고기를 먹으면 재수없다'면서도 그 맛을 잊지 못해 알음알음 말 고기를 추렴해 먹어온 독특한 식용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후 현대 들어 말고기는 상품적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1989년 제주 최초의 말고기 전문식당이 생겨난 데 이어 1990년대 이후 제주 방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말고기가 제주 향토음식으로 점차 자리잡기 시작했다.
현재 국내 말 사육은 제주도에 편중돼 있어 국내 말고기 70% 이상이 제주에서 생산·소비될 정도다.
제주도는 마육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운영을 통해 제주 말고기 소비 대중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 말고기를 제주 대표 음식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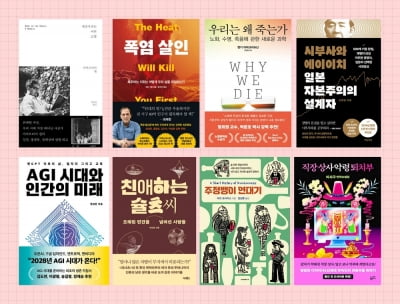
![[골목투어] '넉넉한 인심, 맛깔난 손맛' 순천으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M.37062285.3.jpg)


![美소비자 심리 둔화에 반락한 유가…"수요 강세 전망은 호재" [오늘의 유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03937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