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 리뷰] 국립극단 '벚꽃동산', 한심하고 우스운 '몰락 귀족'…그 뒤에 숨겨진 불안과 아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러 대문호 체호프의 4대 희곡
집안 망해가는데도 파티 여는
철없는 주인공 모습에 '실소'
집안 망해가는데도 파티 여는
철없는 주인공 모습에 '실소'
![[연극 리뷰] 국립극단 '벚꽃동산', 한심하고 우스운 '몰락 귀족'…그 뒤에 숨겨진 불안과 아픔](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AA.33516810.1.jpg)
작품은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현대 희곡의 아버지로 꼽히는 안톤 체호프의 4대 희곡 가운데 하나다. 연극계에서 잔뼈가 굵은 김광보 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연출하는 체호프 작품이기도 하다.
체호프는 스스로 이 작품을 희극이라고 정의했다. 극의 주인공이자 19세기 러시아의 몰락한 귀족 부인인 라네프스카야는 본인의 영지 벚꽃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는데도 아무 걱정 없이 해맑은 캐릭터다. 빚더미에 앉아 당장 이자 낼 돈이 없는데도 악단을 불러 파티를 열거나 거지에게 금화를 적선하는 철없는 인물이다.
라네프스카야뿐만 아니라 오빠, 가정교사 등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말과 행동은 맥락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서로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 답답하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객석에선 중간중간 어이없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김광보는 철없는 부인 라네프스카야에게 조금 더 무게감을 부여했다. 마냥 천진난만한 모습 뒤에 불안함과 아픔을 담고 있는 인물로 연출했다.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 백지원의 차분함이 한몫했다. 백지원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등 TV 드라마에서 활약하다가 5년 만에 연극계에 돌아왔다. 백지원의 신뢰감 있는 목소리와 호흡이 아니었다면 라네프스카야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그늘이 관객에게 제대로 전달됐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벚꽃동산의 늙은 집사 피르스(박상종 분)를 표현한 방식도 인상적이다. 원작과 달리 저택에 홀로 남겨진 피르스 위로 꽃비가 내리는 장면으로 결말을 처리했다. 귀족 가문이 잘나가던 시절부터 벚꽃동산에서 일해 온 피르스는 농노 해방에도 불구하고 하인으로 남기를 택한 인물로, 구시대를 상징한다.
투명한 유리벽으로 만들어진 무대 디자인도 흥미롭다. 얽히고설킨 인물 간 관계와 각각의 불안하고 위태로운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다. 화려하지만 깨지기 쉬운 유리의 속성은 몰락해가는 귀족 가문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공연은 오는 5월 28일까지 서울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에서.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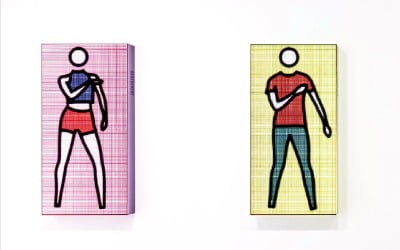
![오셀로 장군을 꼬드긴 부하 이아고는 ‘매력 만점’이었다 [연극 리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512603.3.jpg)